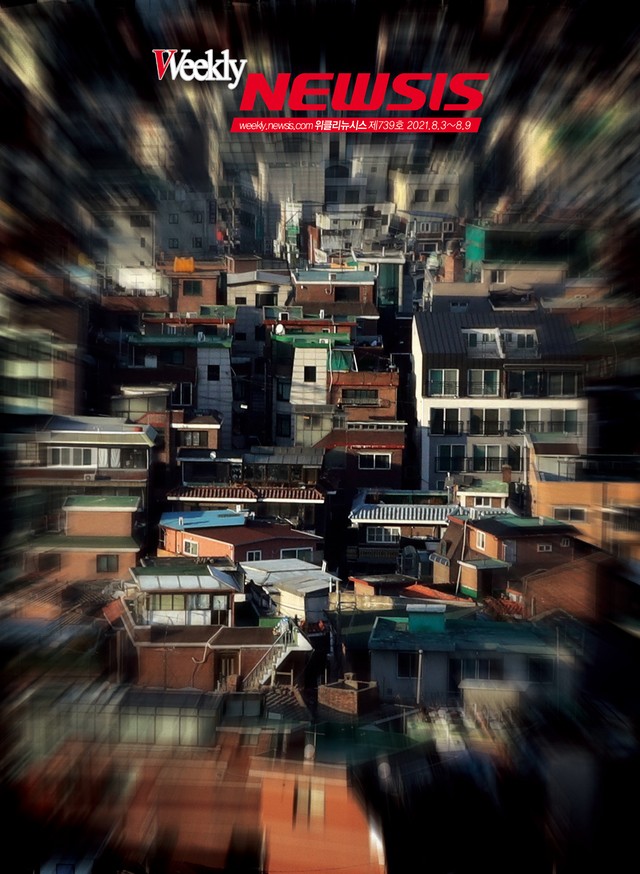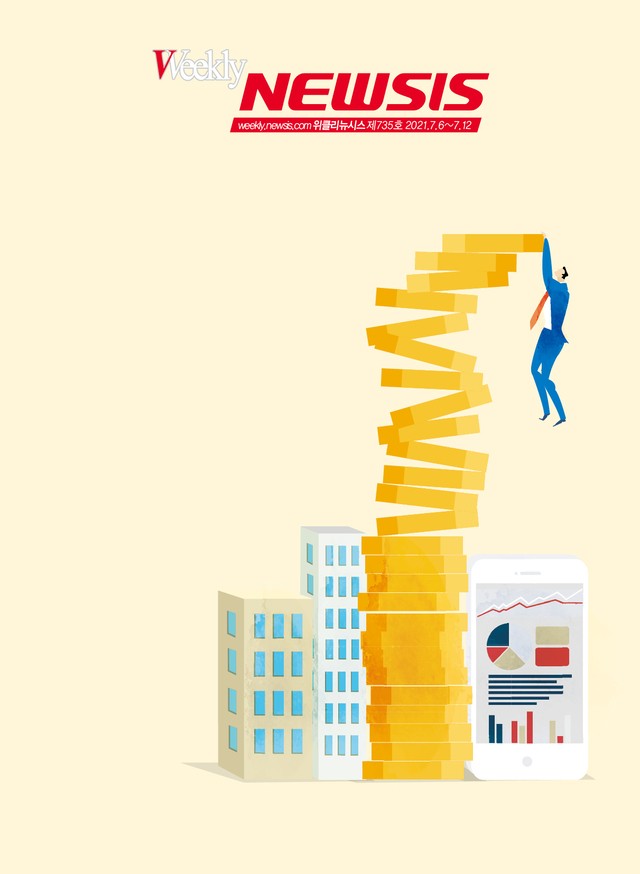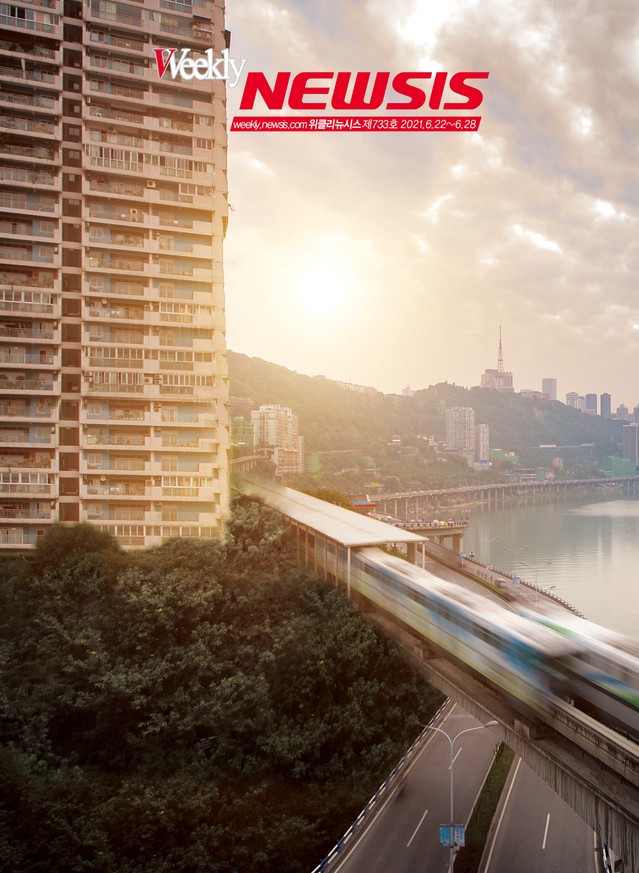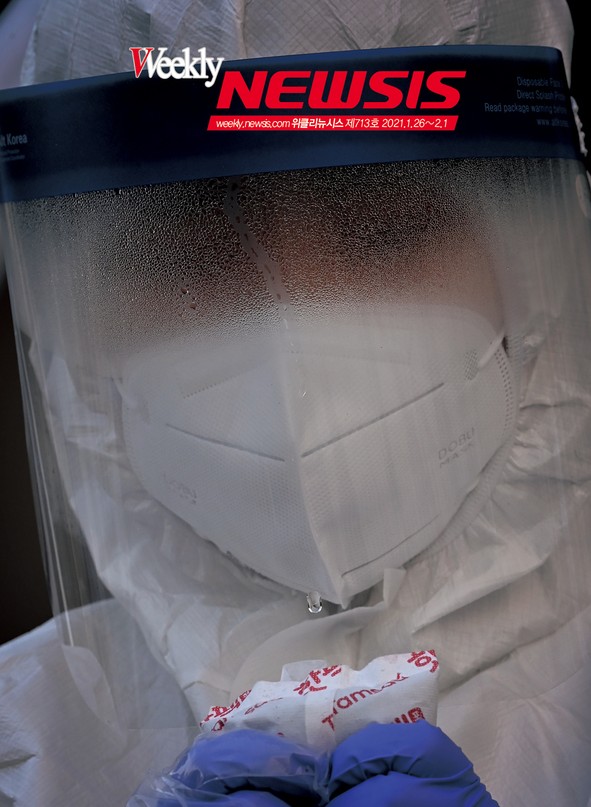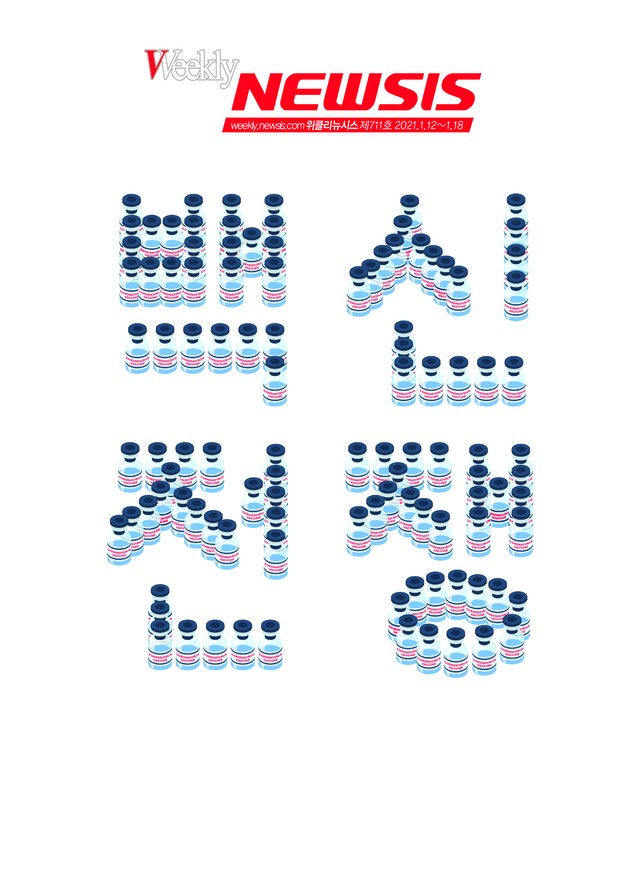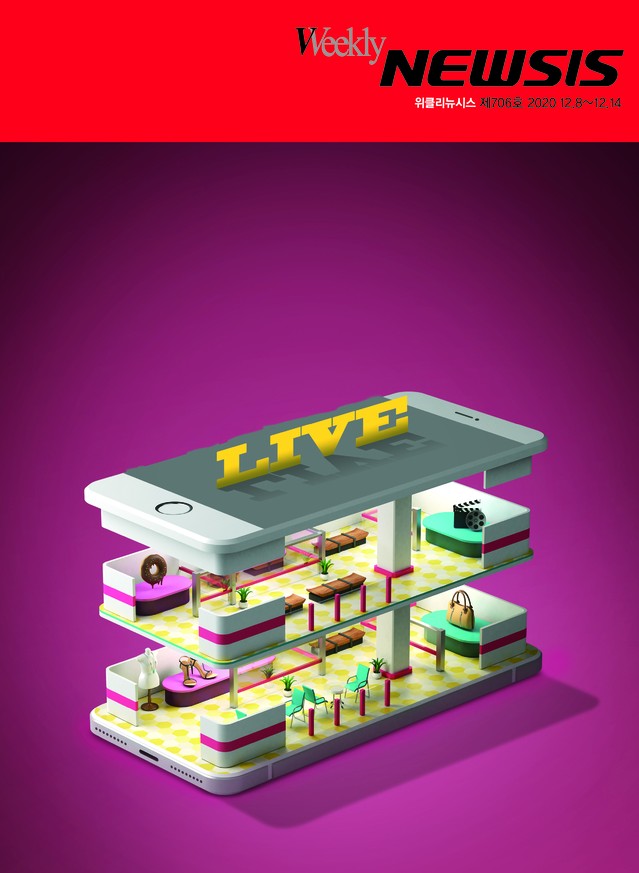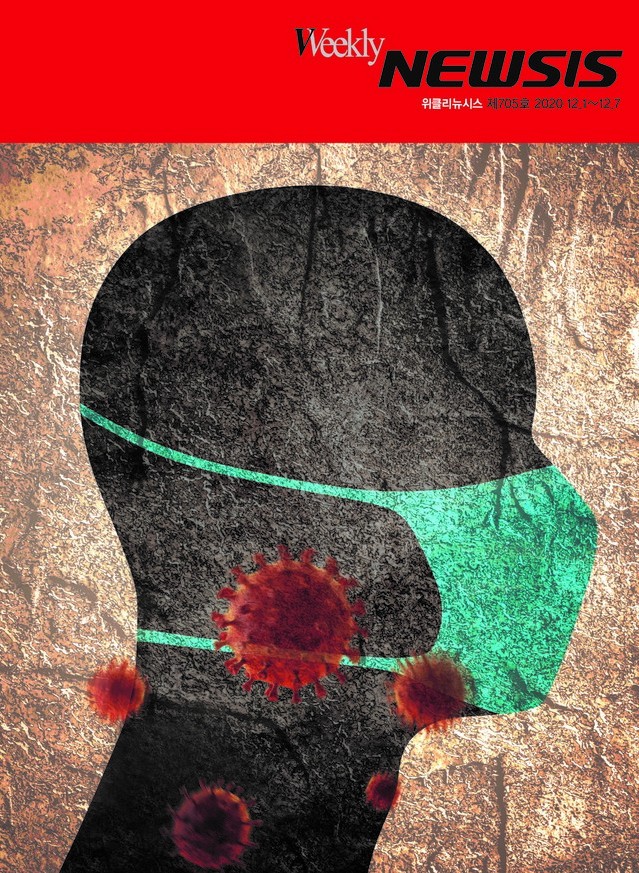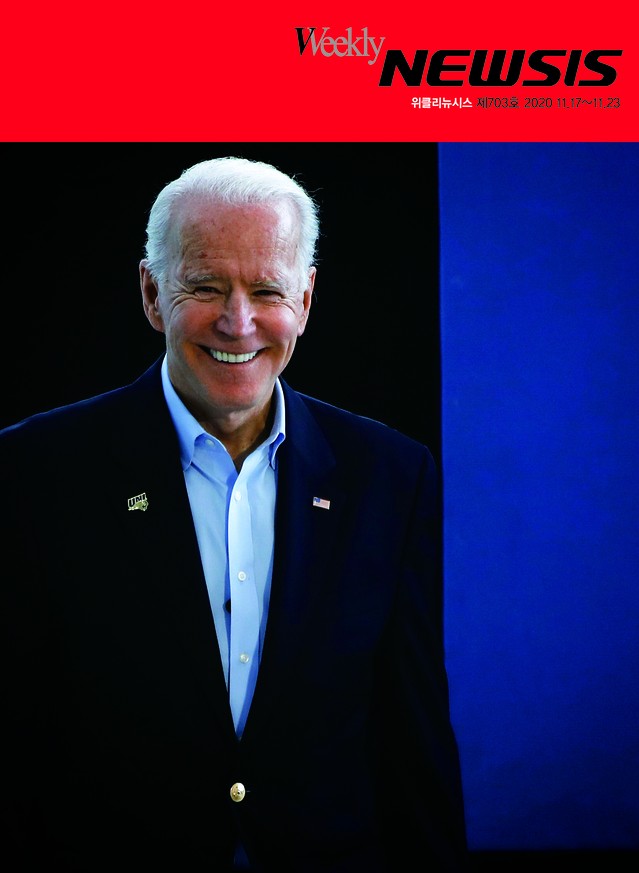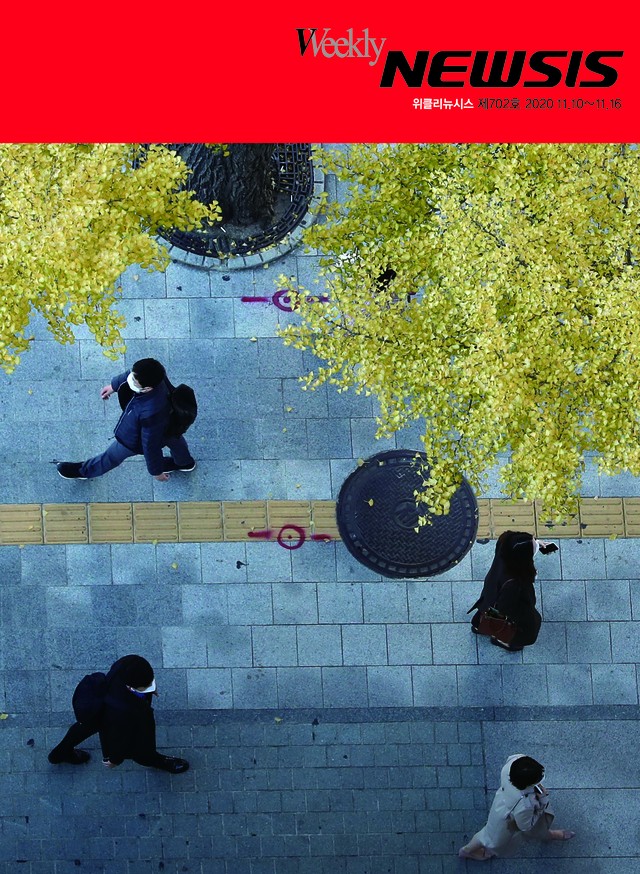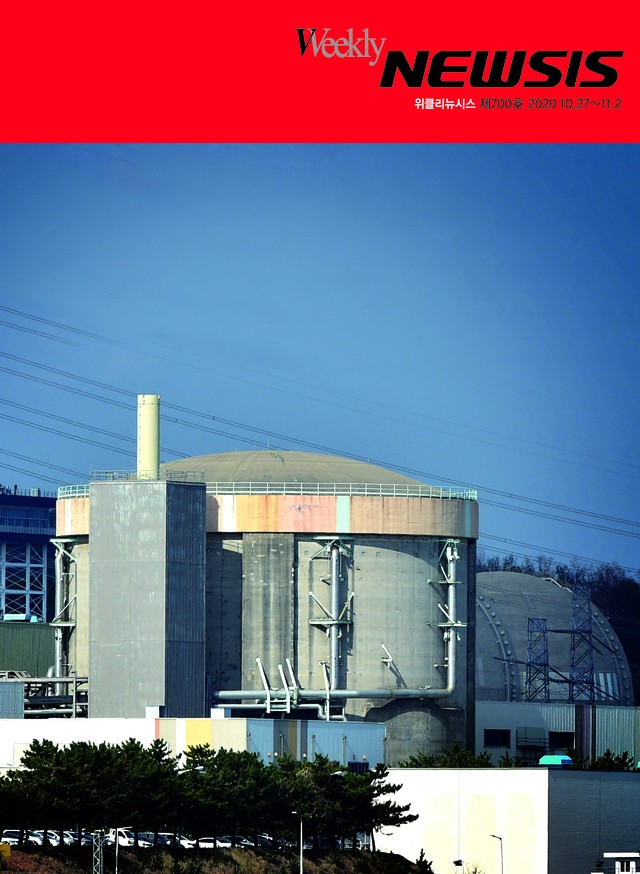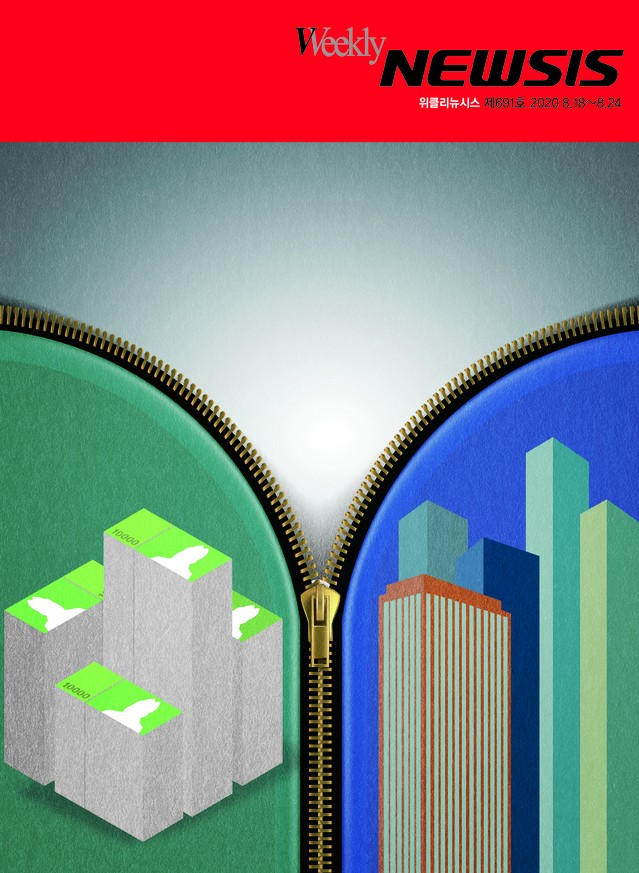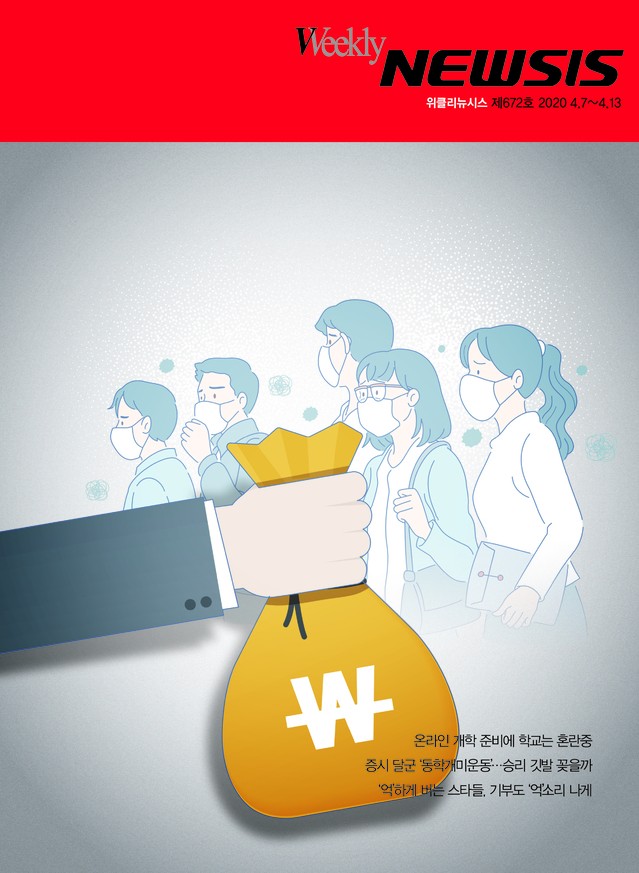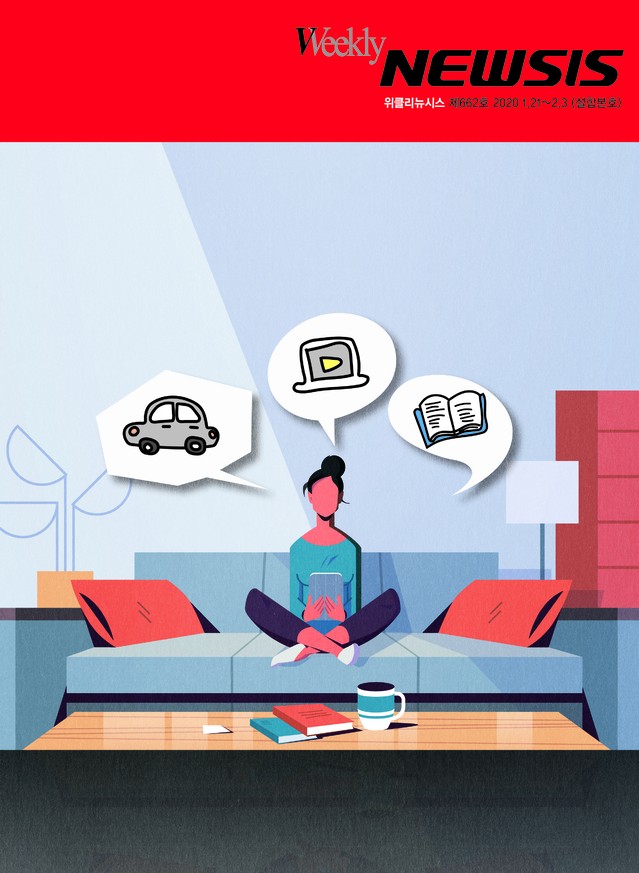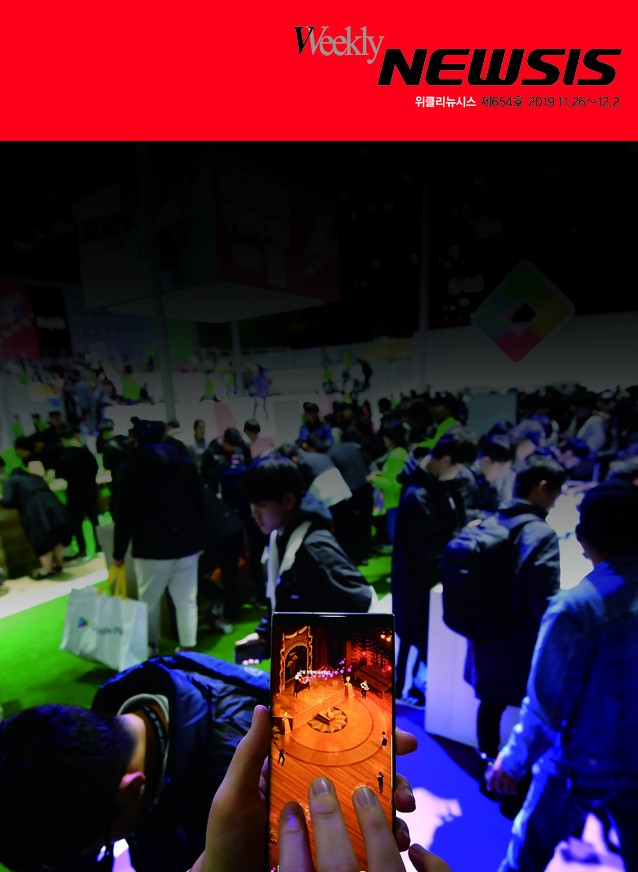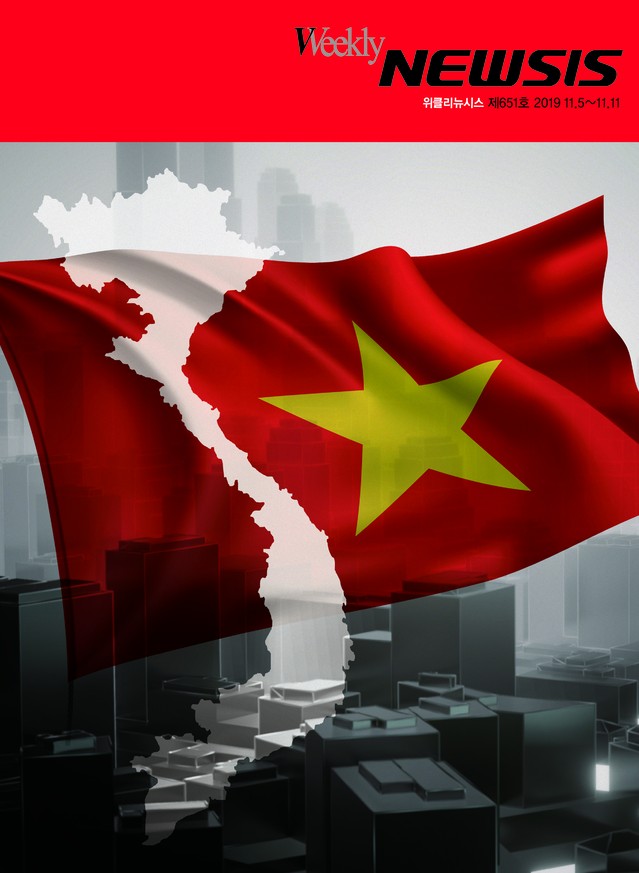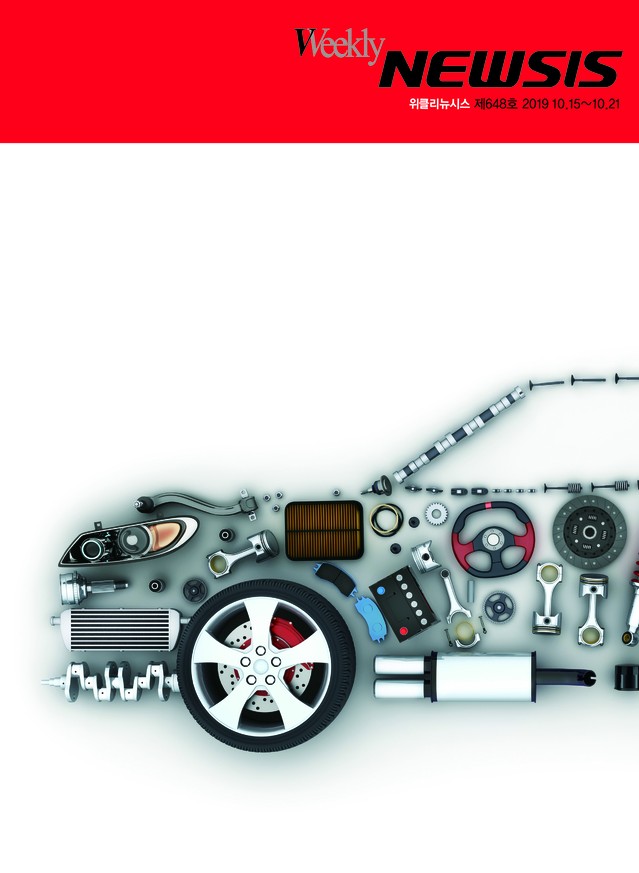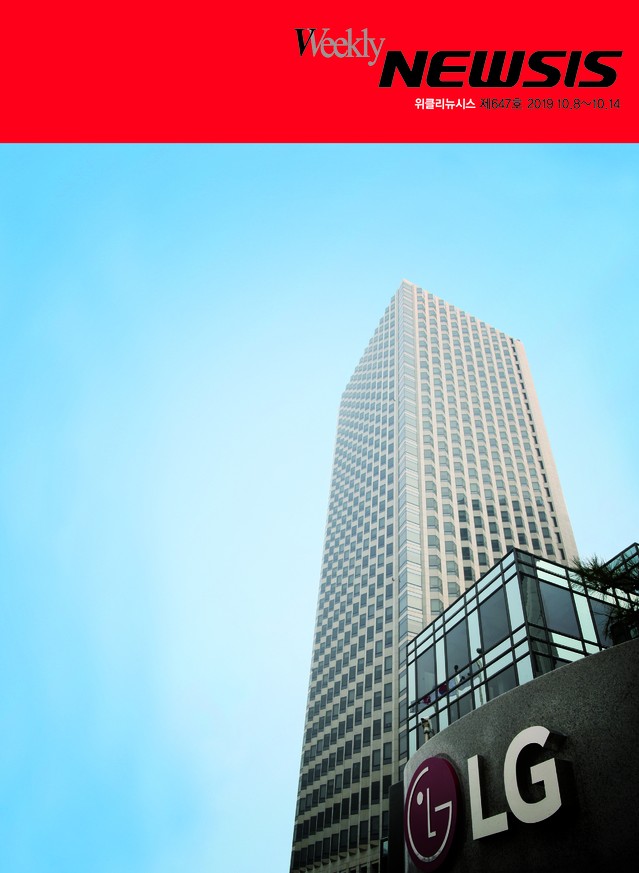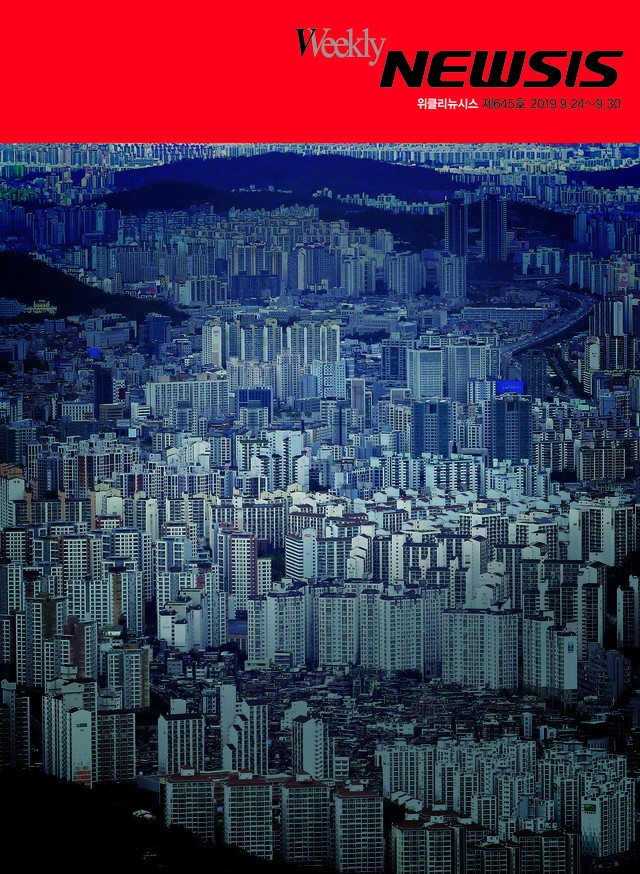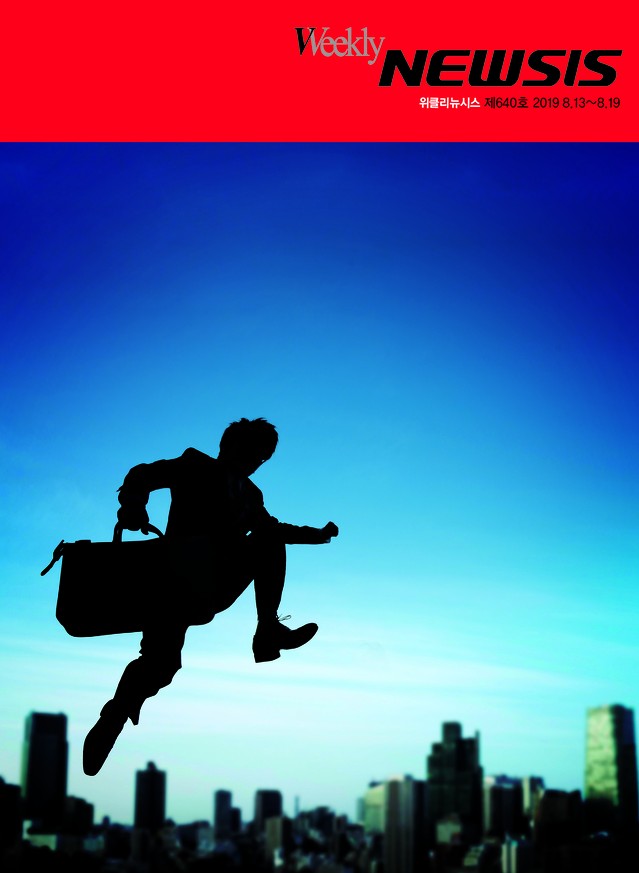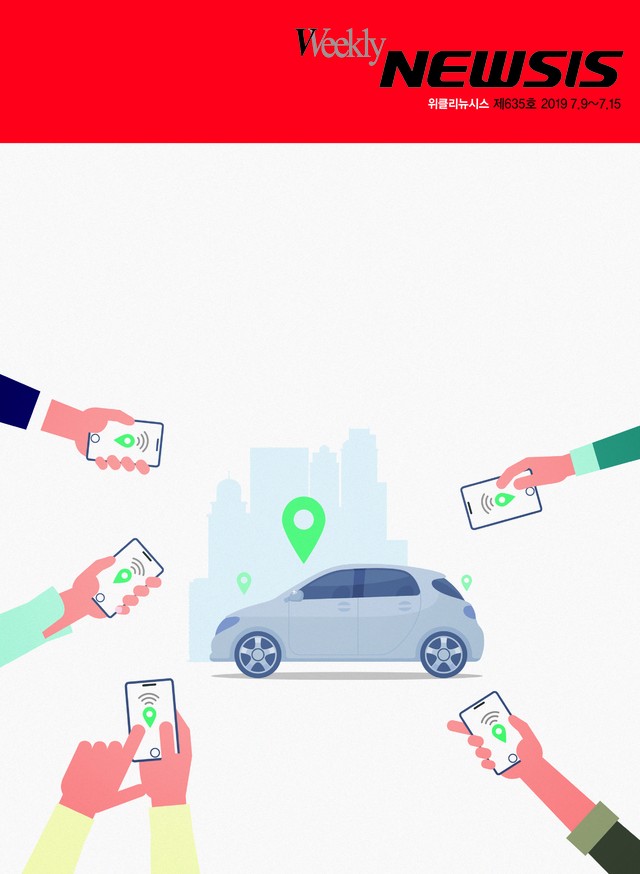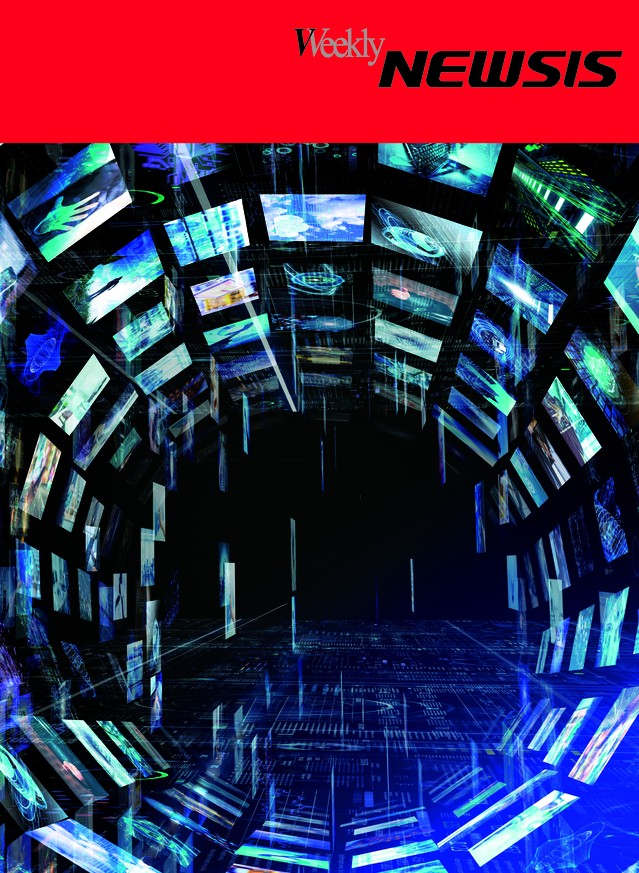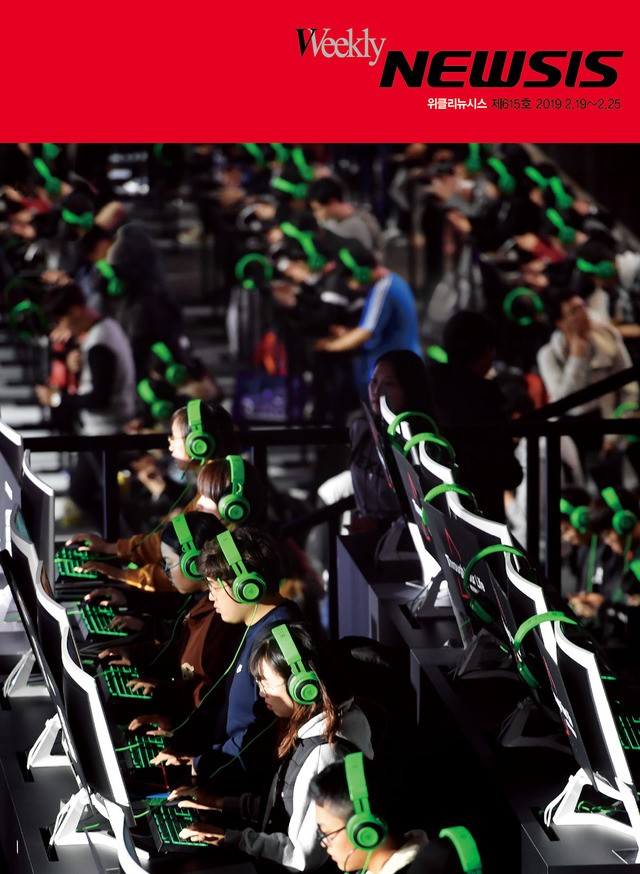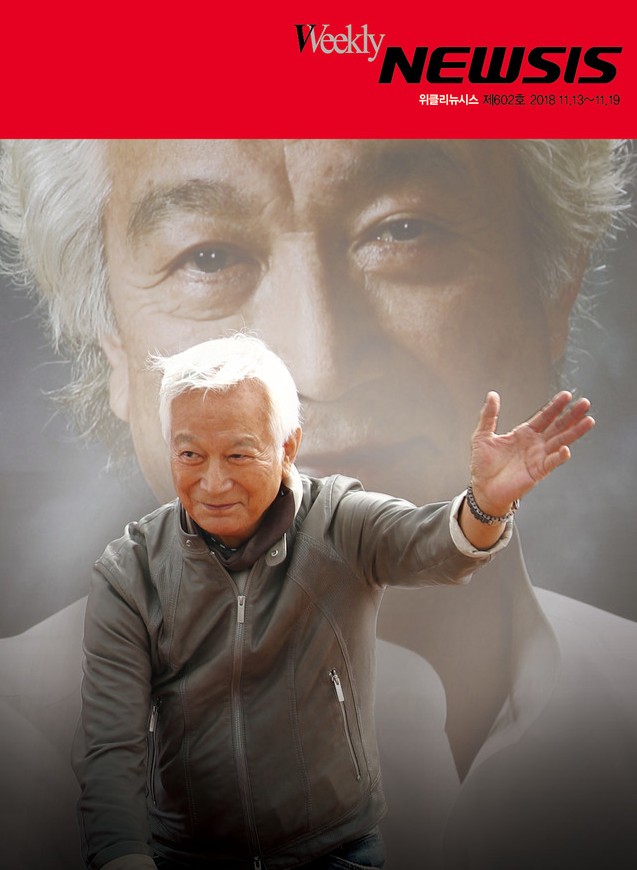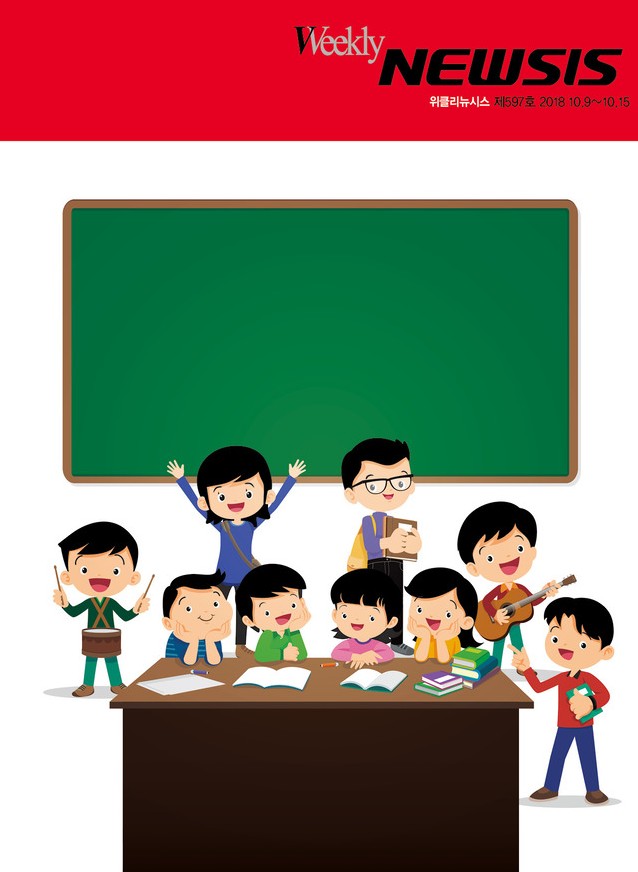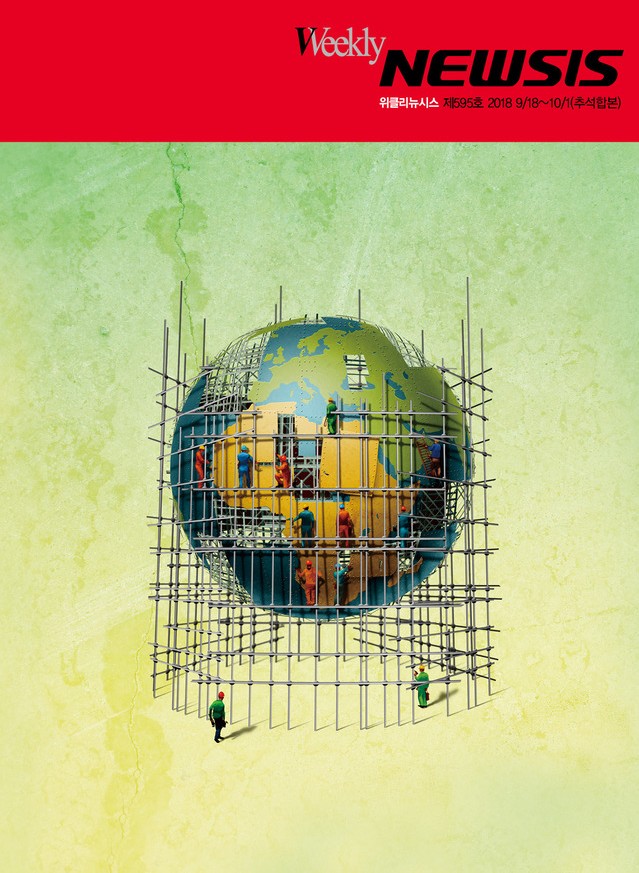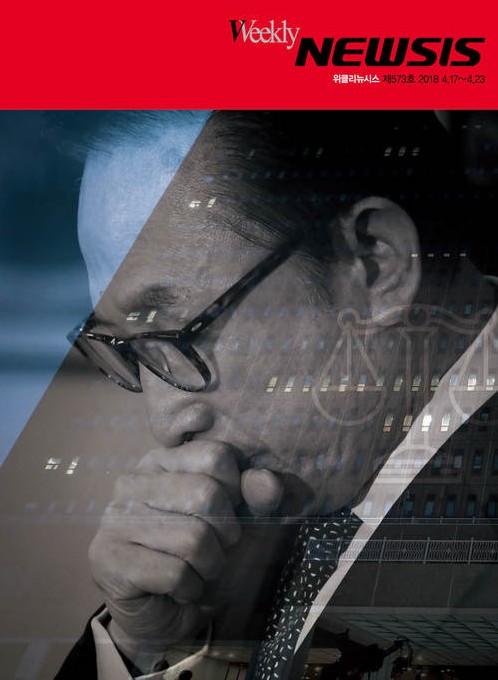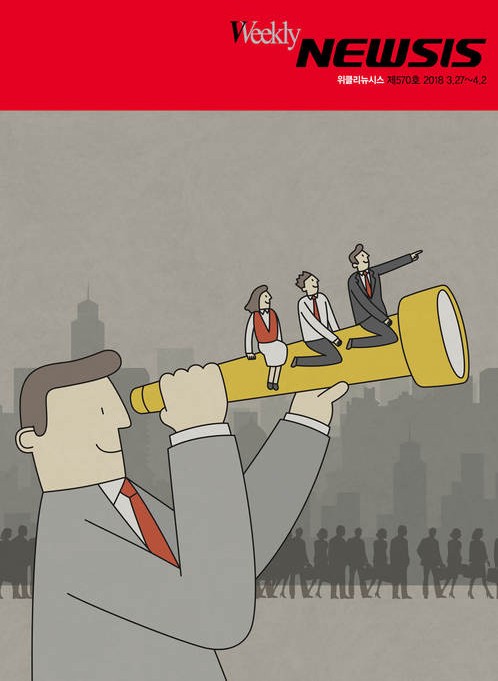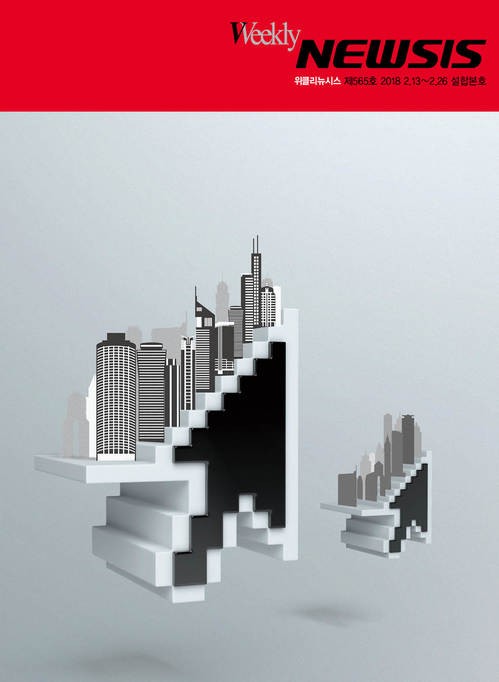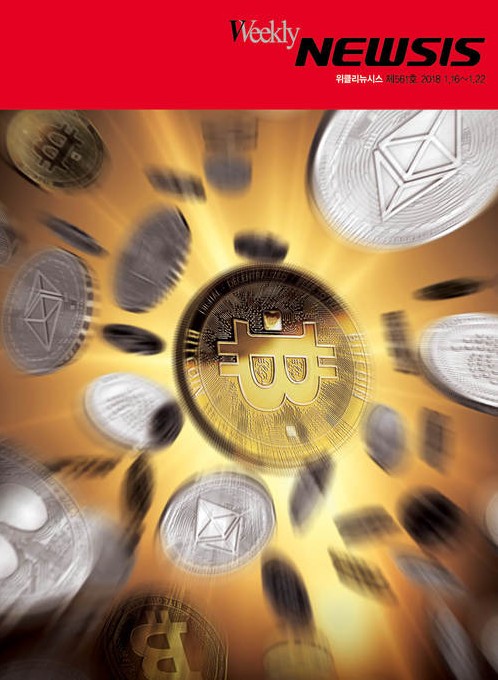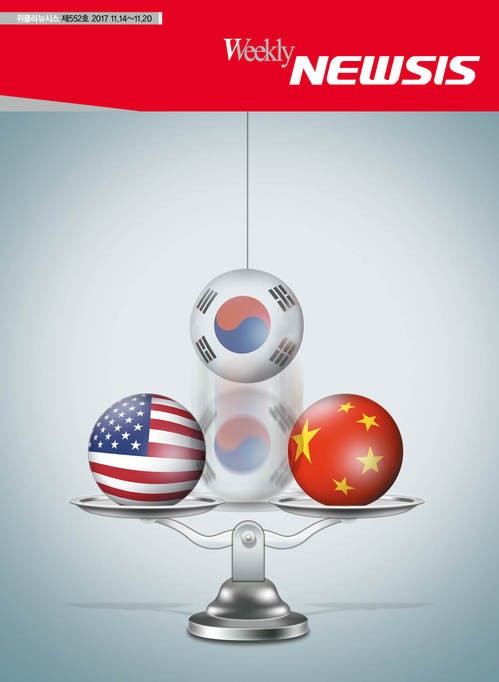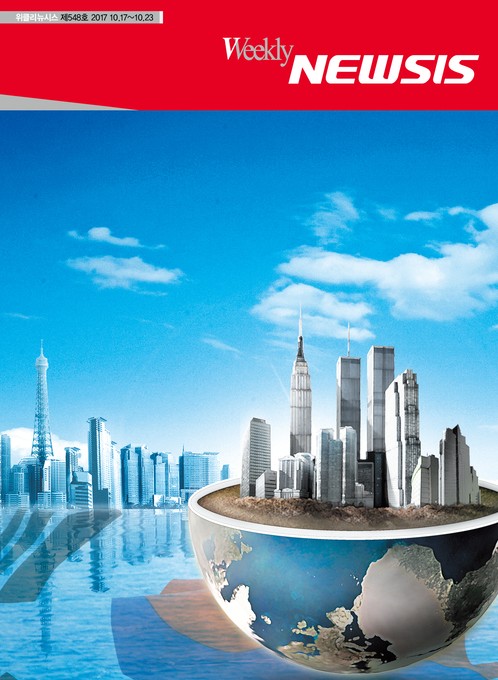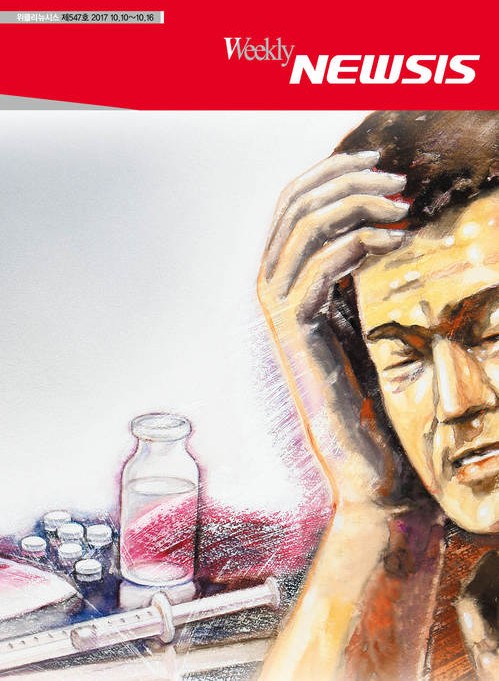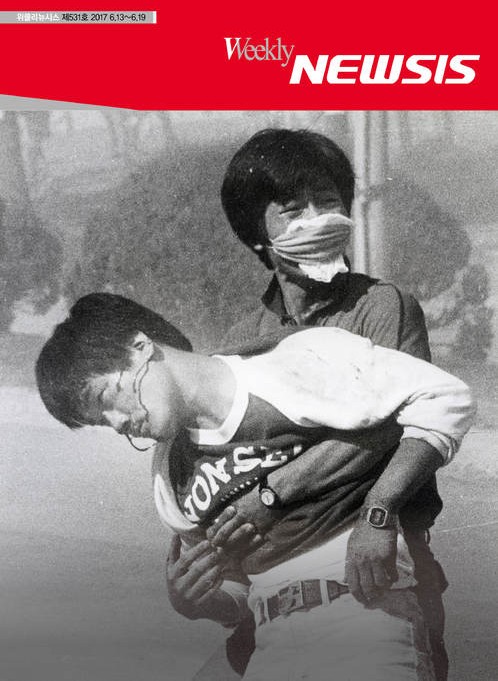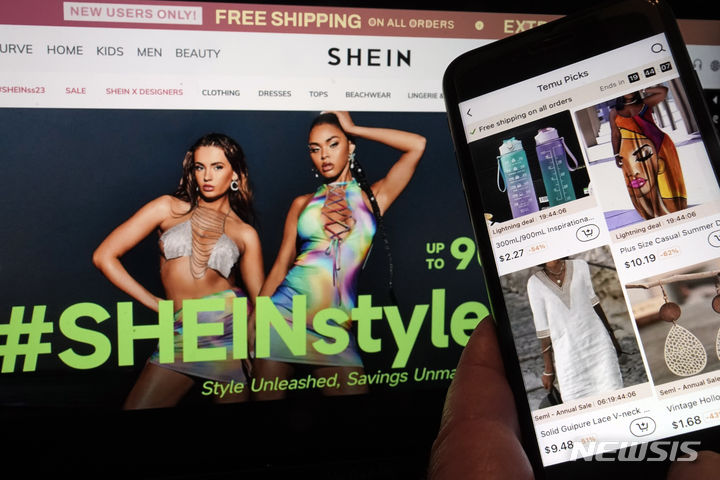시끄러운 수다 대잔치, 최정나 '말 좀 끊지 말아줄래?'
최정나 첫 소설집 '말 좀 끊지 말아줄래?'에는 굉장히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등장한다. 무슨 말이 이렇게나 많은지 시끄러울 지경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가 계속되는데, 그저 장황할 뿐이다.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뻗어나간다. 아무리 말해도 서로를 더 이해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지 않는다. 표제작을 비롯해 '한밤의 손님들' '전에도 봐놓고 그래' '해피 해피 나무 작업실' '케이브 인' 등 8편이 담겼다. '말 좀 끊지 말아줄래?'는 장례식장이 배경이다. '이씨'와 '우씨'는 고인과 친구 '조씨'가 정확히 무슨 사이인지도 모른 채 "네가 고생이 많구나"라는 의례적인 위로를 전한다. 큰소리로 떠들어대는 옆테이블 남자의 말이 그 침묵을 덮어버린다. 그것을 시작으로 아무 말 대잔치가 펼쳐진다. '전에도 봐놓고 그래'는 시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노부, 노모, 남자, 아내가 모이는 이야기다. 하지만 생일 축하는 뒷전이다. 시어머니는 남자와 여자를 내내 따라다니며 몸에 좋은 것에 대해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다. 시아버지는 개고기를 삶는 데 여념이 없다. 불편한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 "노부는 노란 들통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들통 안에서 국이 끓었다. 구수하고 누릿한 냄새가 주변에 떠돌았다. 노부가 국자로 기름을 걷어내 마당에 뿌렸다. 붉은 국물이 시멘트 바닥에 스며들어 마당에 얼룩이 졌다. 남자가 들통을 들여다봤다. 늦었구나. 노부가 국자로 국을 휘저었다. 죄송해요. 아니다. 내일 안 오고 오늘 왔으니 다행이다. 남자가 어색하게 웃었다. 생신인데 아버지가 음식을 차리세요? 그럼 누가 차려주냐? 나가서 드시면 편하죠." "나는 무엇이 별꼴이고, 따라서 그것의 반쪽이 어떤 건지 궁금했지만 잠자코 있기로 했다. 내가 캐묻더라도 돼지는 왜 그런지 알려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거였다. 다만 돼지의 불손한 태도에 기분이 상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만 가지 인상을 쓰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최씨는 2016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작가의 말에서 "비어 있는 골목에는 수많은 소리가 남아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소리들을 채집하고 기록한다. 그리고 좌판을 깔듯 이야기들을 펼쳐놓는다. 그러니까 여기 실린 여덟 편의 소설은 이런 이야기이다.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와 그를 지나치는 사람들에 관한." 276쪽, 1만3000원, 문학동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