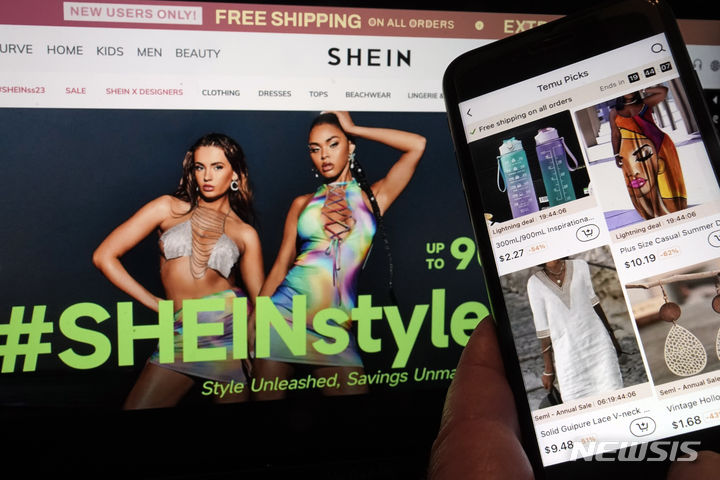[에너지 수첩]부담이 너무 큰 37% 저감 약속
그리스 외채 위기와 관련해 채권단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안에 대해 그리스 국민의 61.3%가 반대했다. 이미 2010, 2012년에 2520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정부는 투표 결과에 힘입어 재협상을 요구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적반하장이다. 문제는 국제 여론이 그리스에 동정적이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구제금융 지원 용의를 표하고, 중국은 3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배경으로 실질적인 해결사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은 나토의 동진 정책을 위해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해야 한다고 채권단을 압박한다. 독일 정부만 가혹한 채권자로 몰리는 형국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가 요구한 25% 고금리,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강제적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했다. 이때 온 국민이 경험한 실업과 도산, 자산가치 하락과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등은 아직도 깊은 내상으로 남아있다. 한국은 가혹한 대우에 합당한 민족인가. 위기의 원인이 한국은 일시적 외환보유액 부족이었고, 그리스는 국가채무의 구조적 누적인데도 그렇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중 잣대는 많다. 당시 국내 우량기업들이 소리 없이 외국에 넘어갔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구제금융으로 인해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S&L) 부실 사태, 1990년대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 파산, 2000년대 베어스턴스, 패니매, 프레디맥 국유화 등이 빚어졌다. 수혜자를 추적하면 최종 채권자로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금융자본이 나타난다. 결국 국제 금융자본의 차가운 생태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 통합으로 독일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는데 그리스가 긴축에 저항함은 그럴만한 역사적, 지정학적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한국이 그러지 못했던 것은 힘이 없어서였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도 인간이 하는 것인데 다를 이유가 없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익을 희생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런 정부를 국민들이 봐주지도 않는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기후대응을 더 이상 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근래 미국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미국 내에서 셰일가스가 대규모로 개발되자 앉아 있어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제할 필요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유럽은 이미 제조업이 정체 혹은 쇠퇴 단계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지 않고 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고가로 판매하고 싶어한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공격하지만, 정작 자국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 언급을 피한다. 중국은 경제성장이 꺾이면 정치 안정이 흔들린다. 도시의 대기오염에는 민감하지만, 지구 온난화에는 신경 쓰기 어렵다. 기후변화이든, 외채문제이든 각국은 이기적이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빼앗긴다. 선진국은 한국을 부추겨 온실가스 대응에 앞장세워 개도국을 압박하려 한다.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은 중심을 잡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솔선한다 해도 중국은 동참하지 못한다. 중국과 인도의 동참이 없으면 누구의 노력도 소용이 없음은 세상이 다 인정한다. 기후대응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 같지만, 소비자와 국민이 부담한다. 기업은 부담의 통로일 뿐이다. 기후대응 부담은 일종의 준조세다. 재정학 원칙에 충실하려면 이번 2030년까지 BAU대비 37% 저감안을 국제연합(UN)에 제출하기 전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회의에서 조약으로 합의된 다음 국회 비준 단계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어렵다. 미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했지만, 한국은 못한다. 세계 통일정부가 없는 현실에서 전 지구적 기후대응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1992년 리우회의 이후 행보를 보면 전망은 어둡다. 그런데, 한국은 의무감축국이 아님에도 2009년 2020년까지 30% 저감을 선언했고, 이번 2030년까지 37% 저감을 약속했다. 각 예측기관은 금년 성장률을 3%대에서 2%대로 모두 낮췄다. 난제와 난제가 중첩해 있고, 잃어버린 20년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데도 정부는 제조업을 해외로 몰아내는 37% 저감을 약속했다. 지금은 체면을 좀 잃더라도 안살림을 알뜰하게 챙겨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한국에너지재단 염명천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