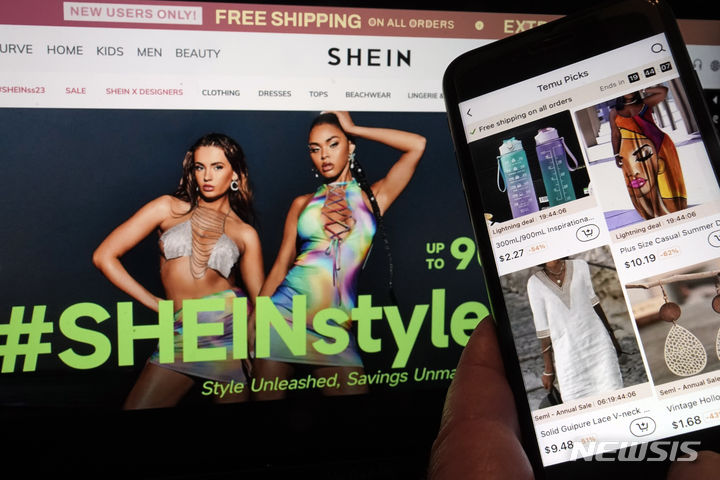[뒤틀린 광복70년③]뒤늦은 보훈, 독립운동가를 '가난'으로 내몰아
독립유공자가 가난하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희생하거나 뚜렷한 공훈을 세운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히 보상하는 '보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프랑스 미테랑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맡았던 공직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나라 보훈처장격인 재향군인상이었다. 미테랑 전 대통령은 1947년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공직을 시작했고, 이후 16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테랑이 보훈 업무를 맡았던 시점이 1947년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만인 1947년부터 나치와 맞섰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 하는 업무에 착수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훈 제도의 시발과 연관돼 있다. 우리나라 보훈 업무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가 시작이었다. 이전까지는 사실상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에 대한 보훈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17년이 지나서야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보훈 업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일제와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는 대부분 광복 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총칼을 들고 일제와 맞섰던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으로 돌아와 막노동판을 전전하거나 보따리 상인이 돼야 했다. 게다가 가장 문제는 2세 교육이었다. 이 '잃어버린 20여 년' 동안 전직 독립운동가들은 각자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으며, 자녀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이 무려 60%를 넘고, 고정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본인과 후손들의 연령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무직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광복회 관계자는 "독립운동가 유족의 경우 80%가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된다"며 "일일이 공개할 수 없지만, 많은 분이 상당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해방 후 독립운동가에 대한 보훈에 눈을 돌린 것은 20년이 훨씬 지나서"라며 "보훈처가 창립될 때는 그나마도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공적에 비중을 더 뒀다"고 설명했다. 방 사무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2세 교육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독립운동가 중 명망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난이 대물림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