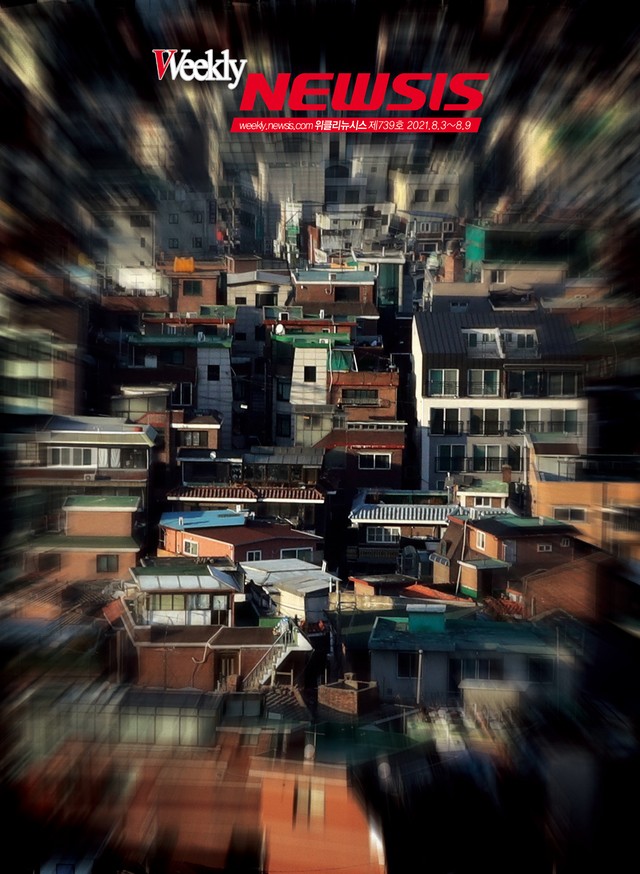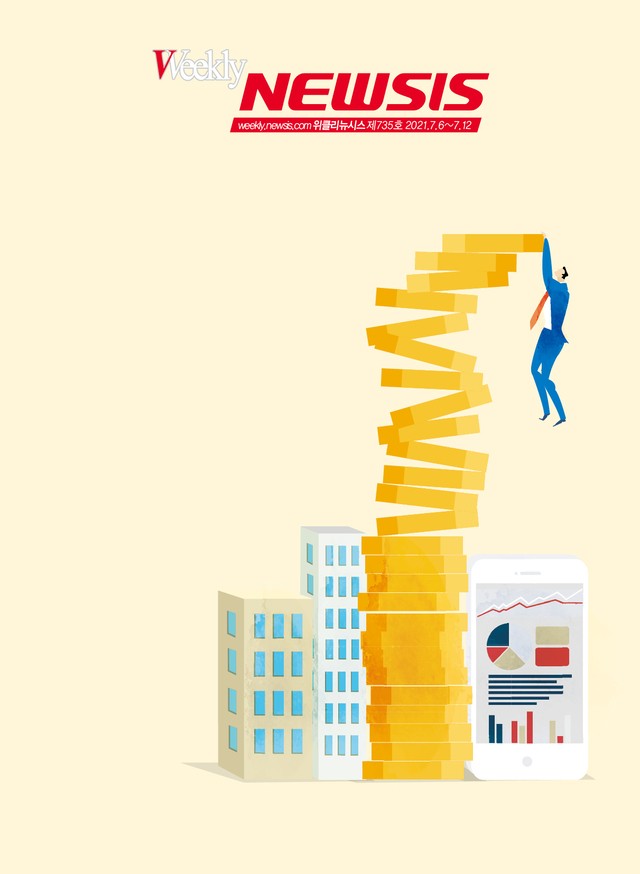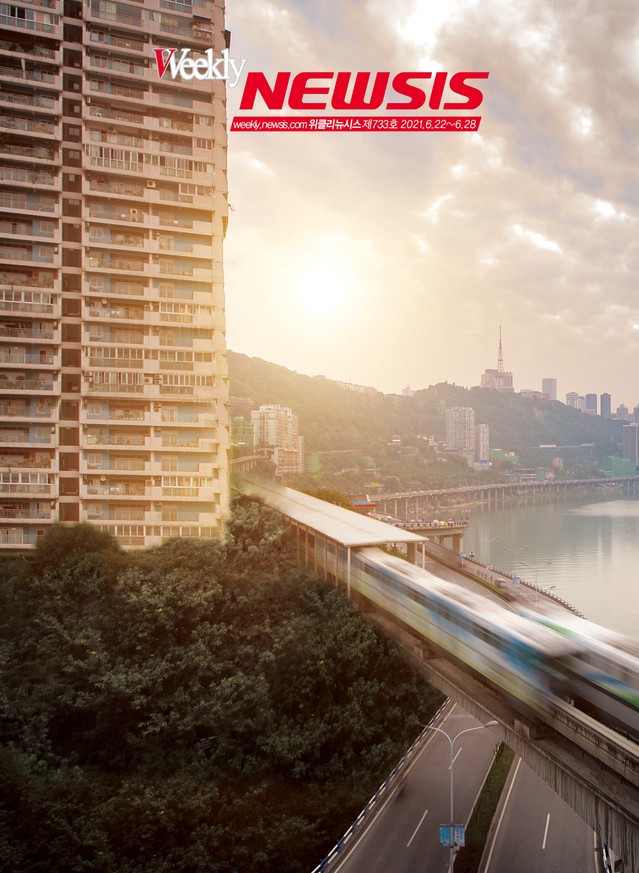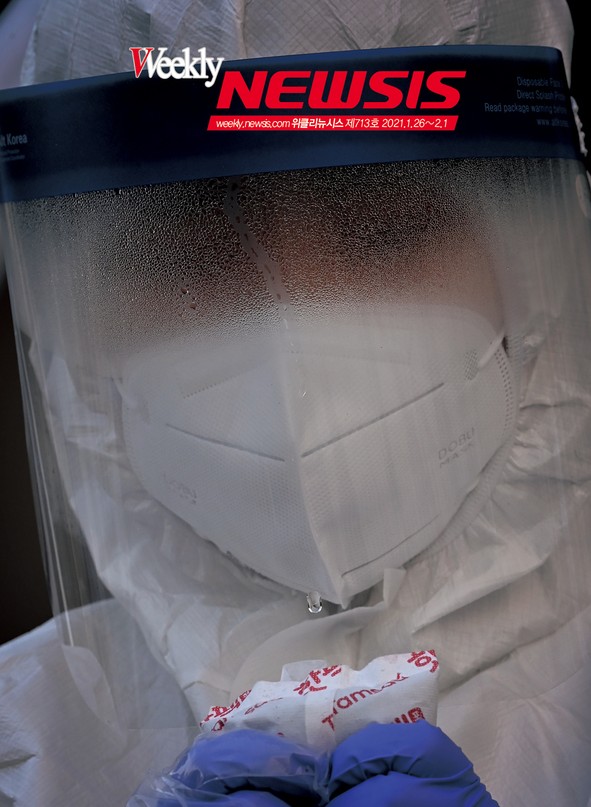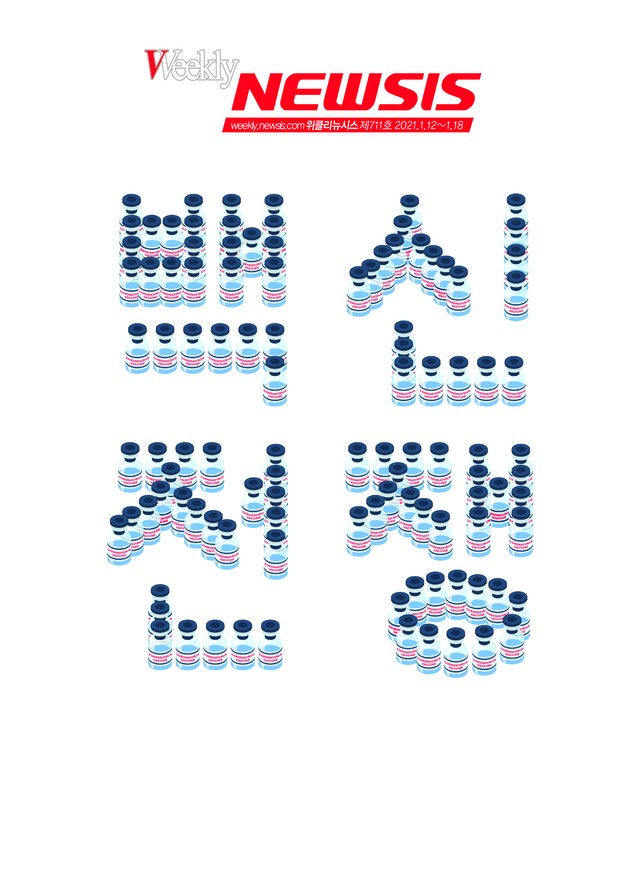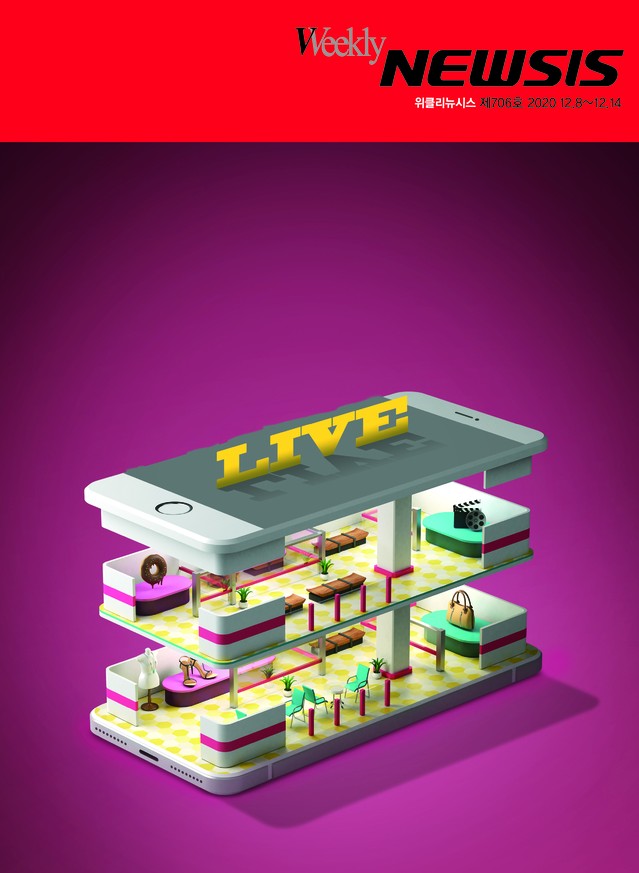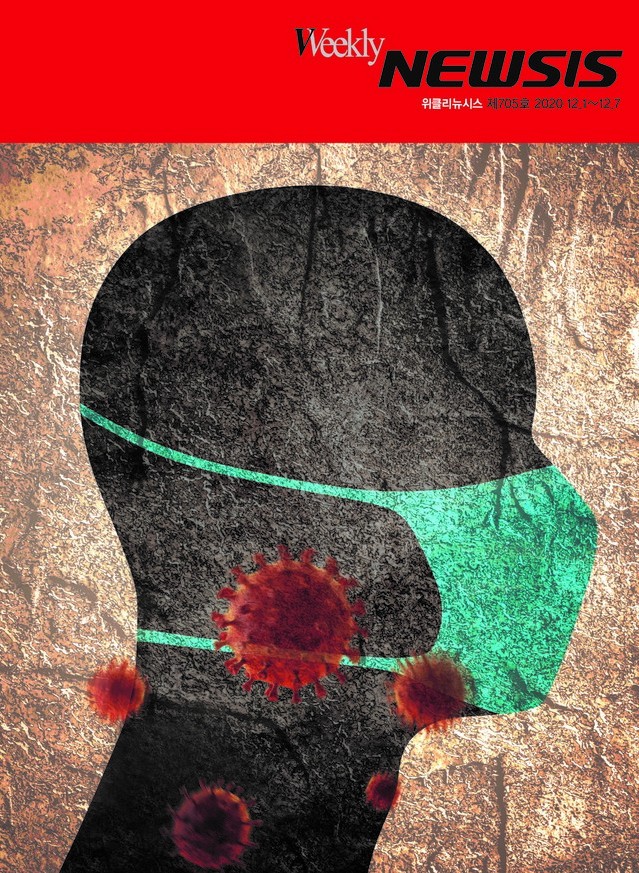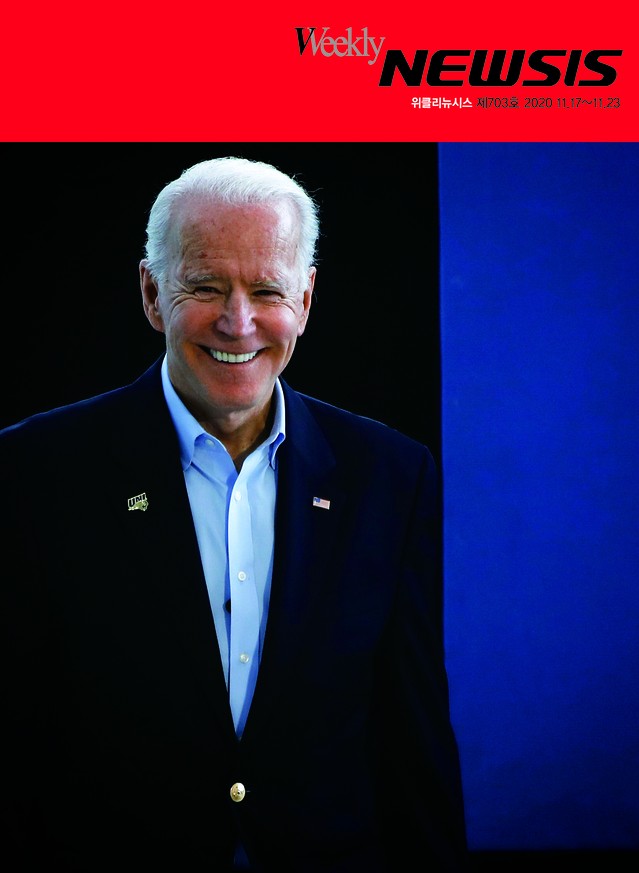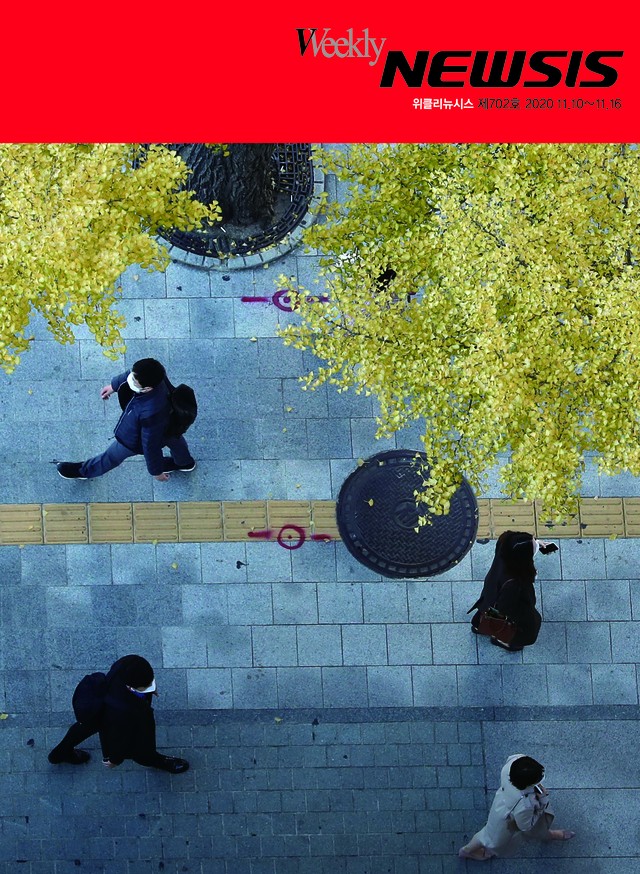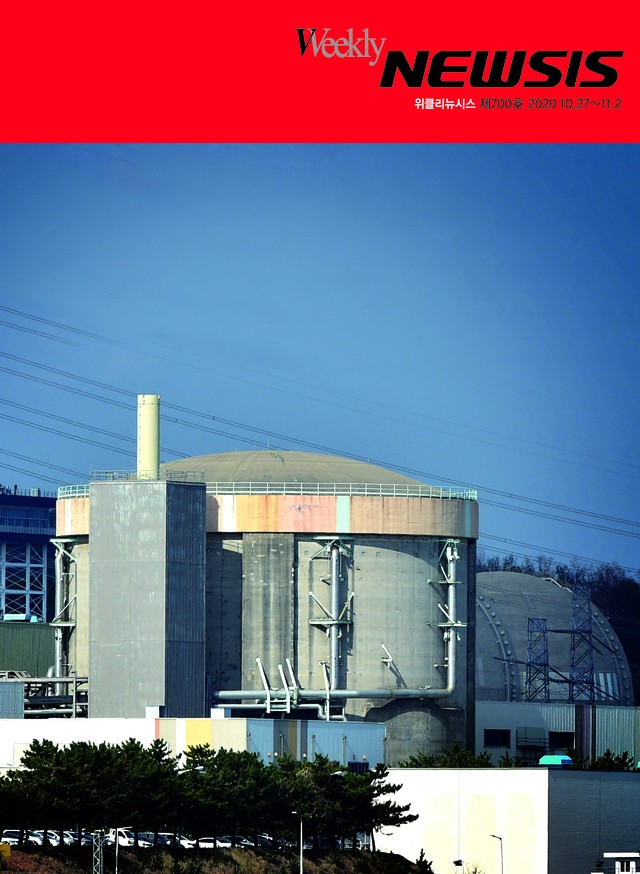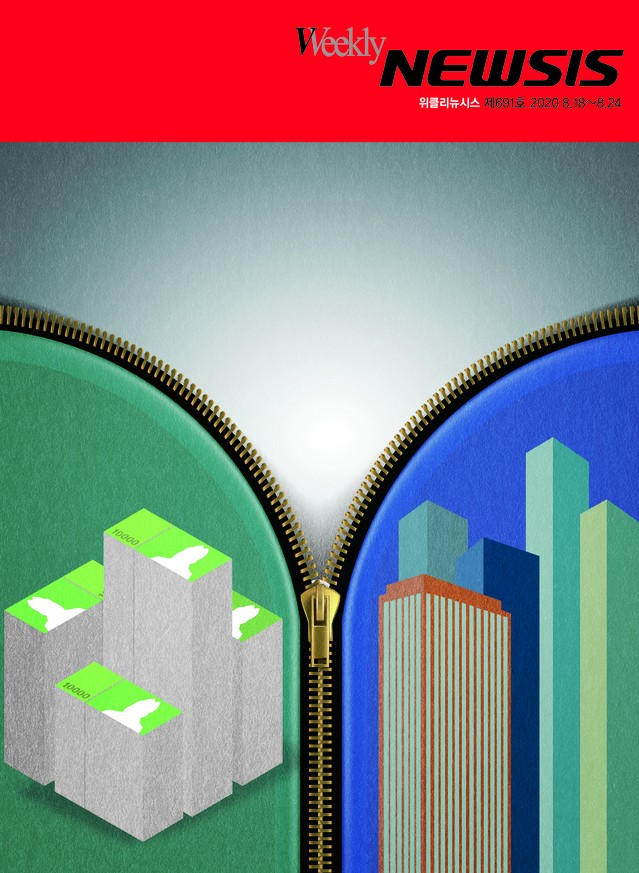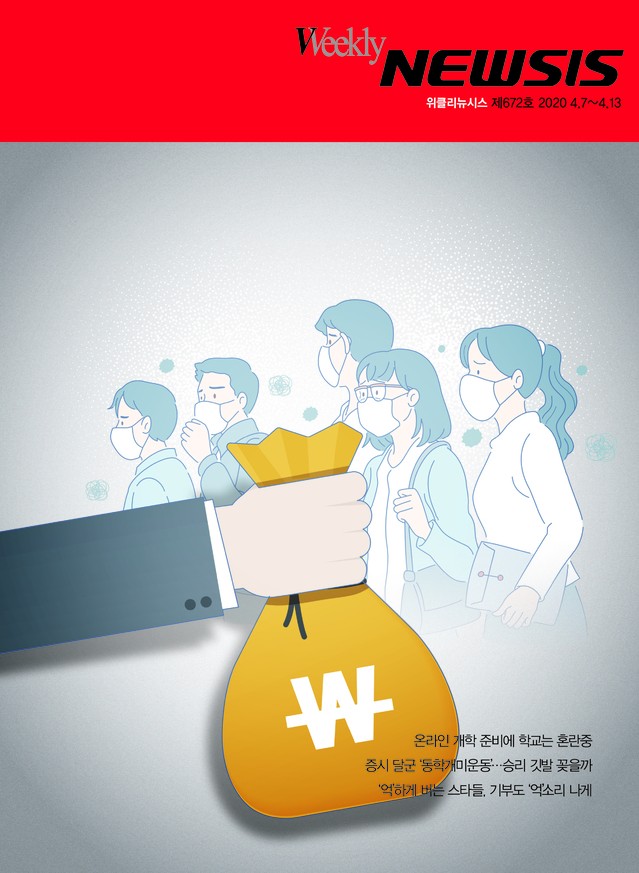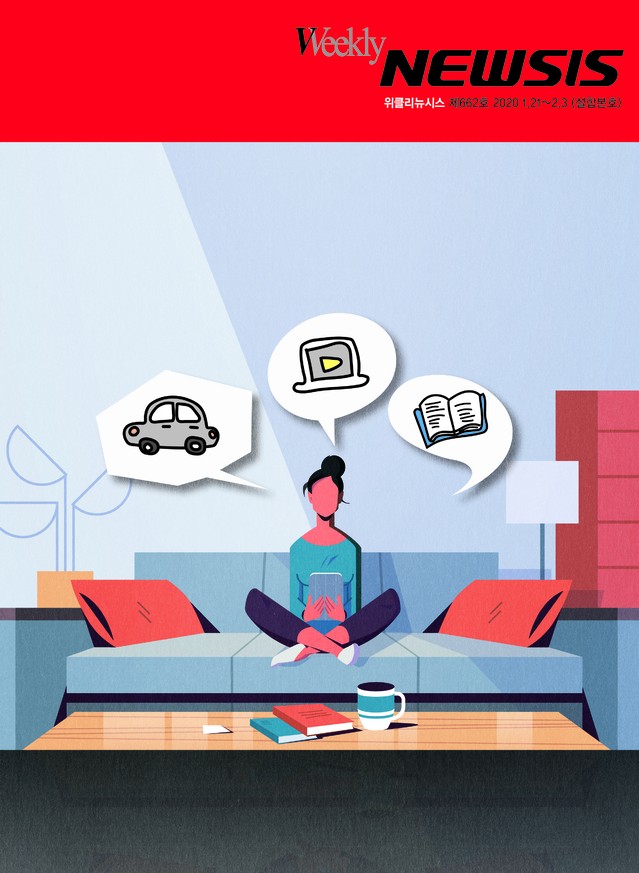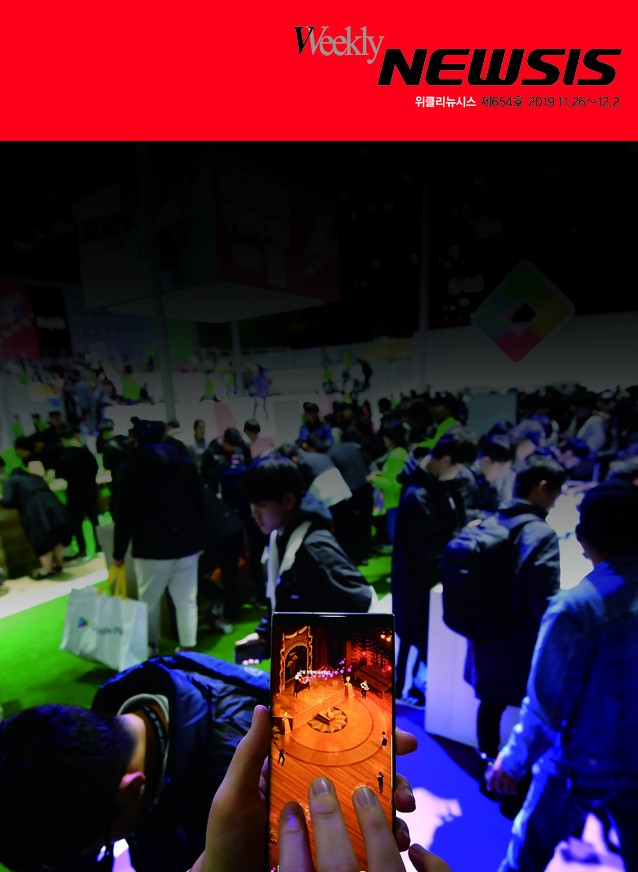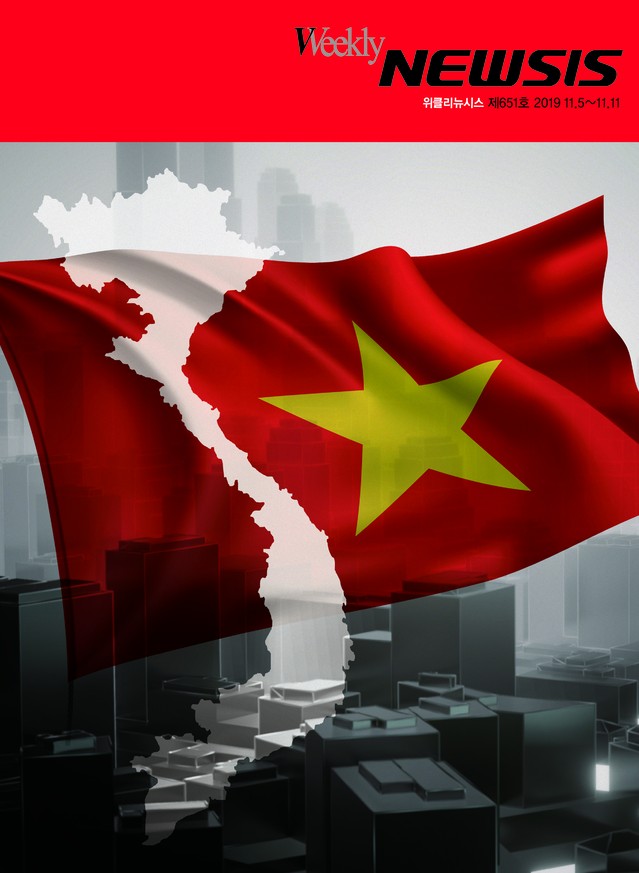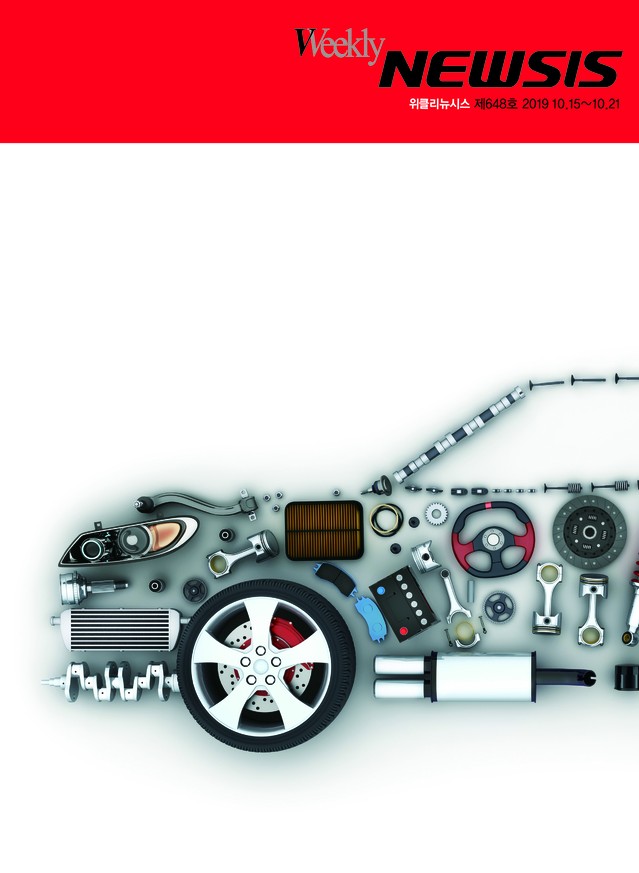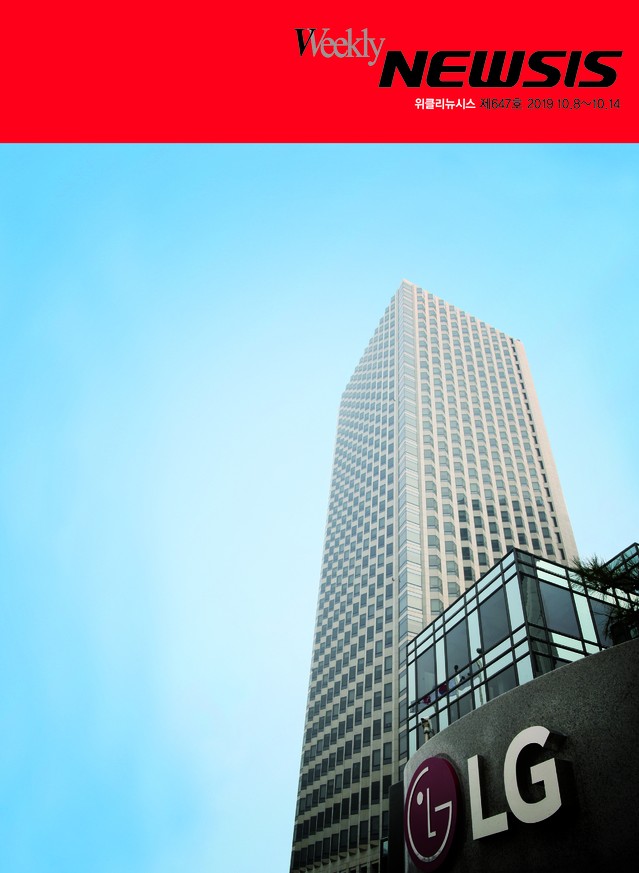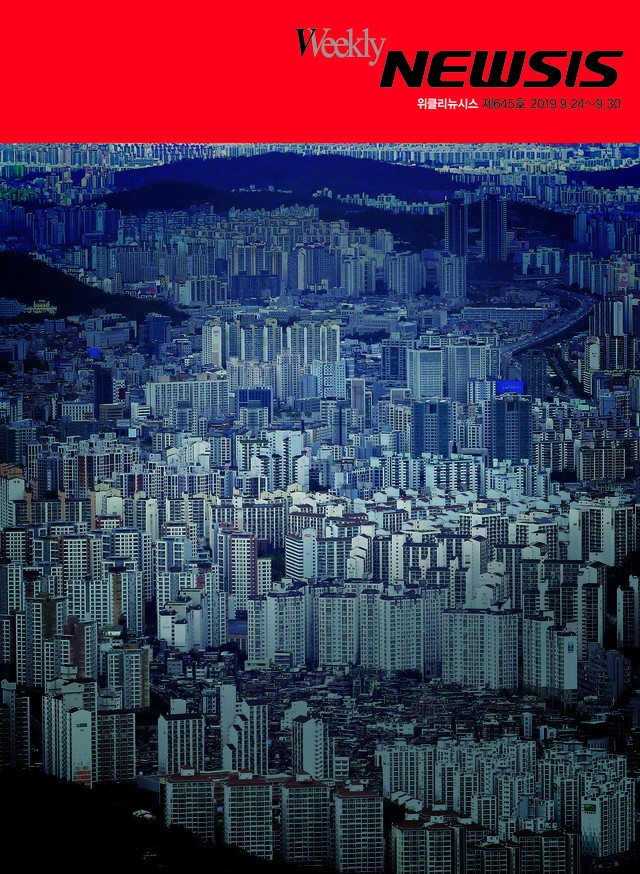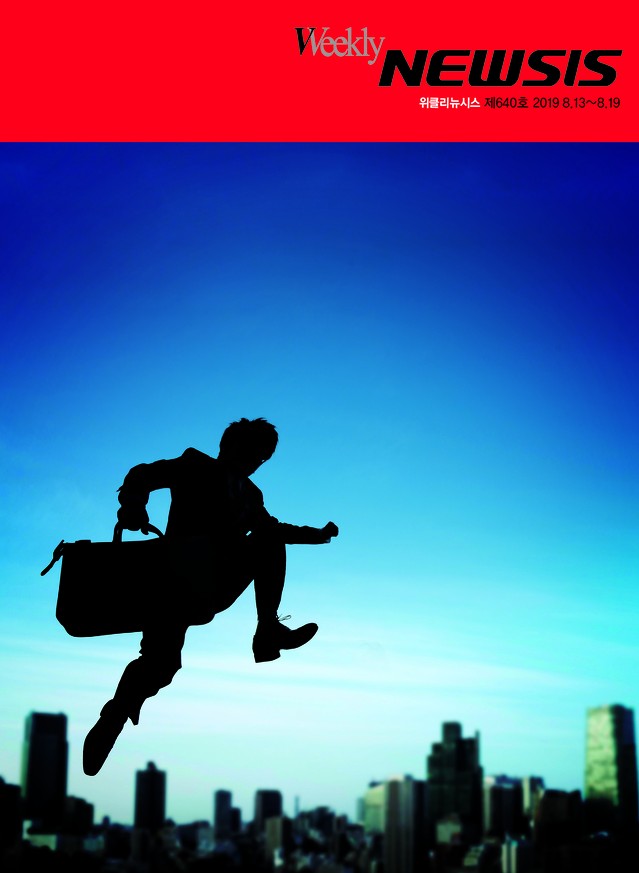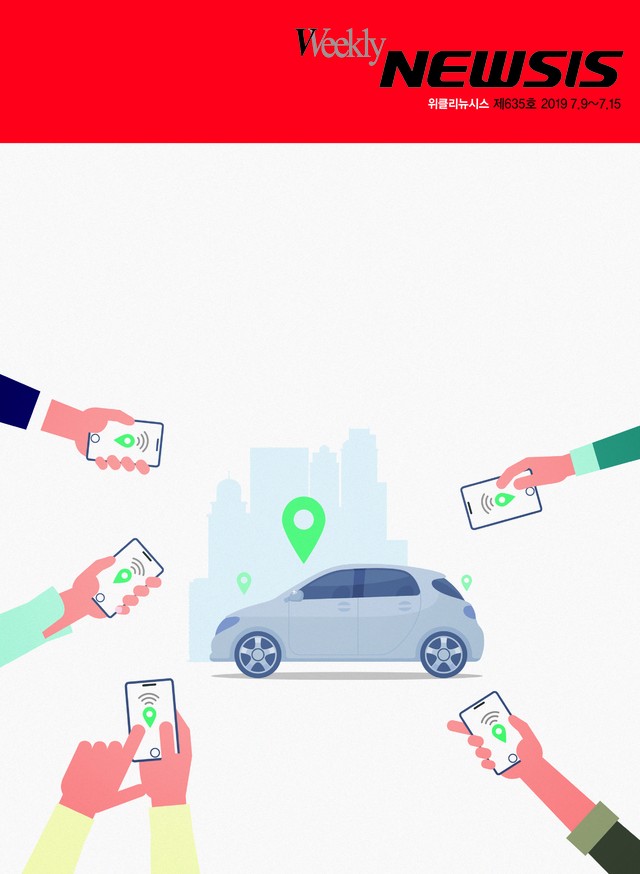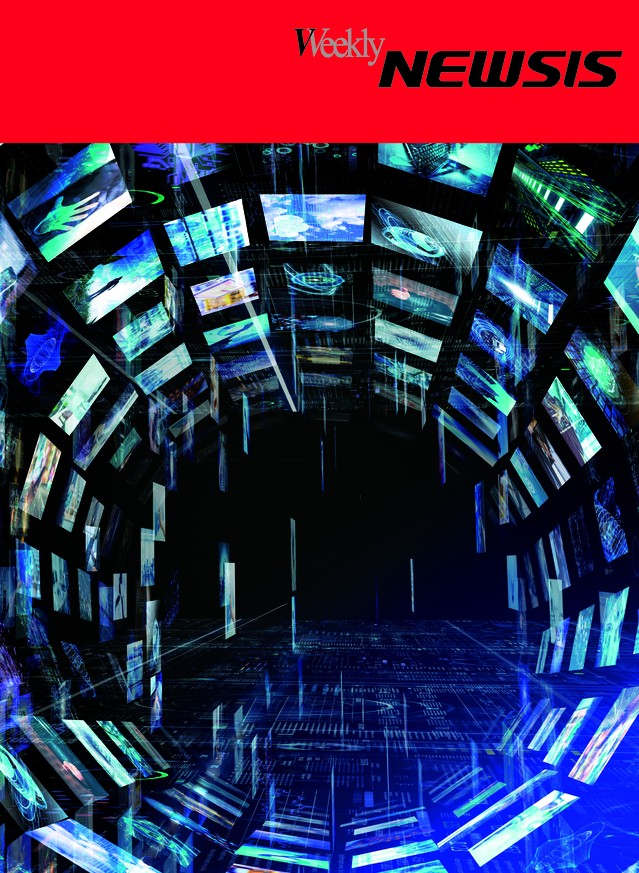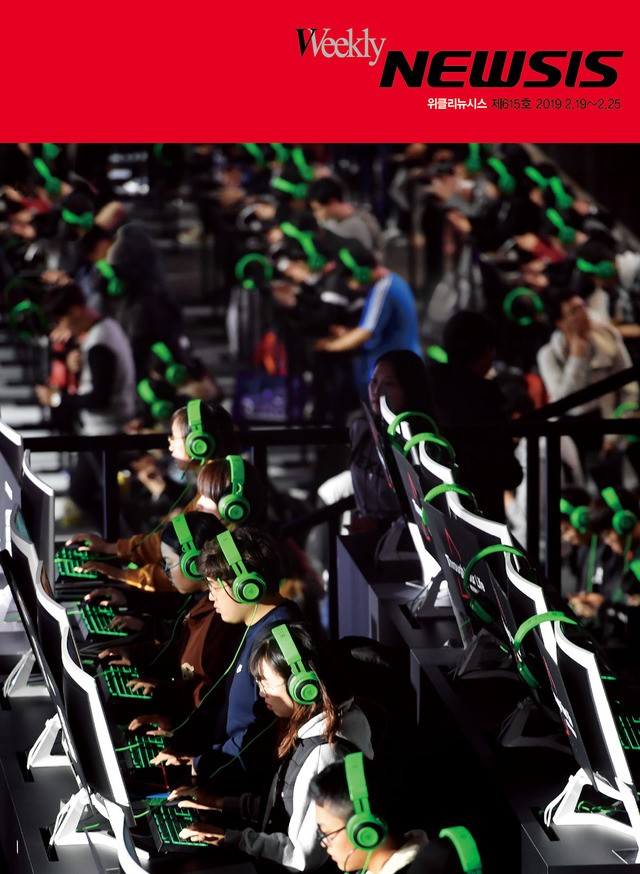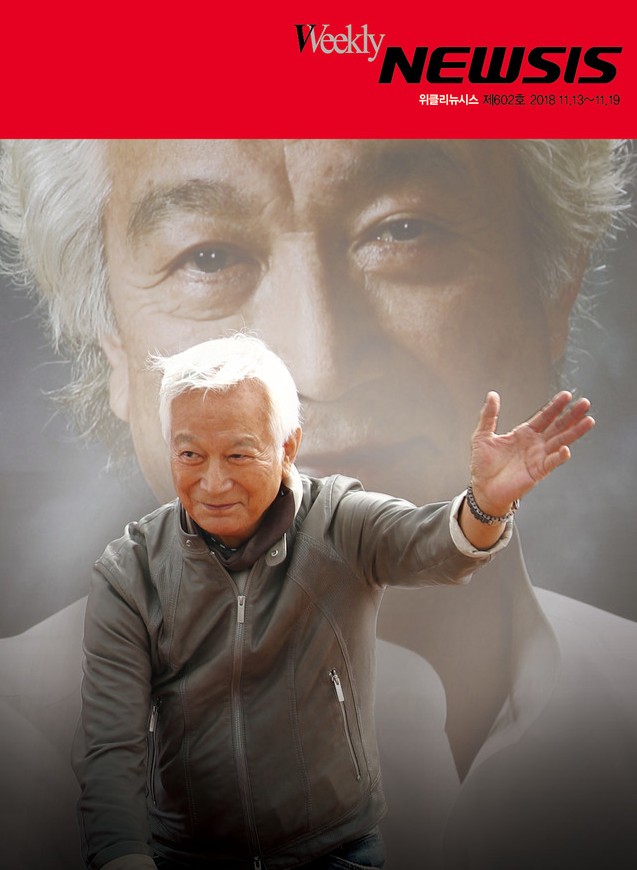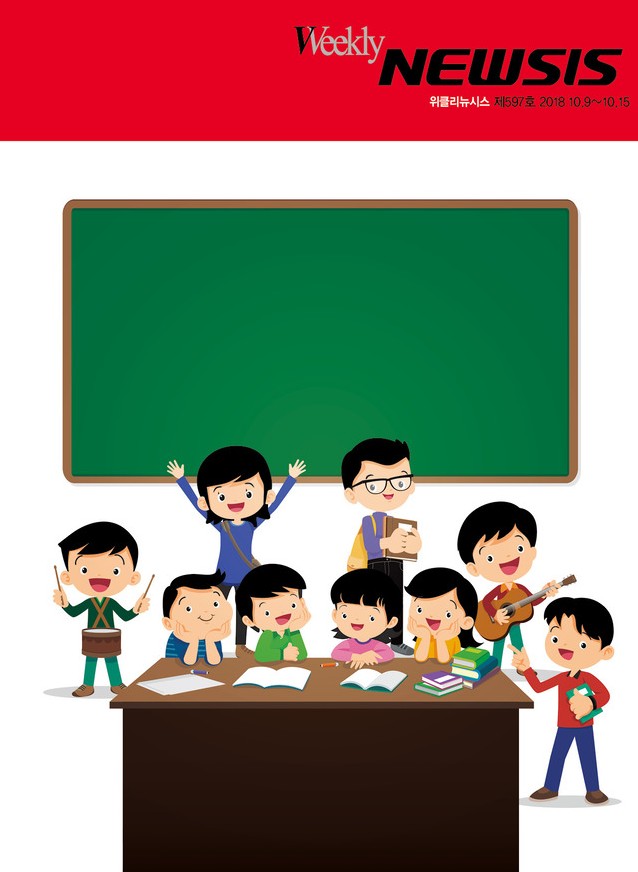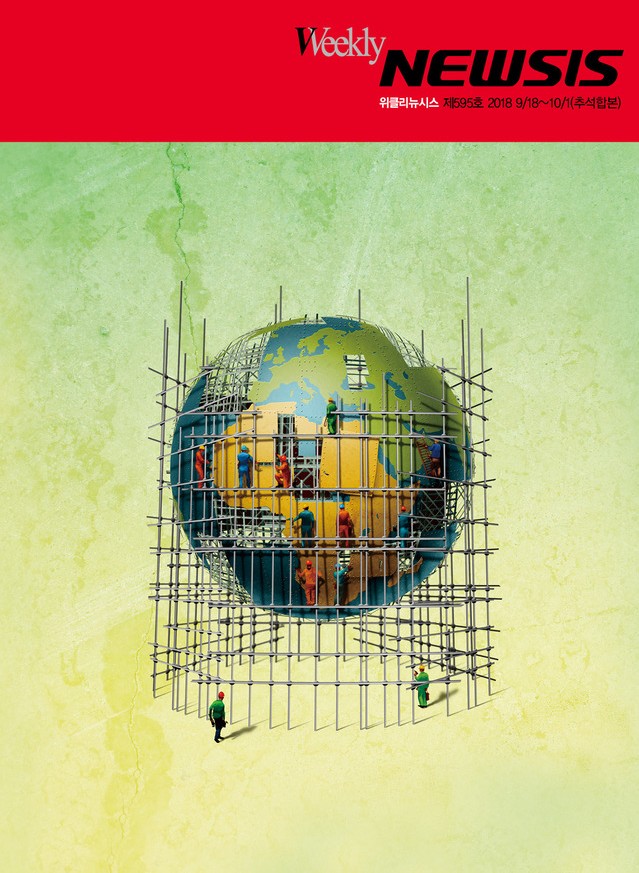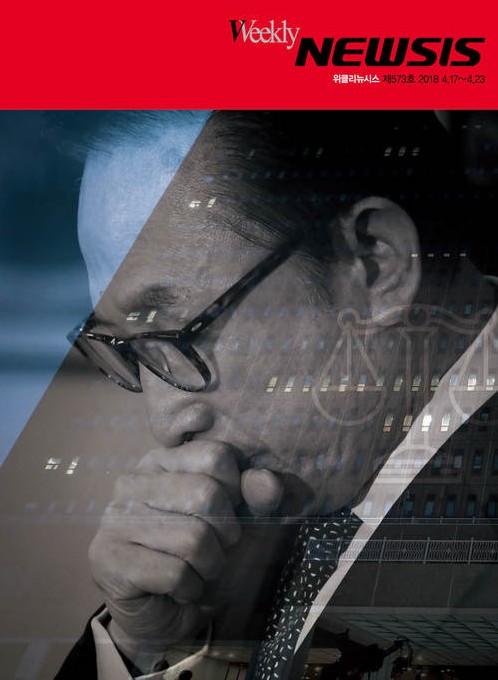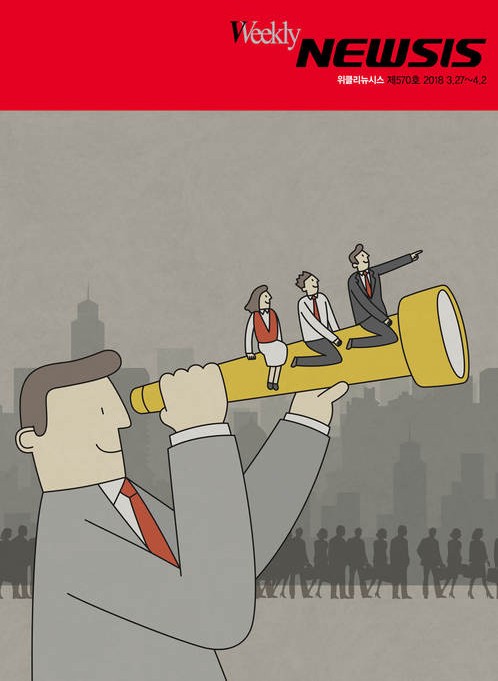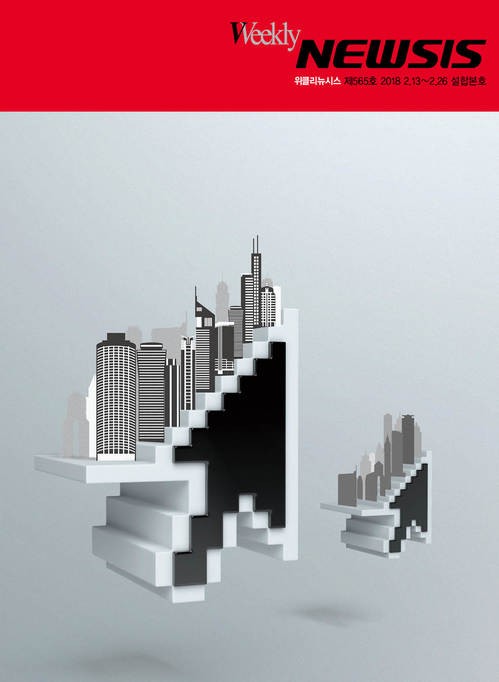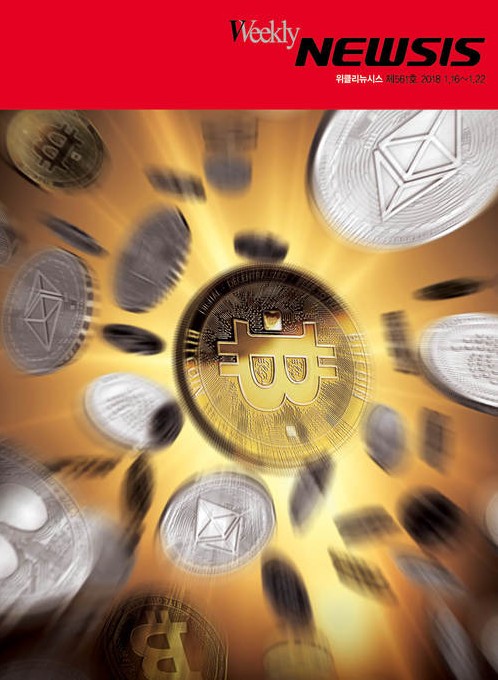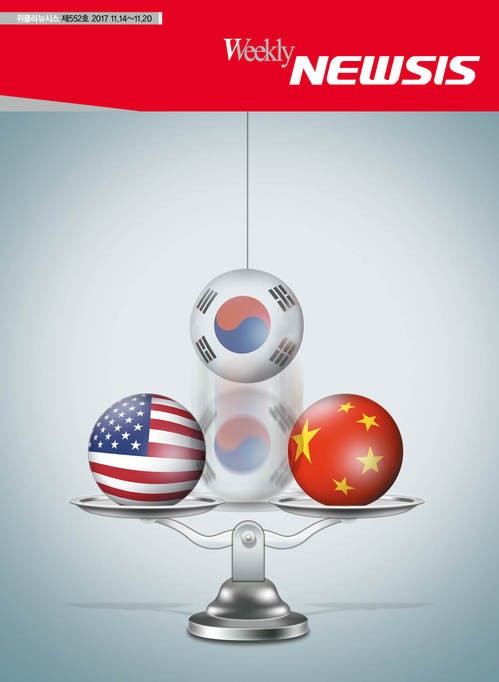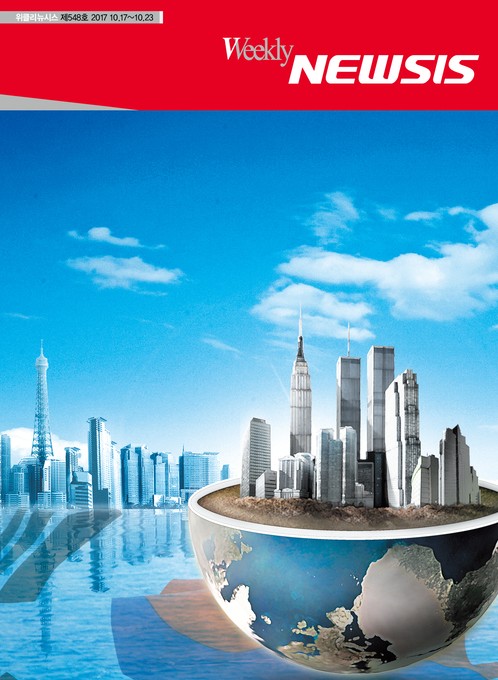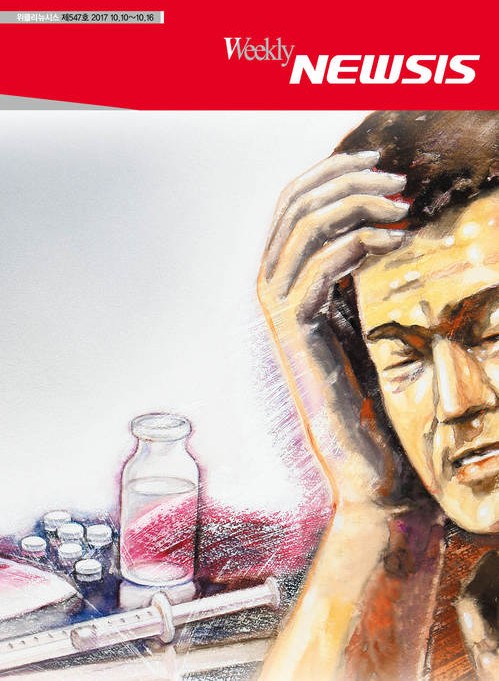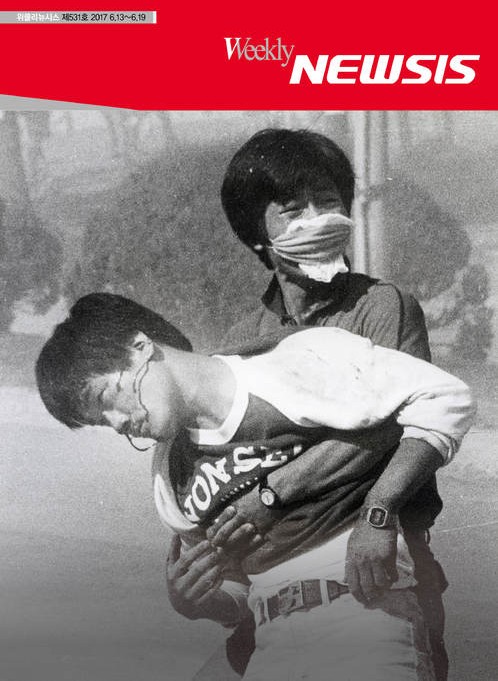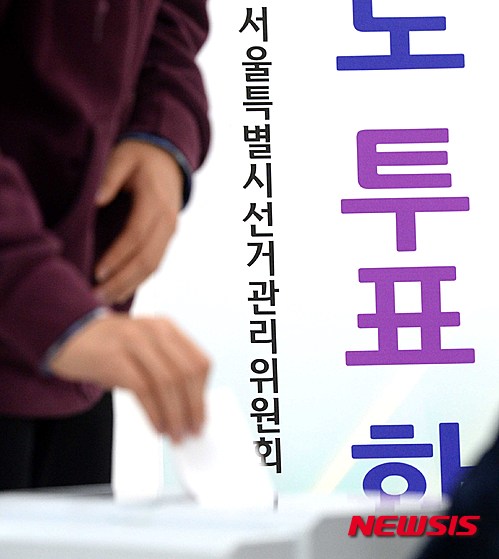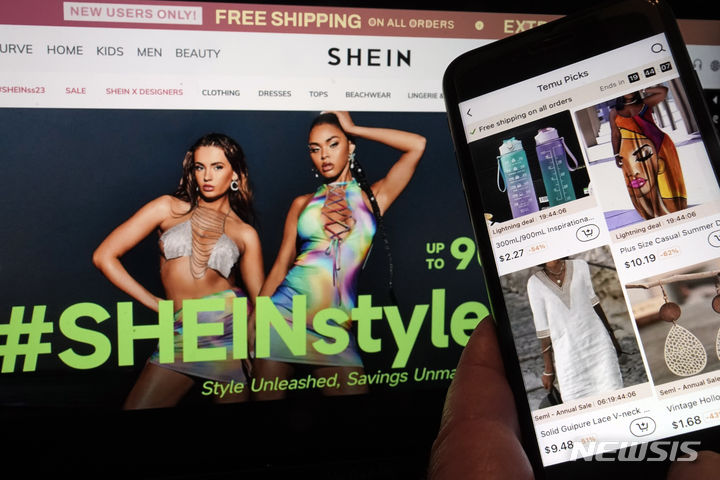1인1표가 평등하다는 '거짓말'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민국 헌법 41조 1항이다. 헌법 41조1항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룰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1표의 가치가 같지 않게 작동할 때 이 게임판은 흔들려 버린다. 선거가 평등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와 당신이 행사하는 1표의 가치는 같지 않다. ◇30만 명의 대표도 1명, 10만명의 대표도 1명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선거구별 인구 격차는 '표의 등가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경북 영천과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등은 지역구 인구수가 10만 명 정도다. 반면 서울 강서갑이나 경기 김포, 인천 서구강화갑의 인구수는 30만명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리고 경북 영천과 서울 강서갑은 모두 대표자 한 명을 뽑는다. 간단히 해도 계산해도 경북 영천의 유권자의 한 표는 10만분의 1이고, 서울 강서갑 유권자의 한표는 30만분의 1이다. 영천 유권자가 강서구 유권자에 비해 사실상 3배 더 강력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규모가 큰 광역단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시 인구는 약 150만명, 울산시 인구는 약 120만명 수준이다. 대전과 울산은 모두 6석을 배정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는 약 150만명이지만, 8석이 배정됐다. 대전과 비교하면 울산은 더 적은, 광주는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를 현재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제시한 기준인 2대 1을 따를 경우 경기도에서만 16곳이 조정 대상이 된다. 인천광역시 4곳, 서울특별시 3곳의 선거구가 상한 인구를 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영호남에서는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선거구가 많은 상황이다. 경상북도 6곳, 전라북도 4곳, 전라남도 3곳, 부산광역시 2곳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엄격히 인구수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구수만 놓고 선거구를 맞출 경우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5~6개 시·군이 합쳐지는 '매머드'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선출된 대표성 국회의원이 제대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또 농어촌 지역 자체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개편할 경우 국회의원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서 선출되기 때문이다. 농어촌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극소수로 줄어들 수 있다. ◇1등만 유효하다…그럼 내 한 표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의 현행 체제는 1인1표의 등가성을 가로막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정당투표를 기준으로 42.8%를 득표하고 50.7%인 152석을 얻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6.5%를 얻고 42.3%에 해당하는 127석을 챙겼다. 국회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두 정당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것이다. 이런 일은 승자독식 소선거구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당선자가 되는 1등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모두 사표(死票)가 되기 때문이다.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치를 계산해보면 1표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더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지역구의 득표를 보면 새누리당은 총 932만4911표를 얻고 지역구 의석수는 127석을 가져갔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지역구에서 815만6045표를 얻고 106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129만1306표를 받아 7석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체 득표수를 지역구 획득 의석수로 나눈 '지역구 1석당 득표수'는 약 7만표 정도로 나온다. 7만표 정도 얻었을 때 1석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통진당은 지역구 1석을 얻는 데 필요한 득표수가 18만4472표에 달했다.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곳의 투표결과를 자세히 보면 '평등선거'라는 제도가 무색할 정도다. 텃밭인 부산과 경남에서 새누리당은 51.2%를 득표했으며, 92.3%(36석)의 의석을 가져갔다. 이 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은 25%를 득표하고도 7.7%(3석)의 의석을 얻었다. 지역구 1석당 필요한 득표수는 새누리당이 4만9000표, 민주통합당은 35만7000표로 볼 수 있다. 결국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새누리당 지지표의 '7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있었다. 정당 비례대표 확대 요구가 그것이다.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뭐가 대안일까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됐다. 우선 현행 소선구제를 중선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다. 중선구제는 소선구제보다 권역을 넓히고 3~5등 정도까지 당선이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현재보다는 표의 비례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정당별로 한 선거구에 중복 공천이 가능하므로 당내 계파싸움이 더 혼탁해질 수 있다. 일본에서 운영했다가 1994년 폐지했으며, 현재 안철수 의원 측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더 권역을 넓히는 방안은 대선거구제다. 중선거구제와 비슷하나 사실상 지역별 대표성이 사라지고, 비례대표 선출에 가깝게 된다. 스웨덴이 비례대표와 대선구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도입을 요구하는 제도다. 선진 정치제도를 소개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독일이 운영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수에서 의석을 배분받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으면 초과한 의석을 인정해주고,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보다 더 적으면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무조건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설계된 제도인 셈이다. 이 제도를 운용하면 선거마다 10석 미만으로 총 의석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연세대 유성진 자유전공학부(정치학박사) 교수는 "인구수 변동이 생긴 만큼 지역구 조정이 되지 않아 표의 가치가 다르게 행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헌재에서 2대1로 맞추라는 판결을 내려서 표의 등가성을 강제로 맞추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보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한 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바꾸는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한걸음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