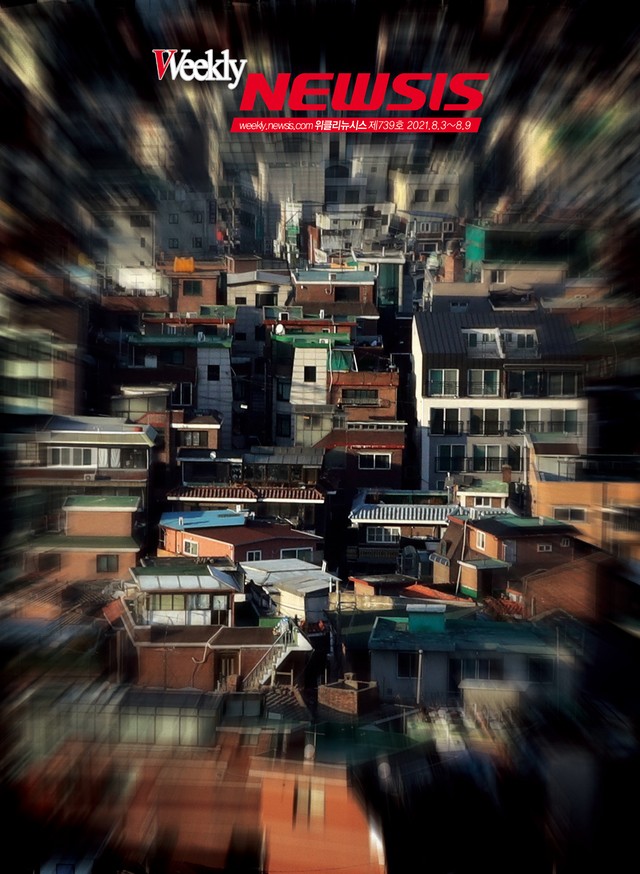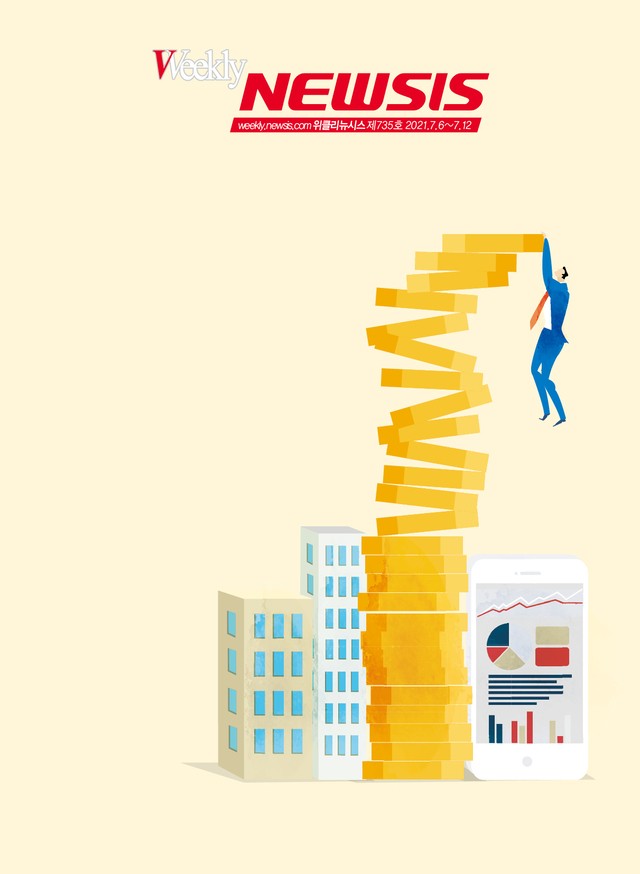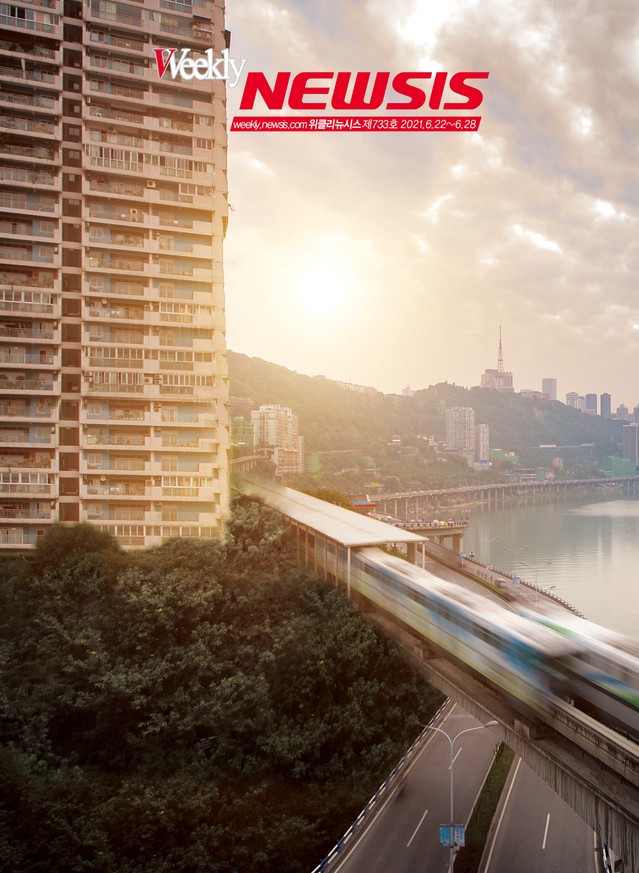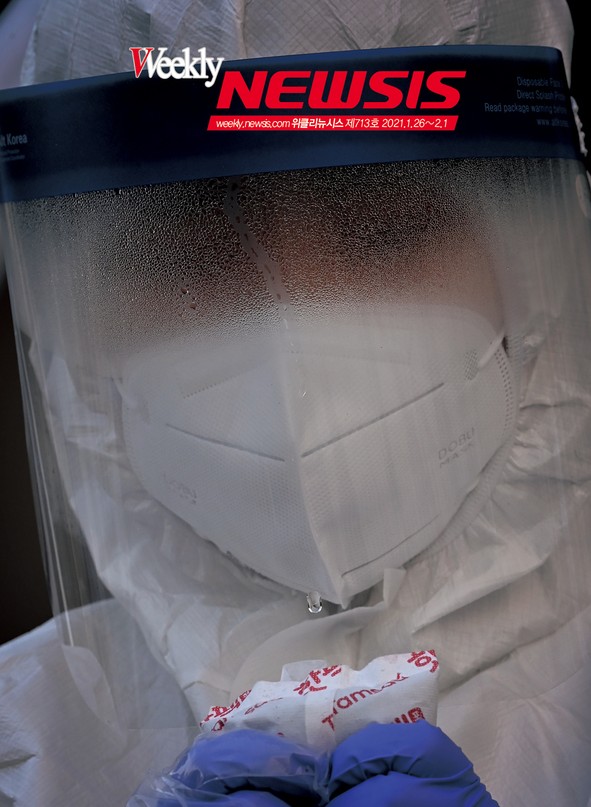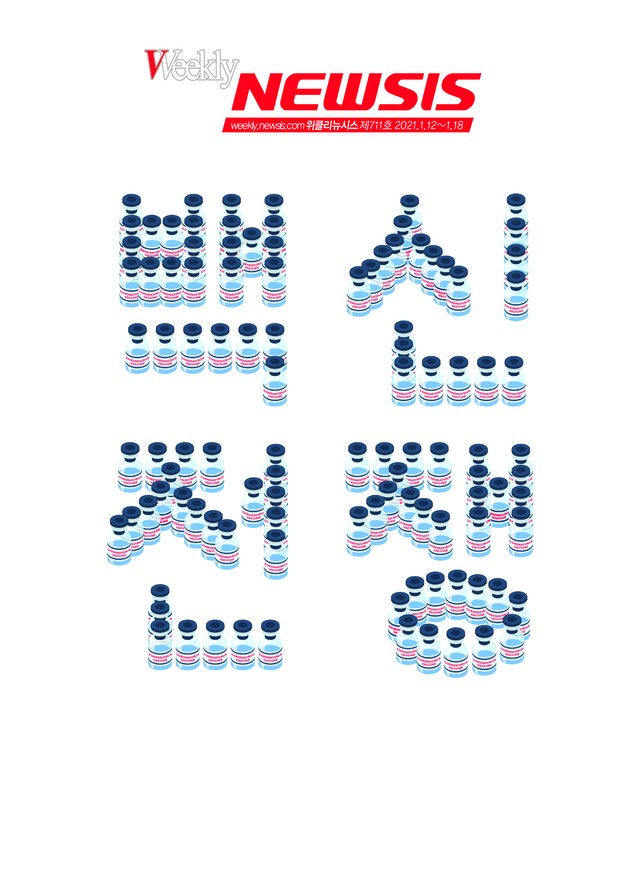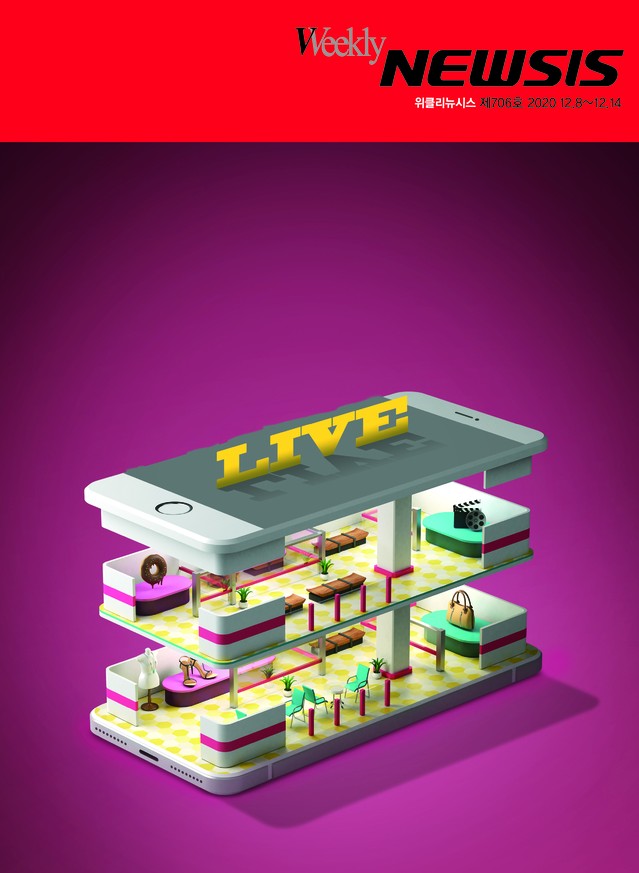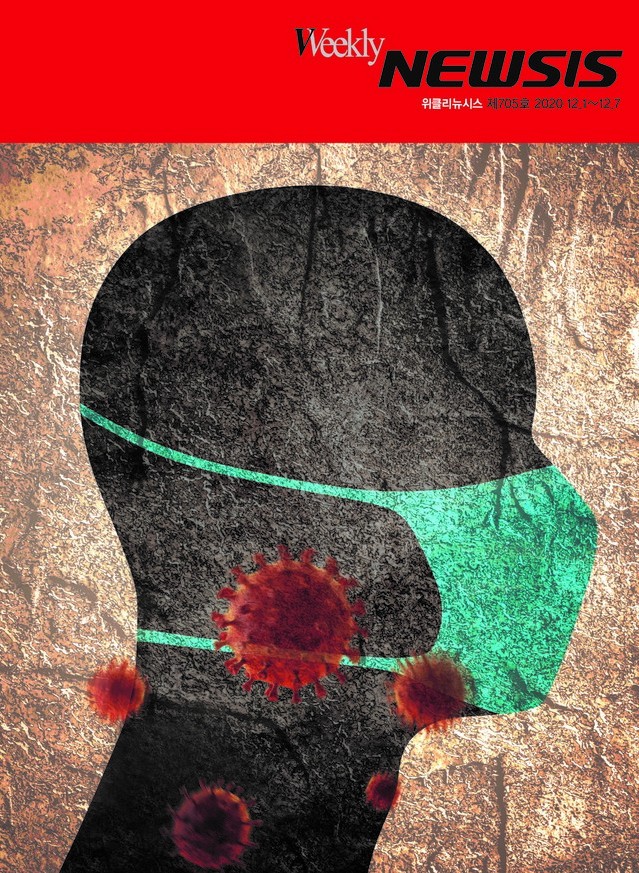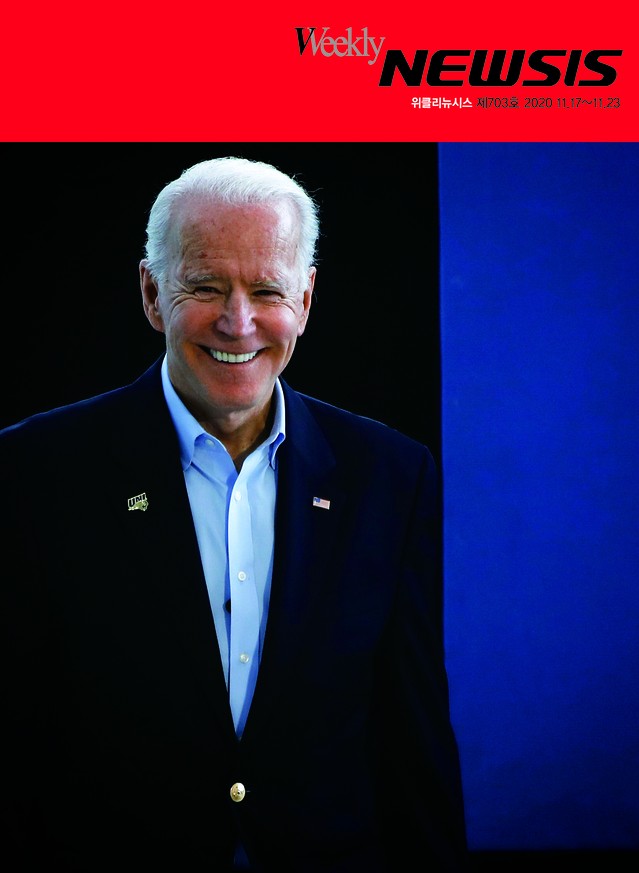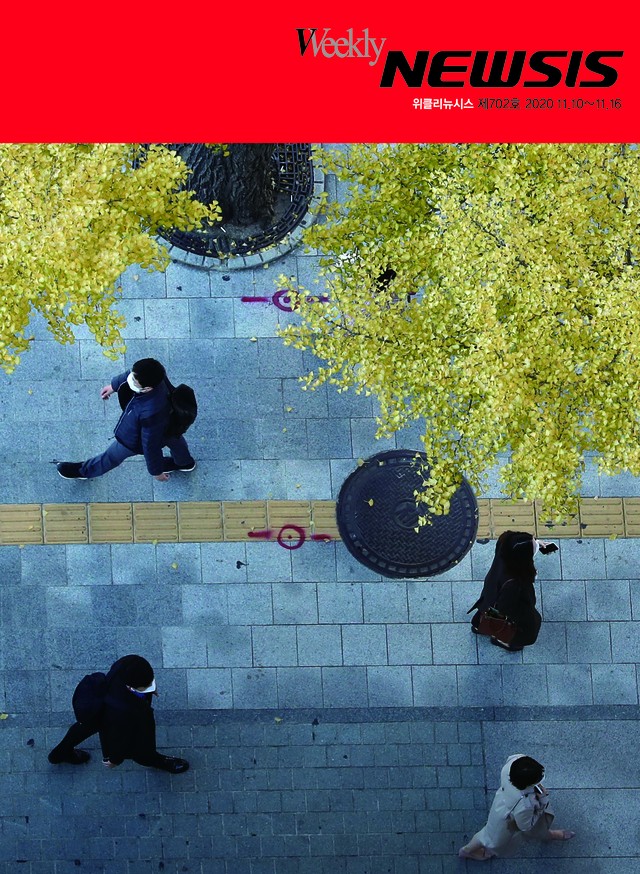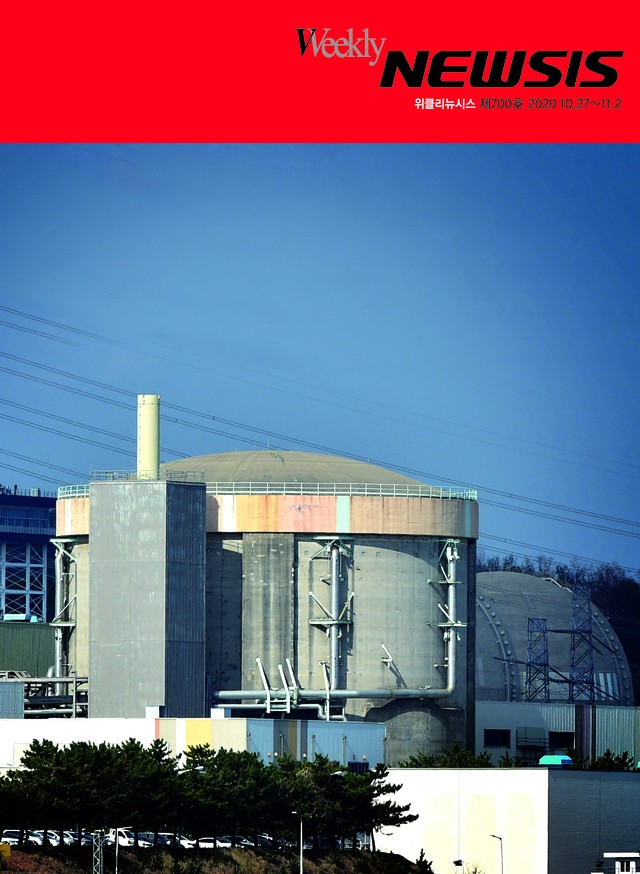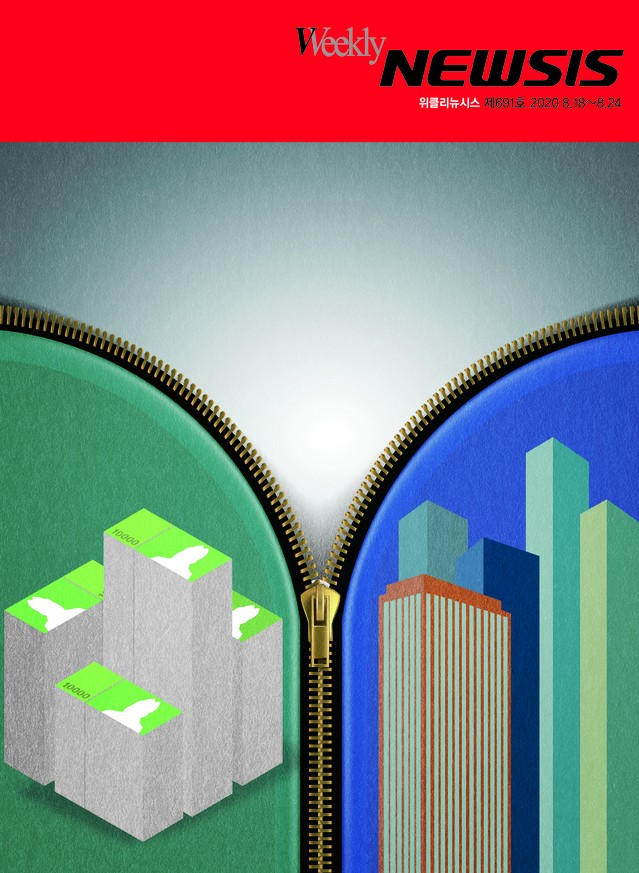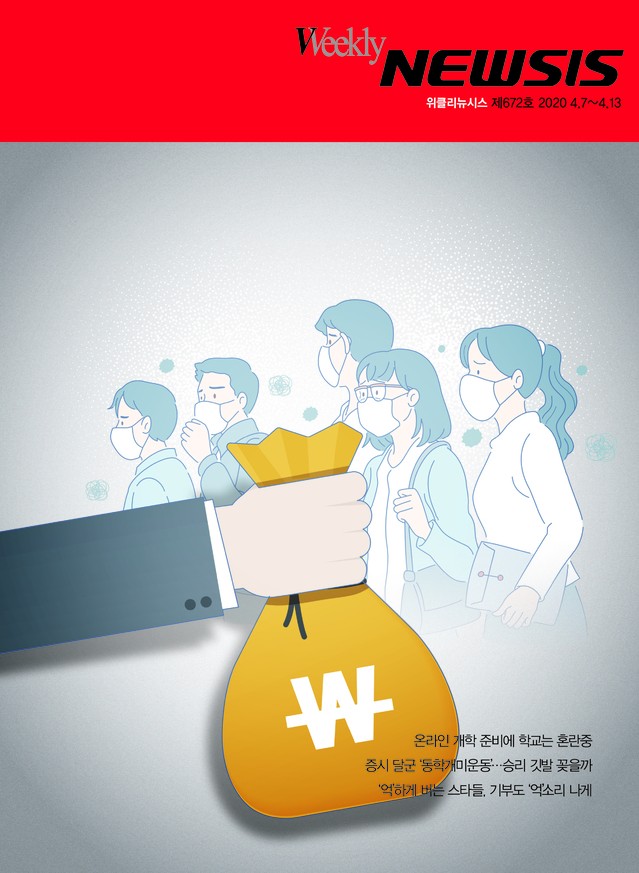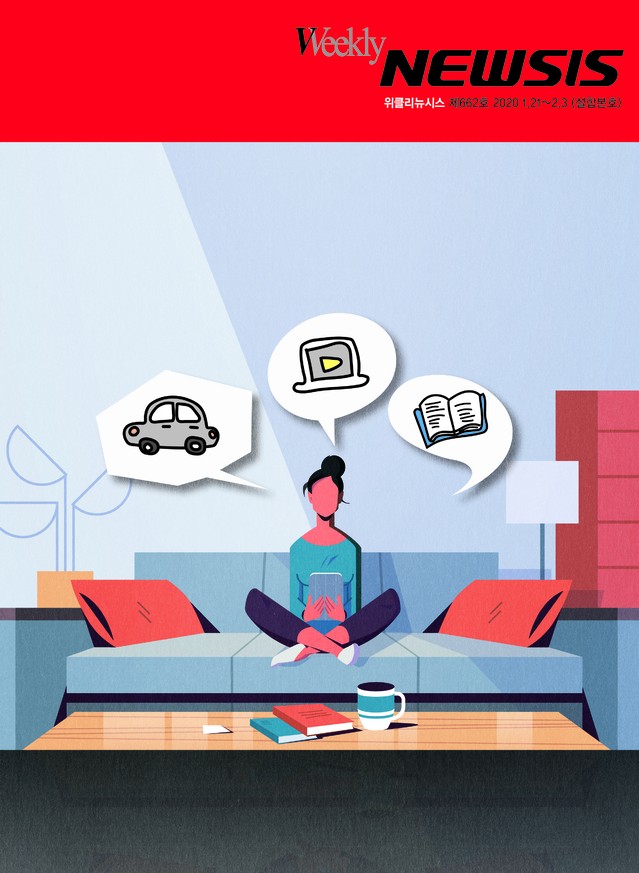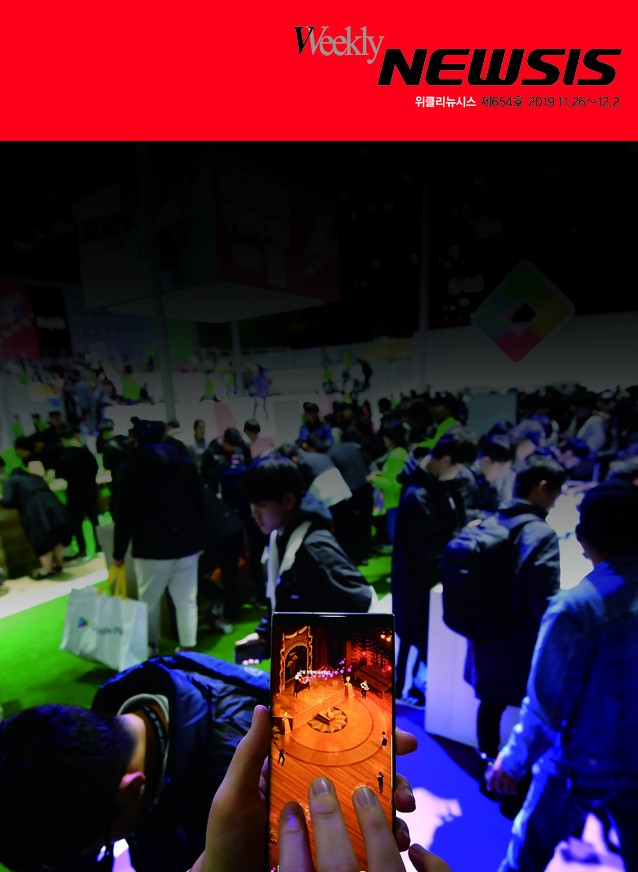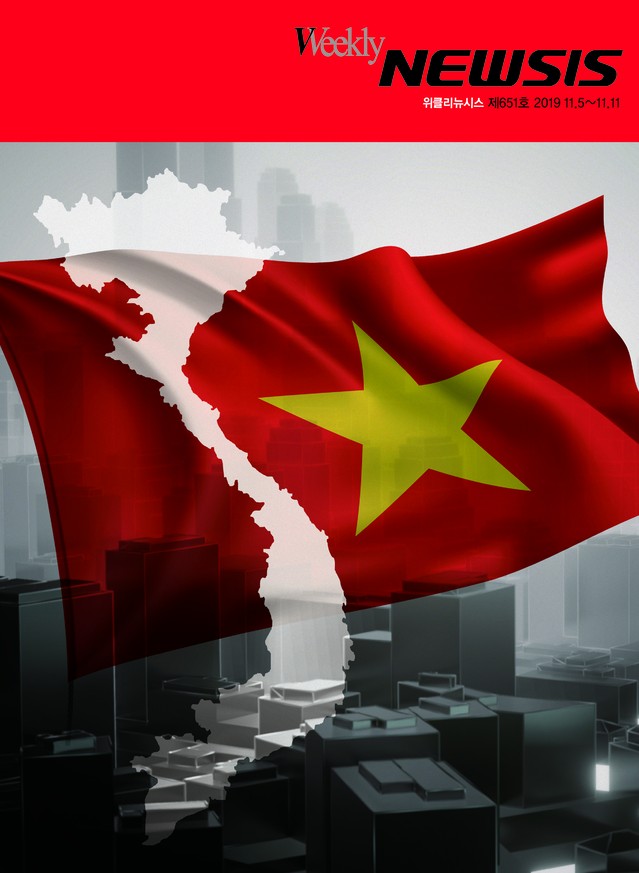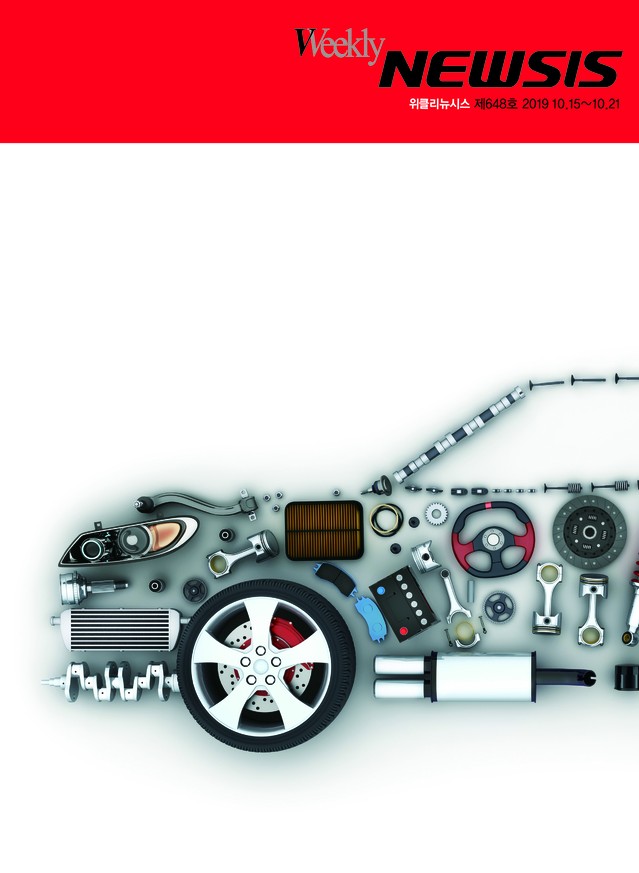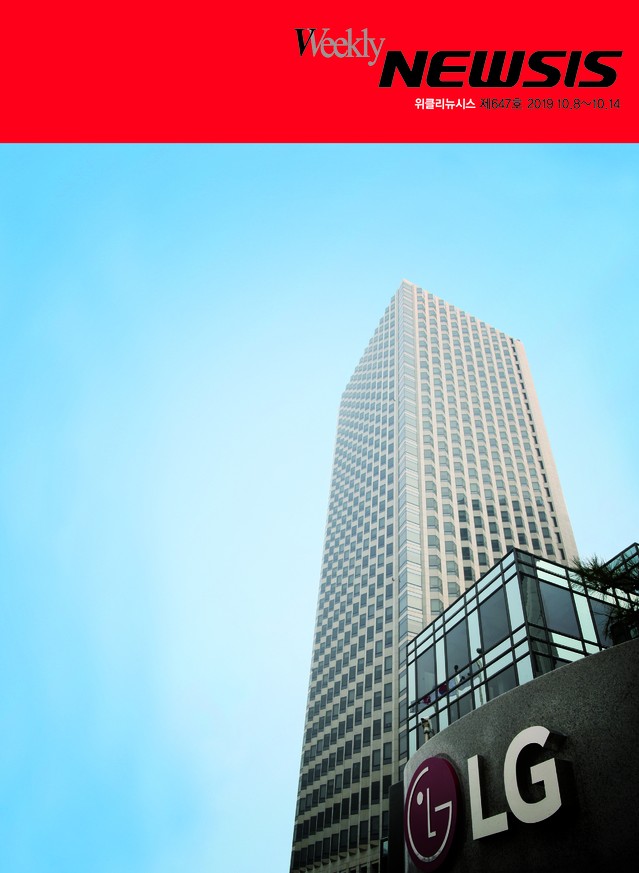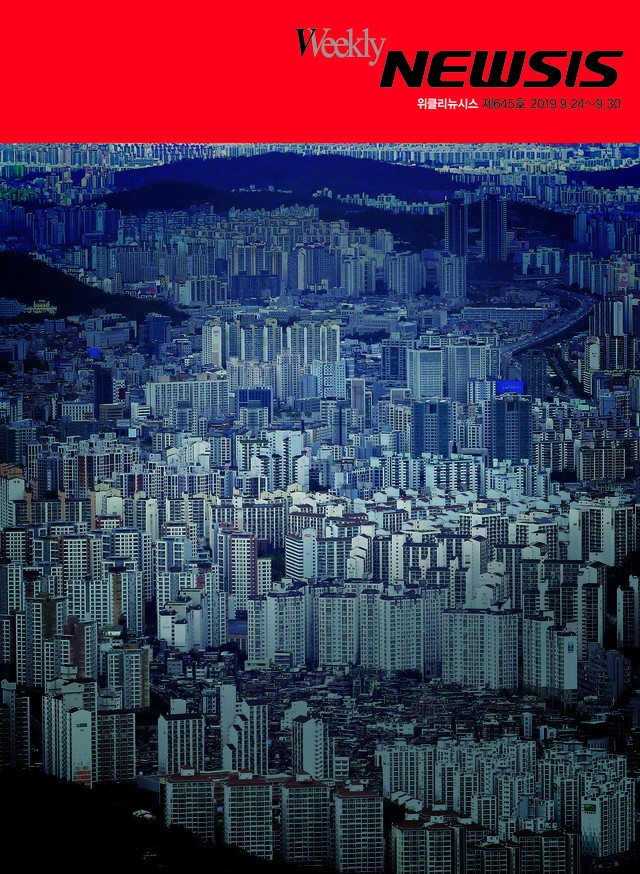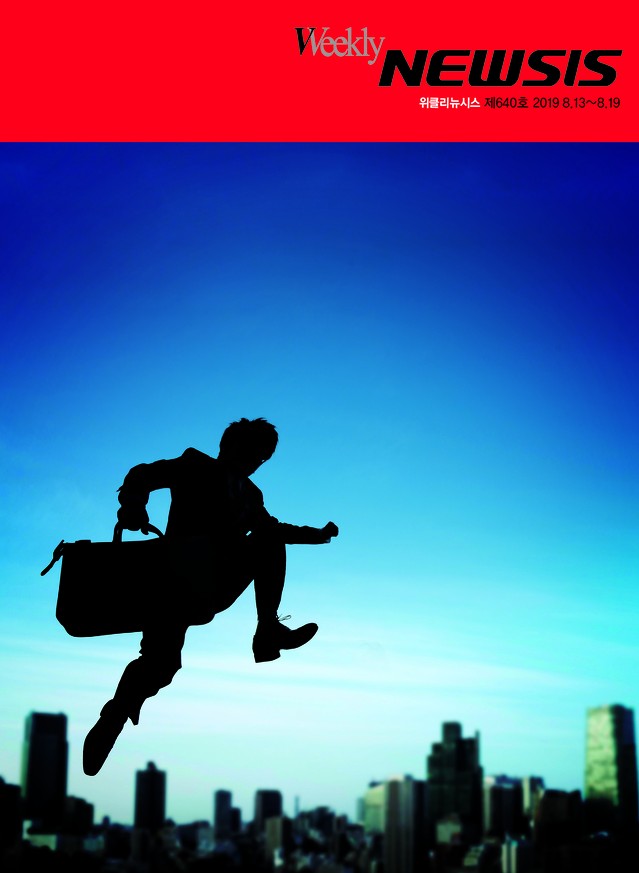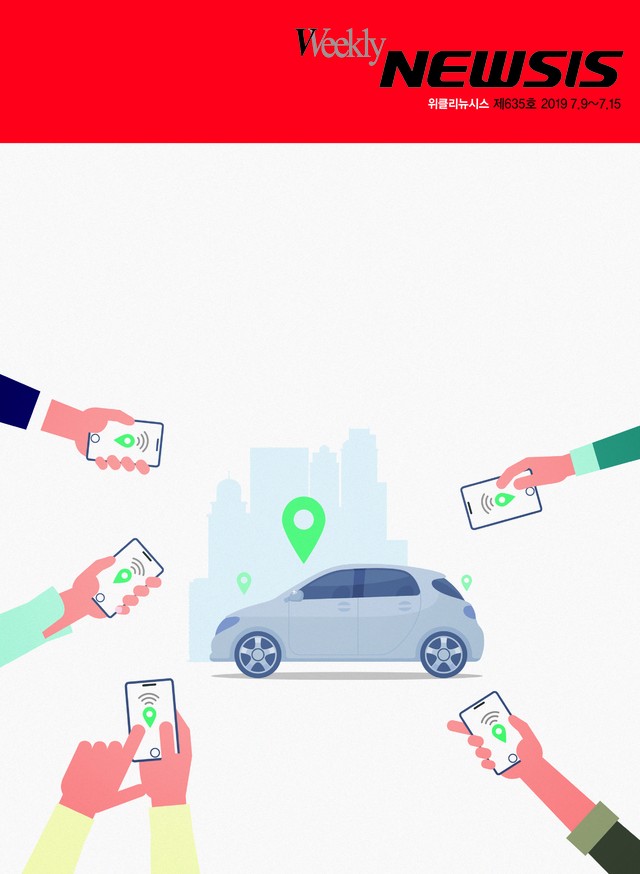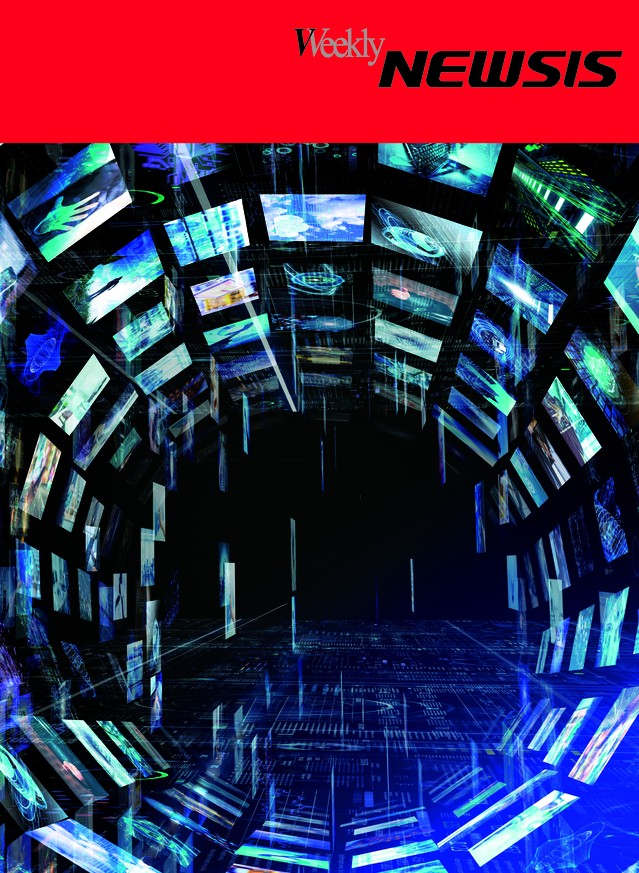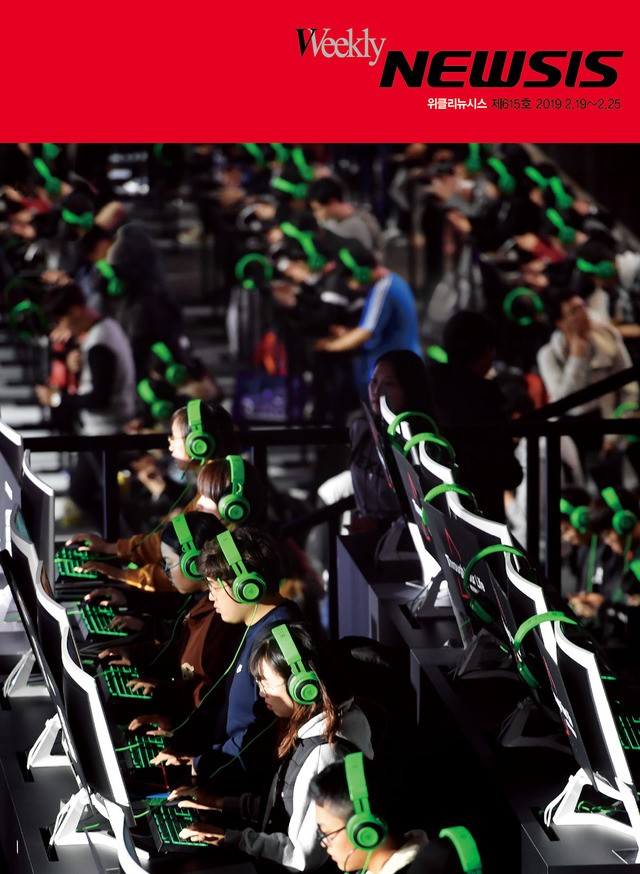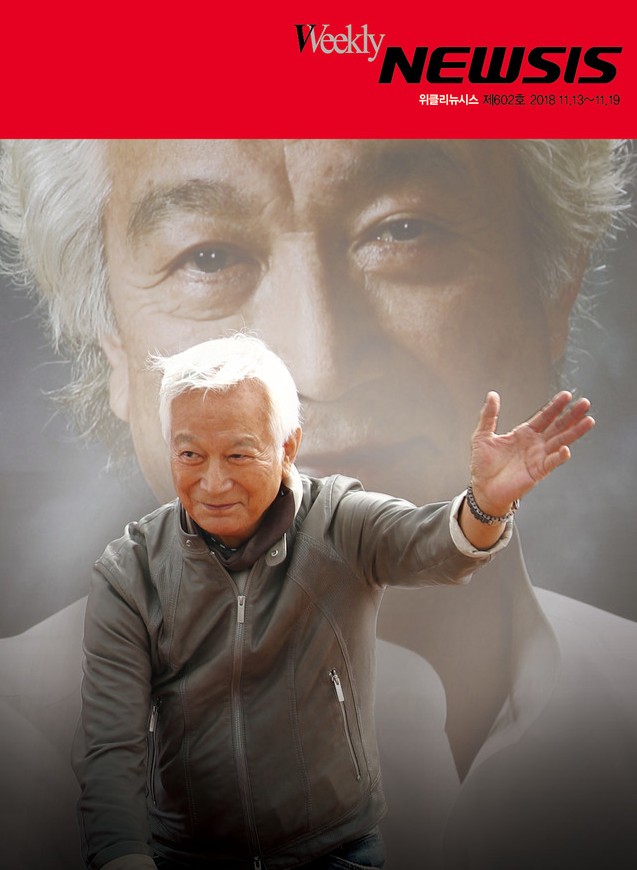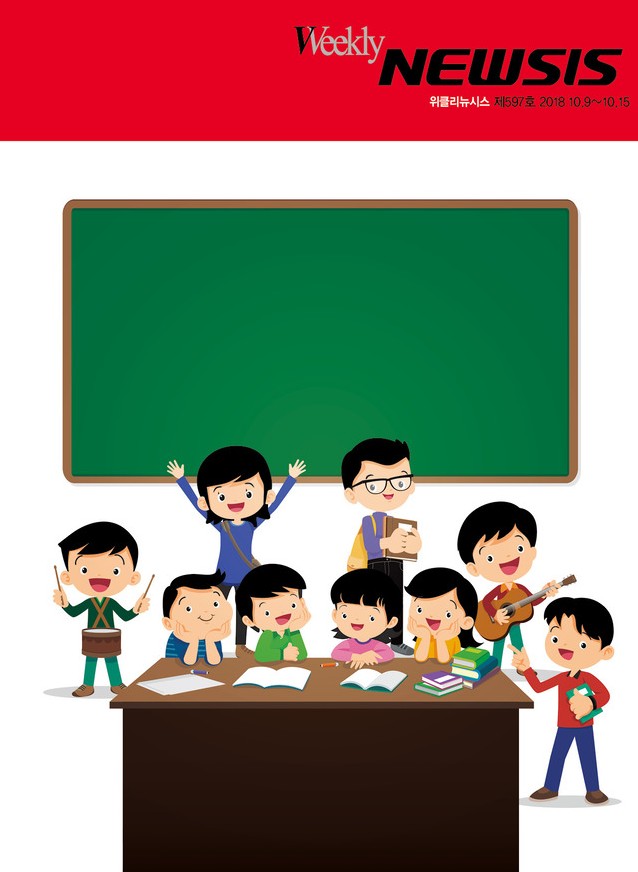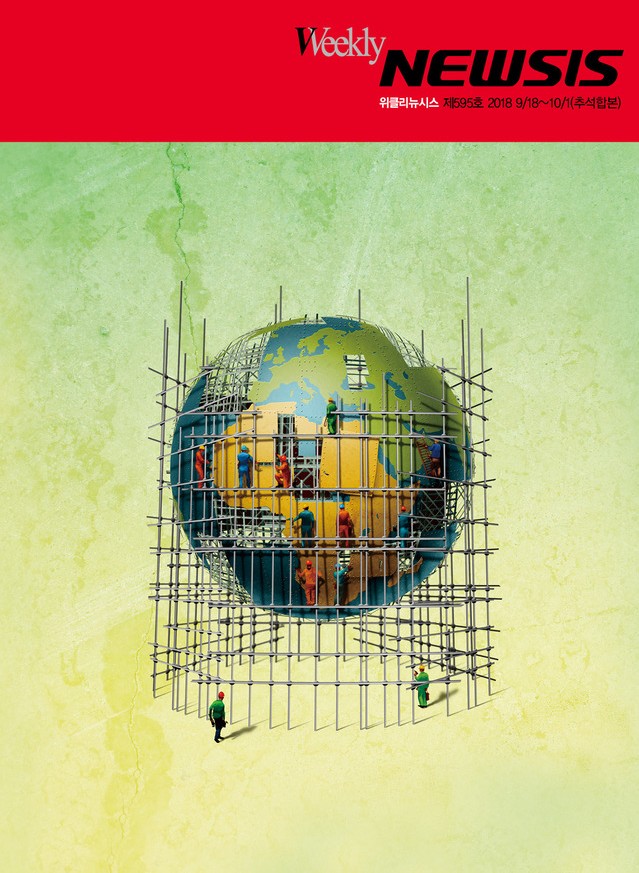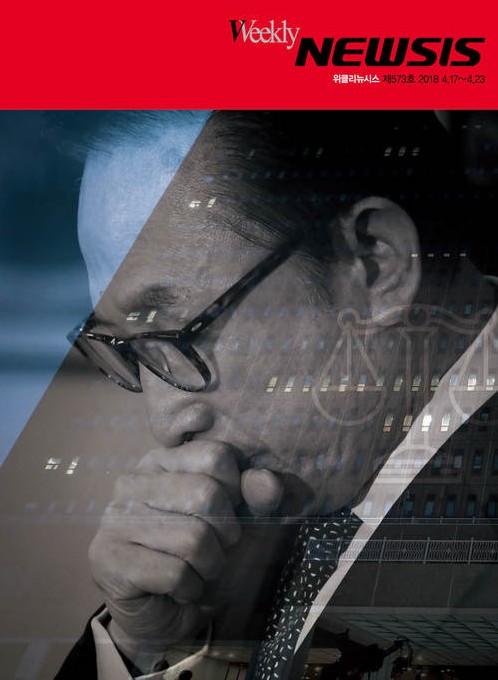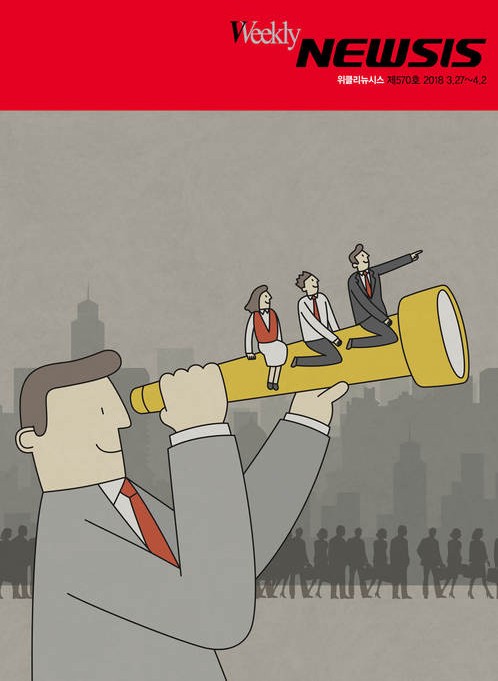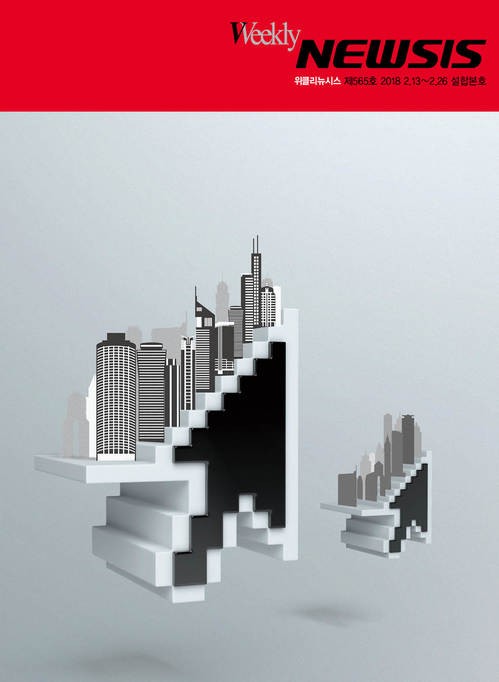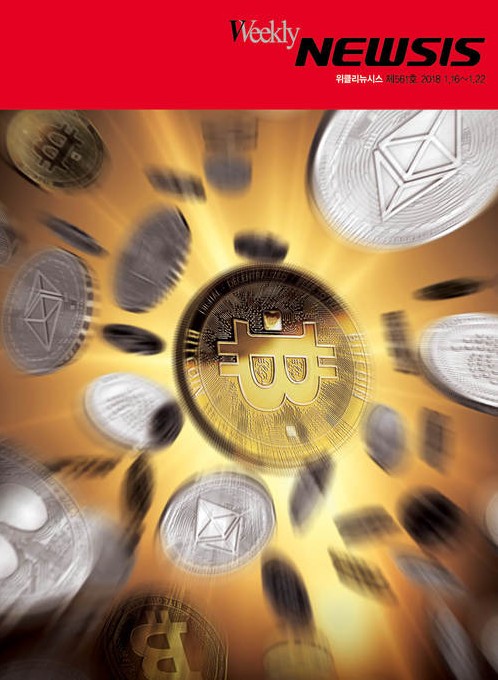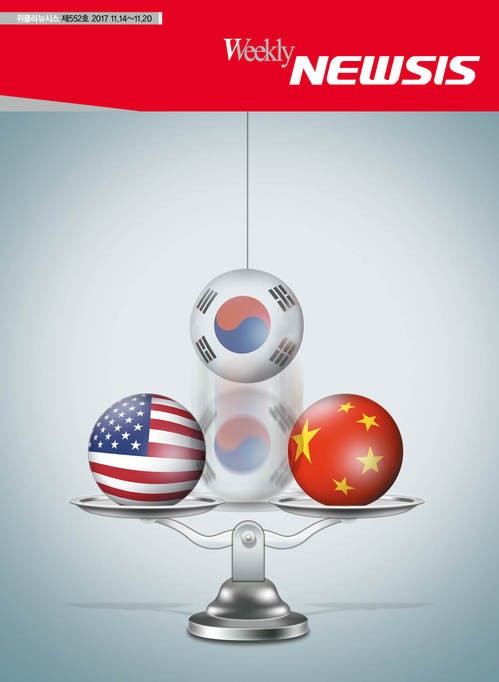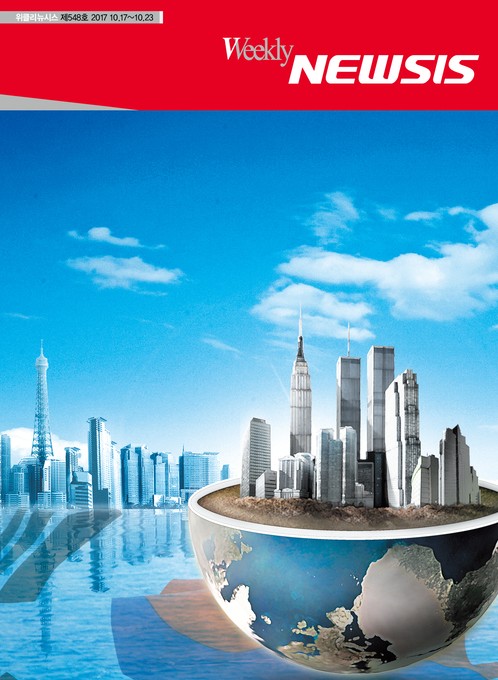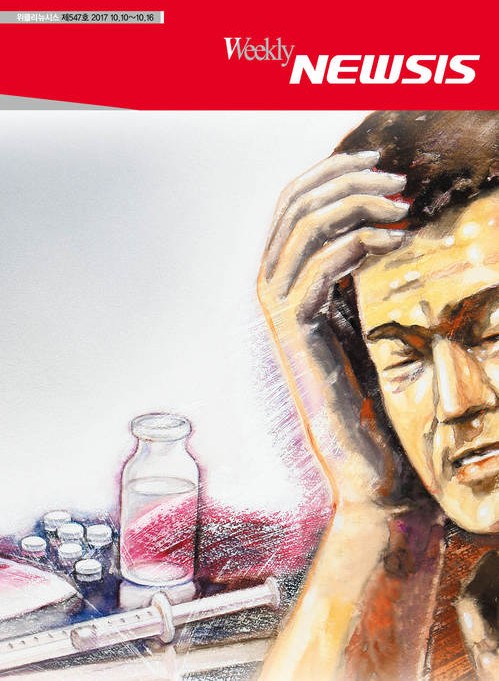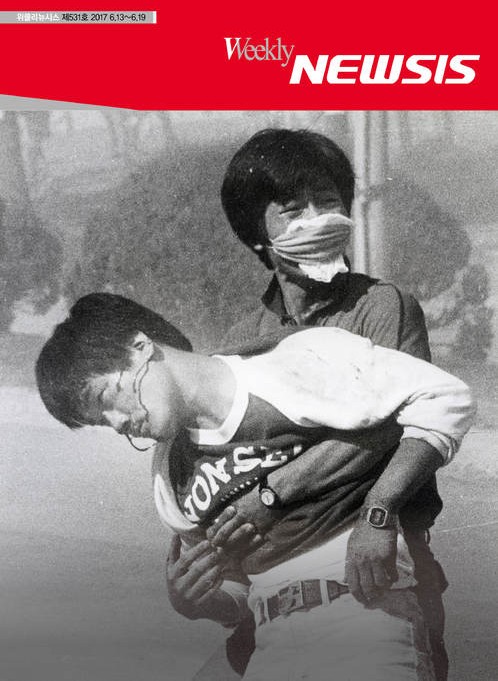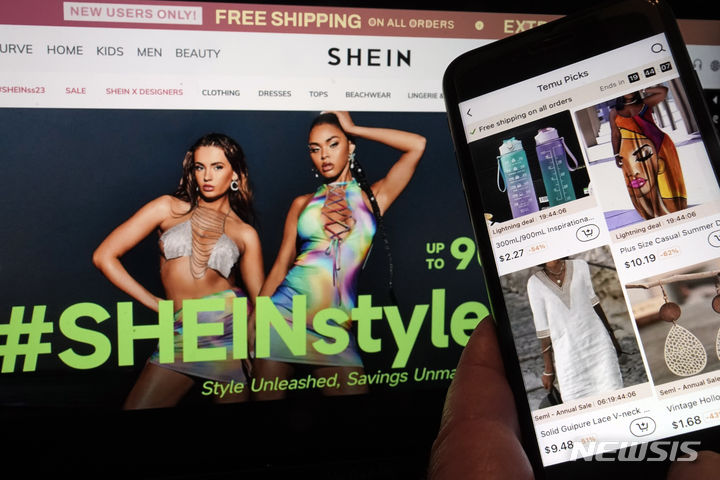[기자수첩]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판결은 의심받고 법관은 비판받는 일들이 빈번하다. 당시 행정처가 했던 모든 일이 부정되는 모양새다. 지금의 법원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황은 법원이 자초한 면이 크다. 그간 법원은 검찰의 죄가 의심된다는 주장 대부분에 "그럴 리 없다"고 반응했다. 검찰이 관련 문건 등을 제시해도 법원은 법관의 양심을 더 기대하고 신뢰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열에 아홉이 기각됐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 역시 잊힌 지 오래다. 법원 판단에 따라 보낸 임의 제출 공문은 좀처럼 답이 없다고 한다. 급급한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단으로 반출한 대법원 재판 기록을 모두 파기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검찰이 압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던 문건, 대법원 역시 반출이 부적절하다며 회수를 검토했던 방대한 자료다. 검찰이 예상했던 결과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에 고발 요청도 했다.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 고발 요청을 과하다고 판단했던 대법원은 증거 인멸을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다. "전직 수석재판연구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힘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법원이 우려를 키웠고, 이를 현실화한 판국에 누구를 탓하기도 어려운 눈치다. 독기를 품은 검찰은 고강도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일부 고위 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내부 결속을 주문했다는 말이 들린다. 바닥을 치는 사법부 신뢰도에도 제 갈 길만을 가겠다는 분위기로 읽힌다. 수사 본격화 후 마냥 이어지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이에 대한 동조의 뜻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법부의 '그들만의 리그'는 박수의 대상이 아니라 규탄의 대상이다. 휘청거리는 법원이 시선을 내부가 아닌 밖으로 돌릴 때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