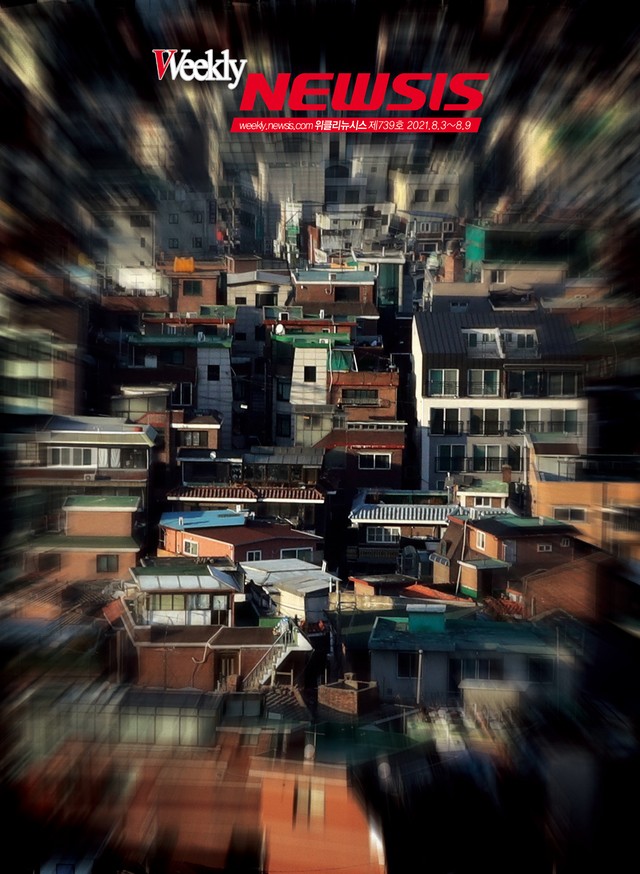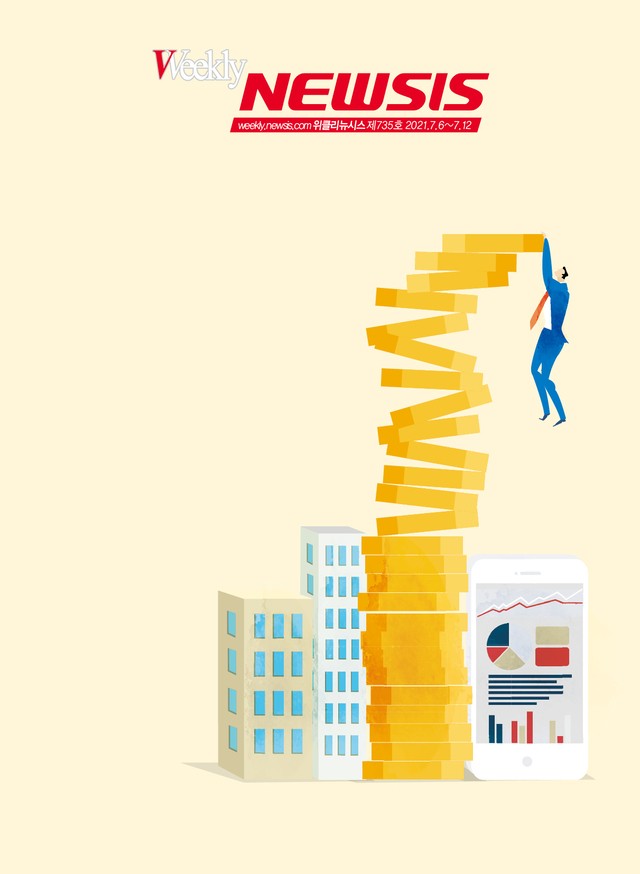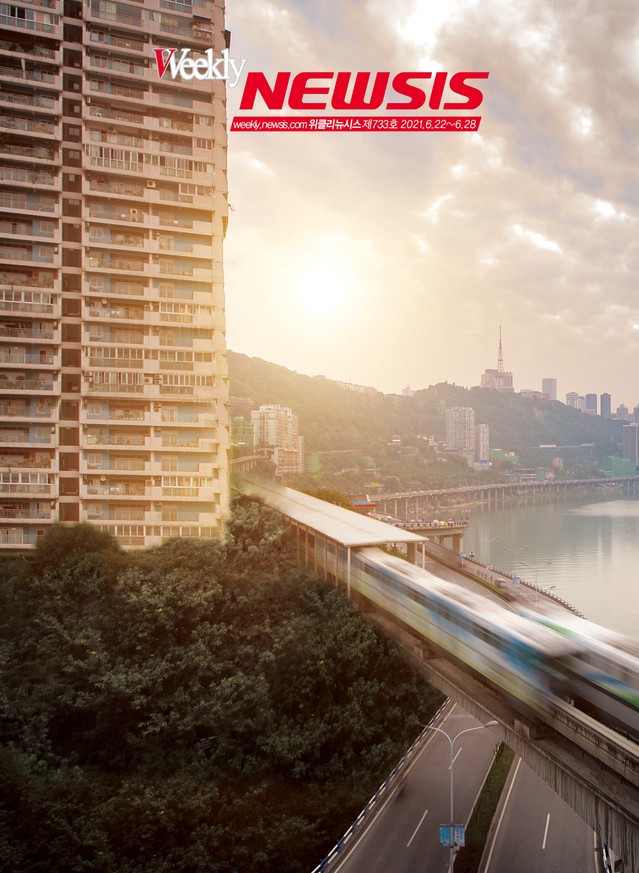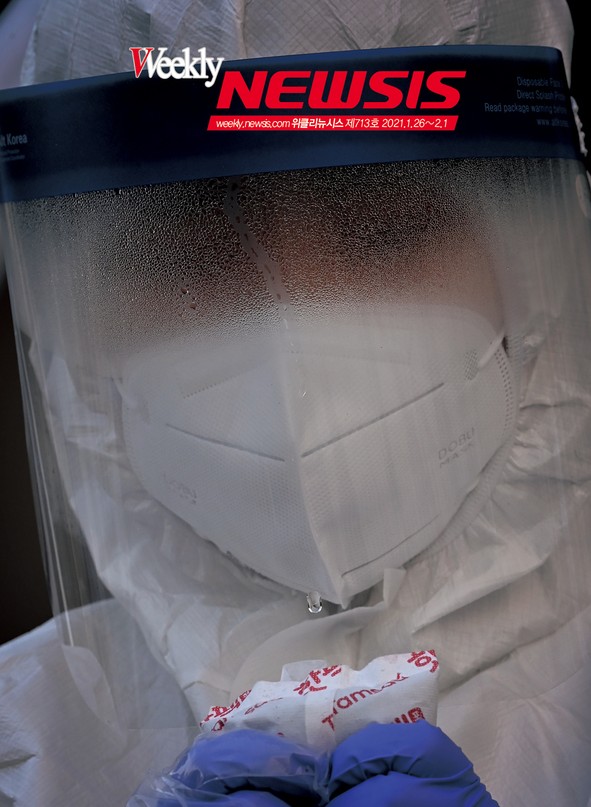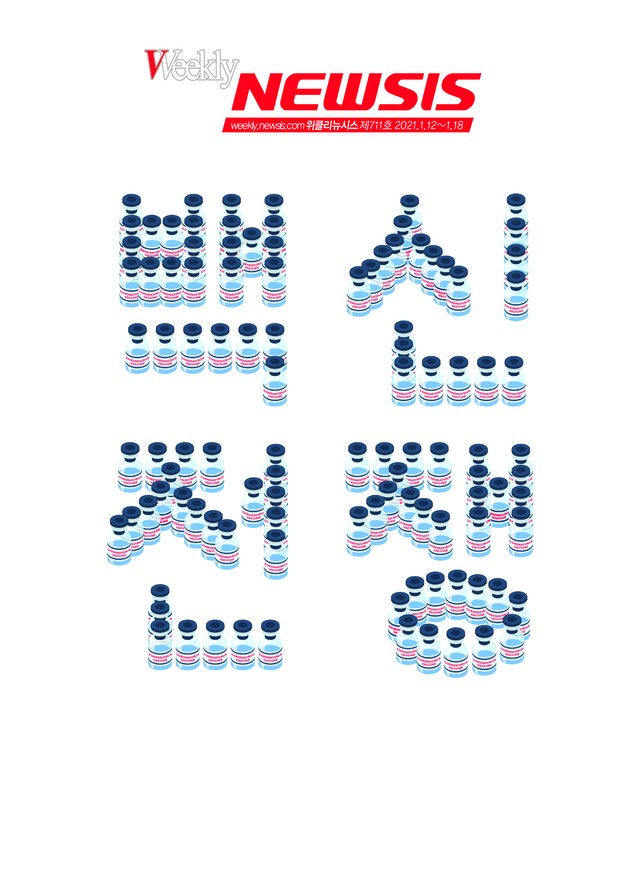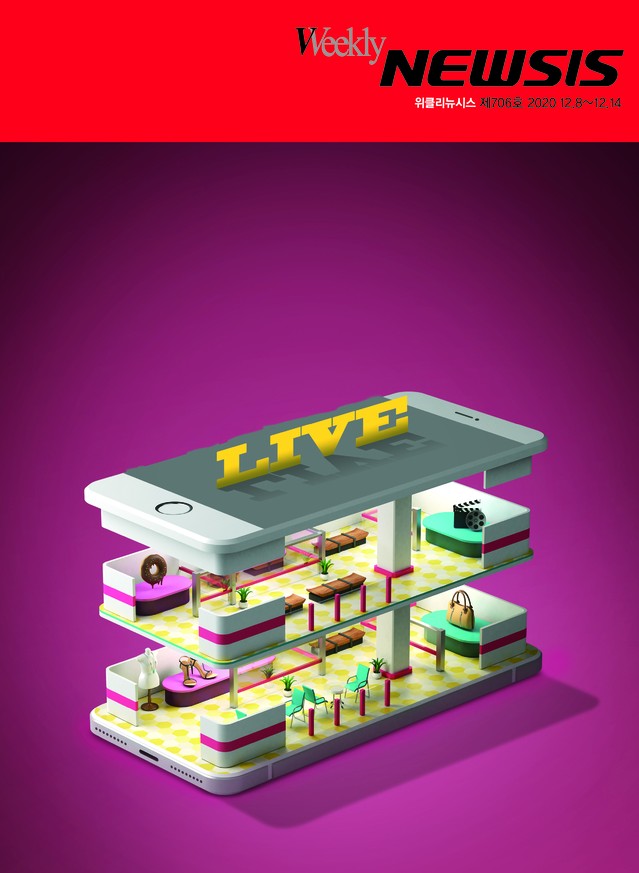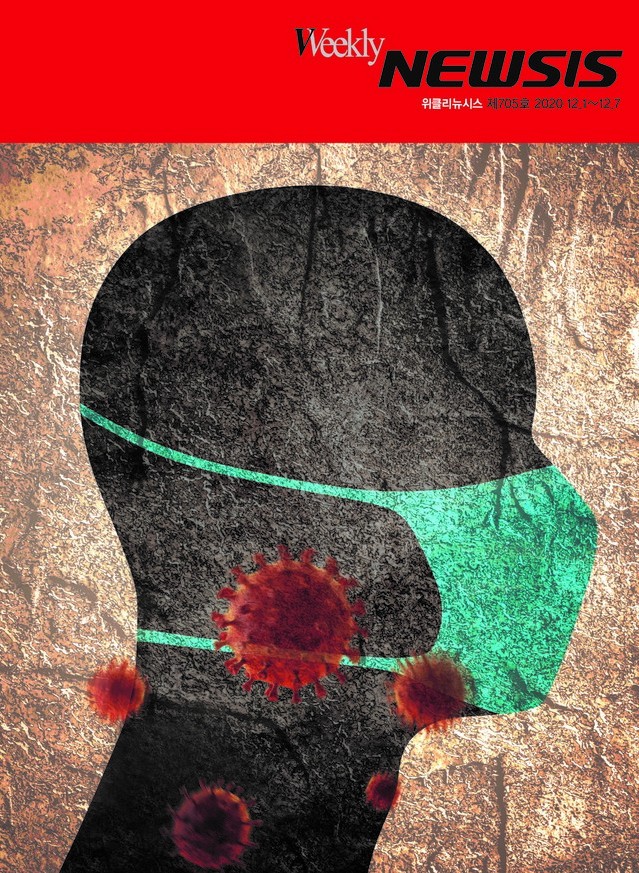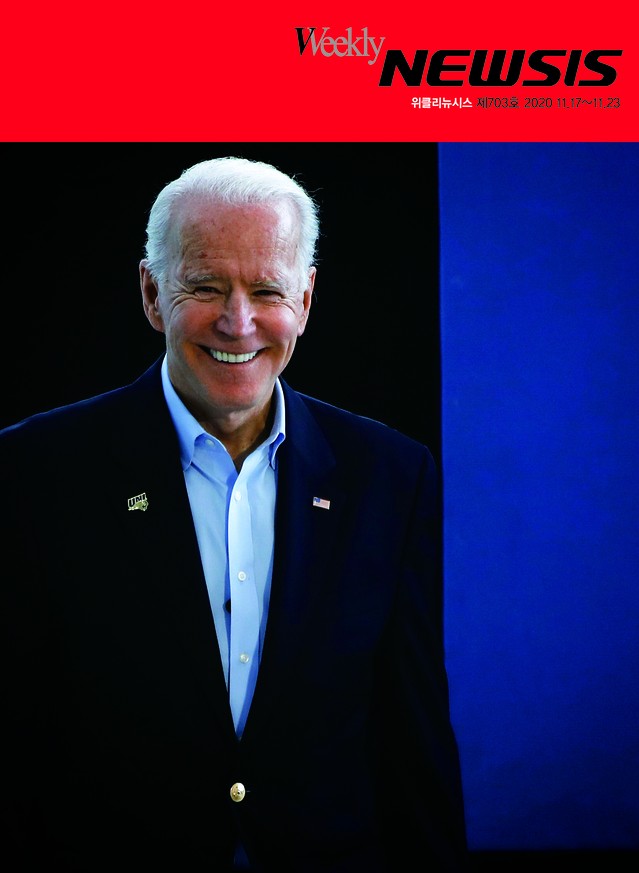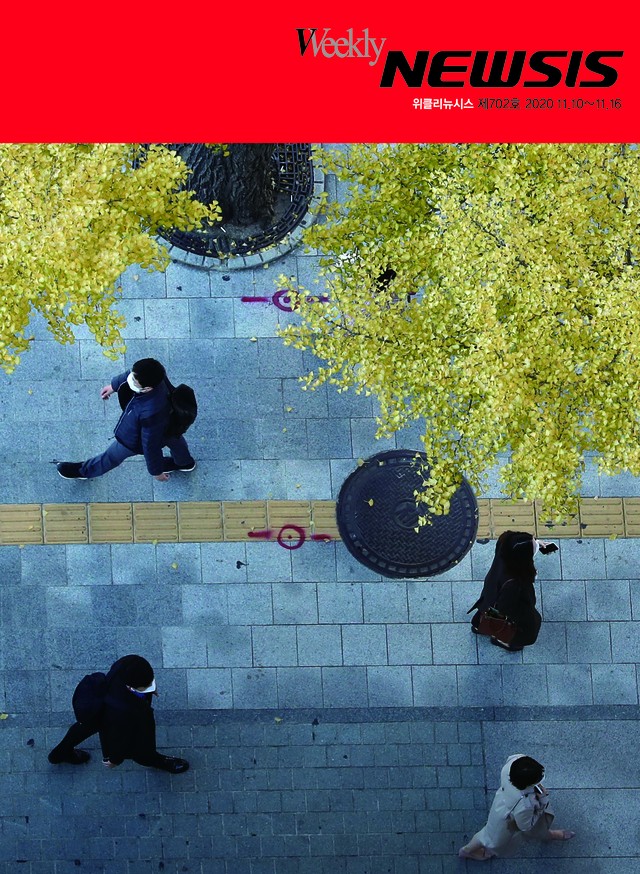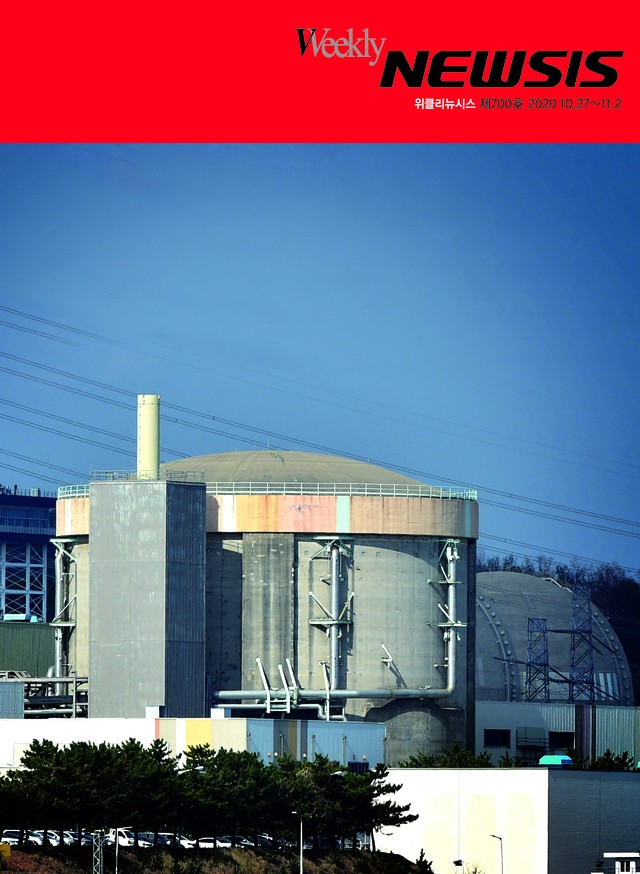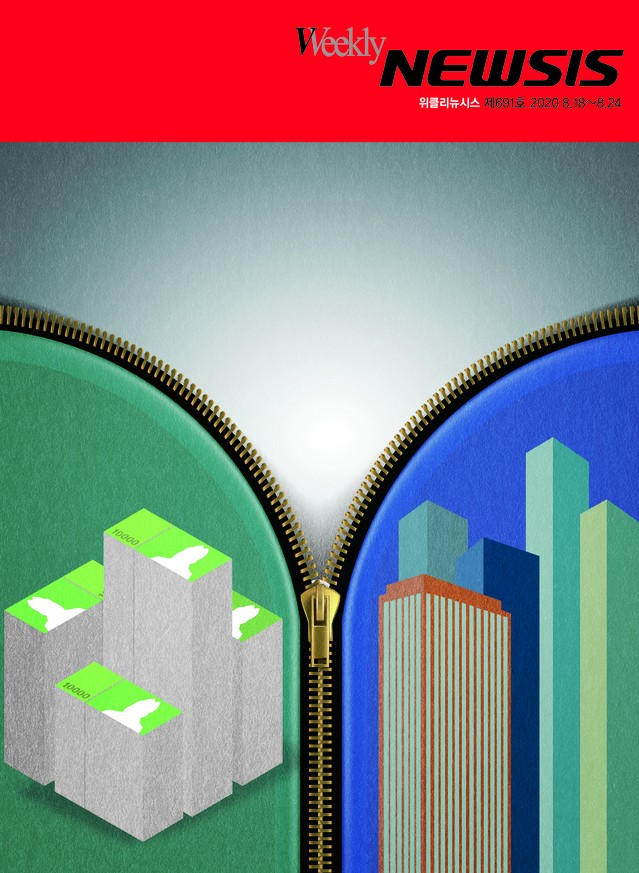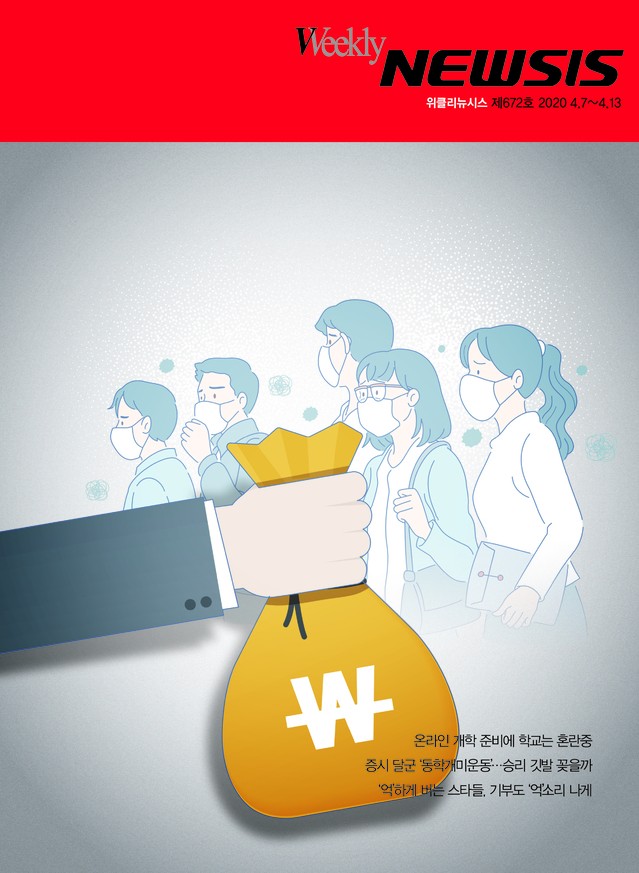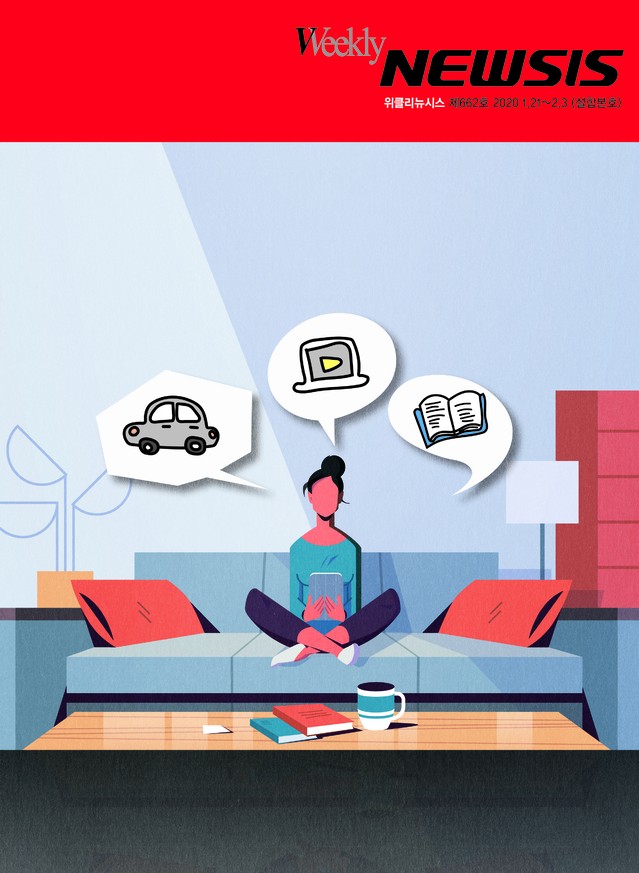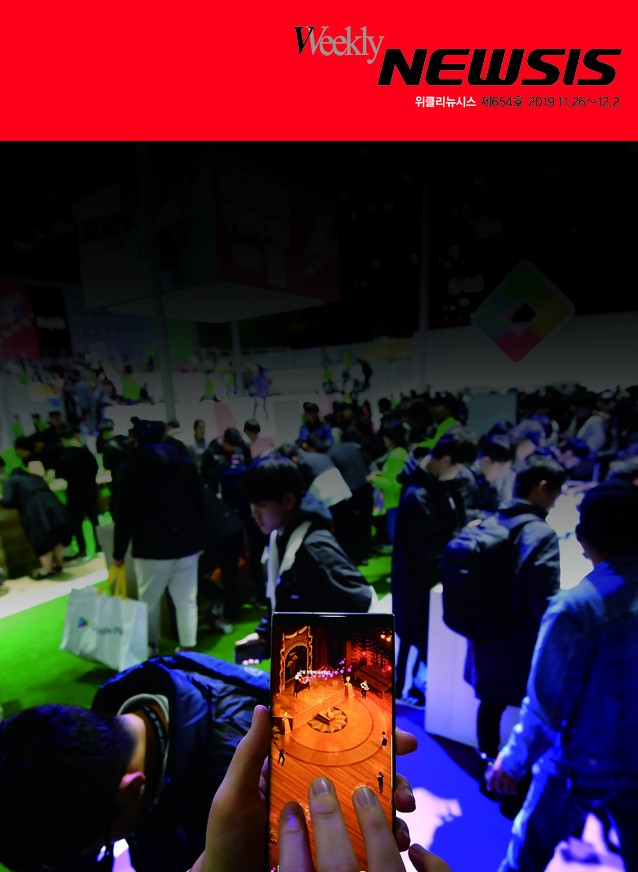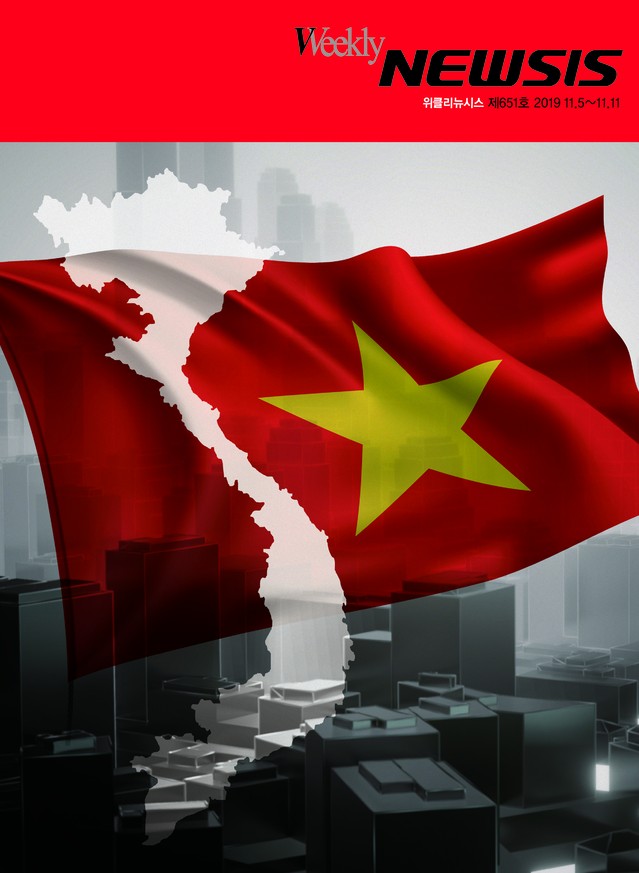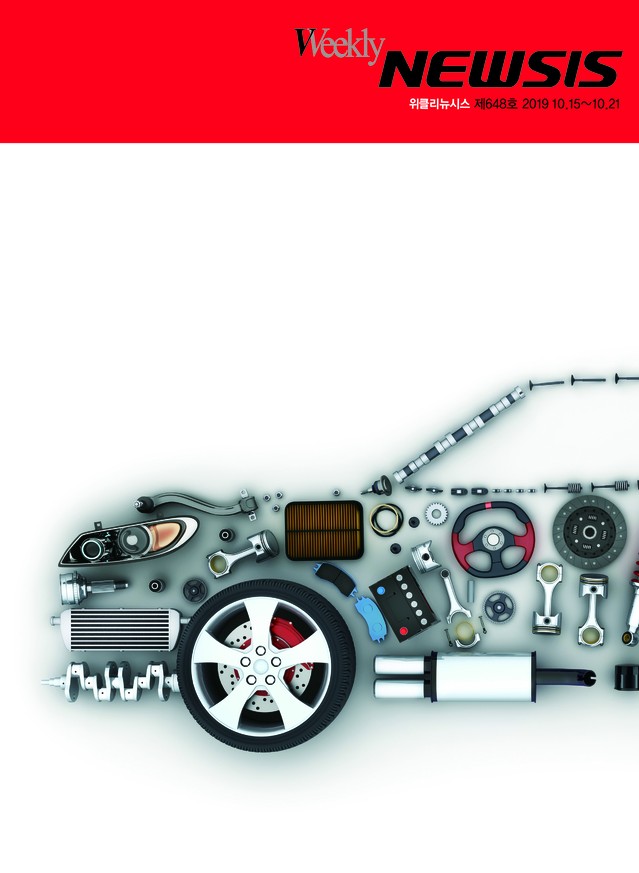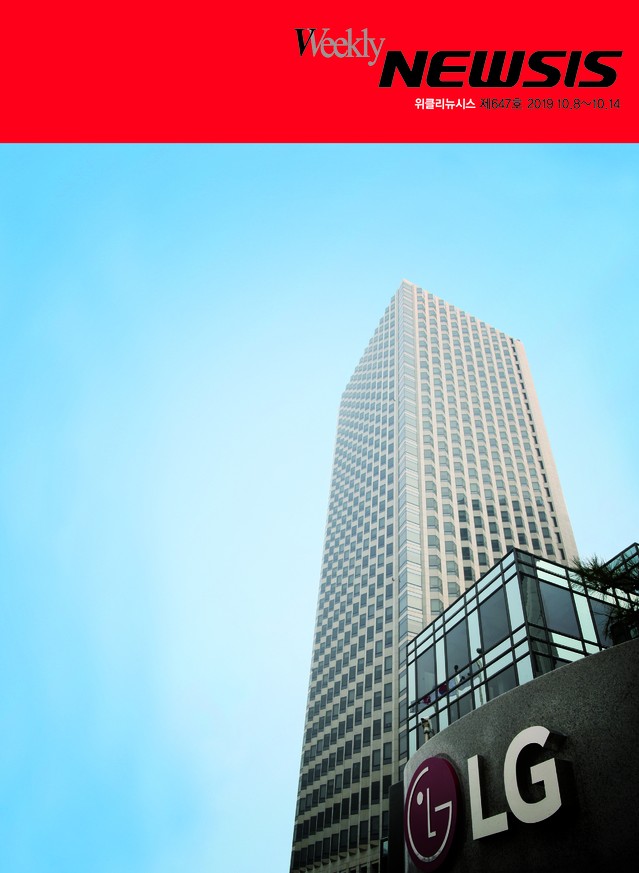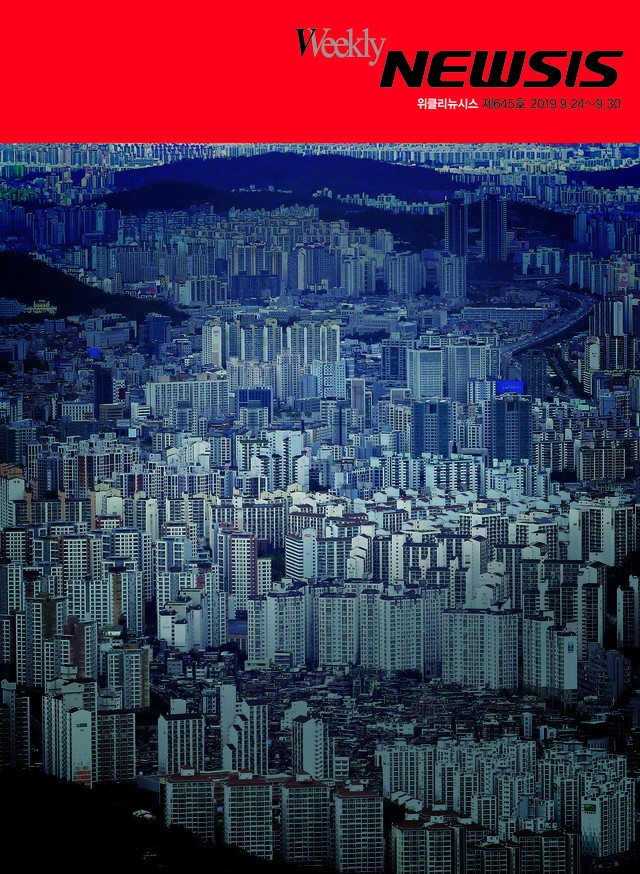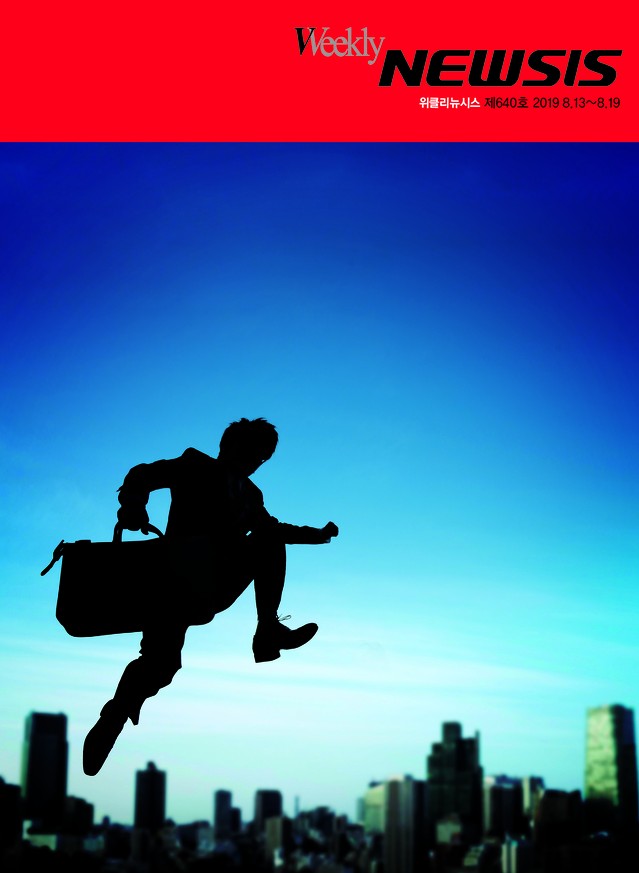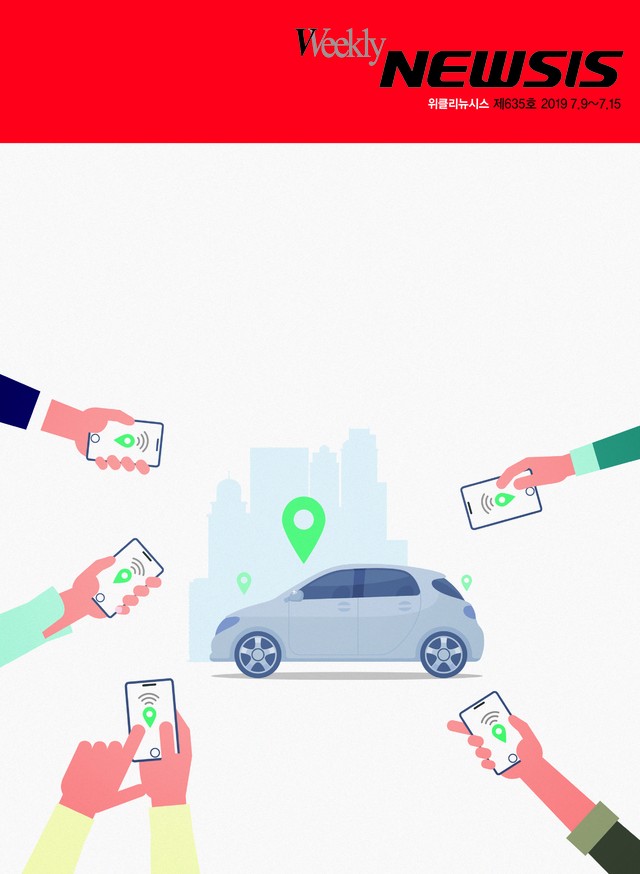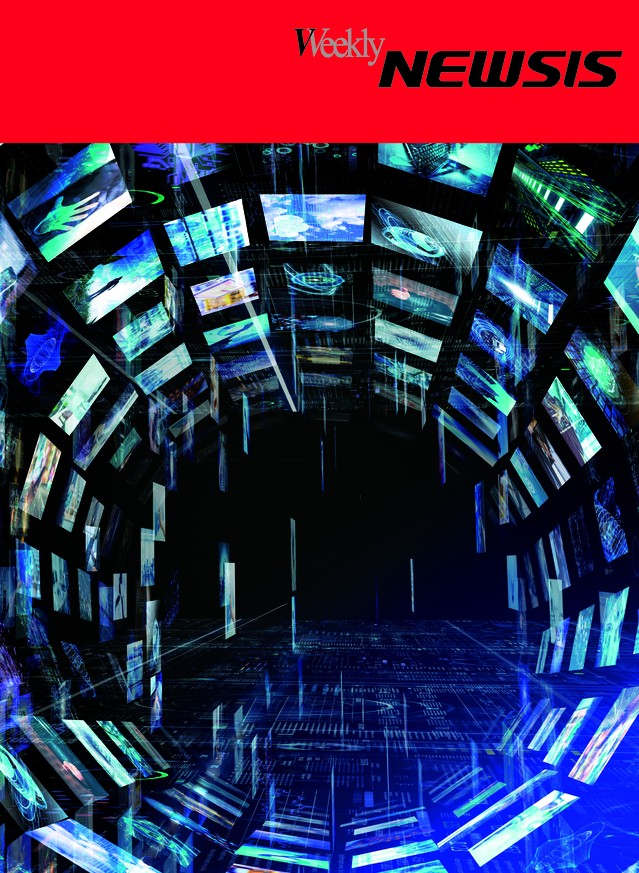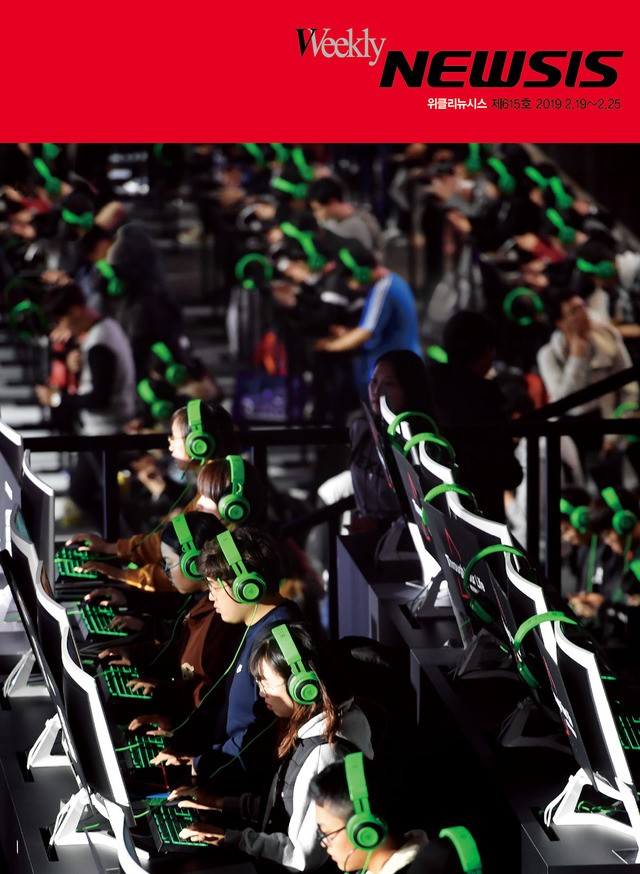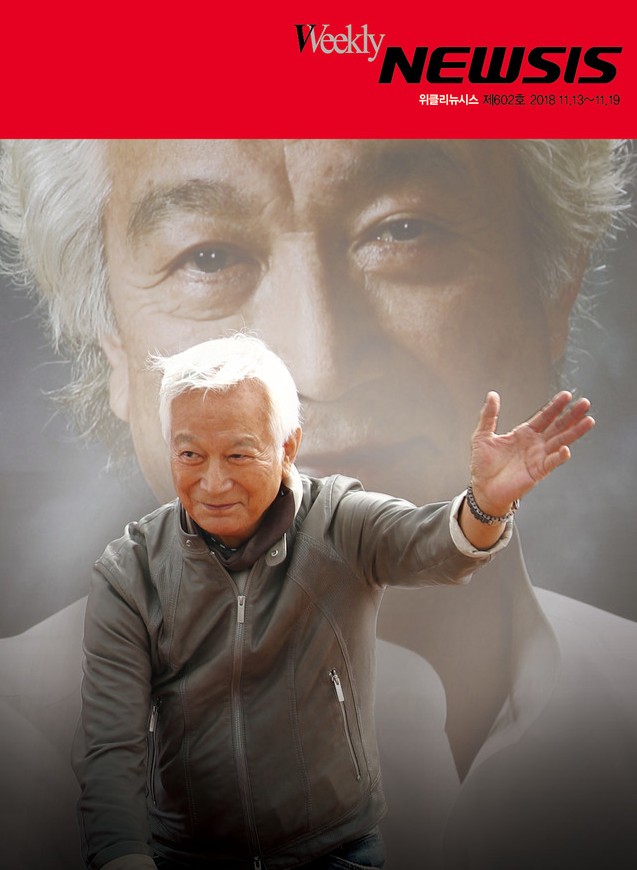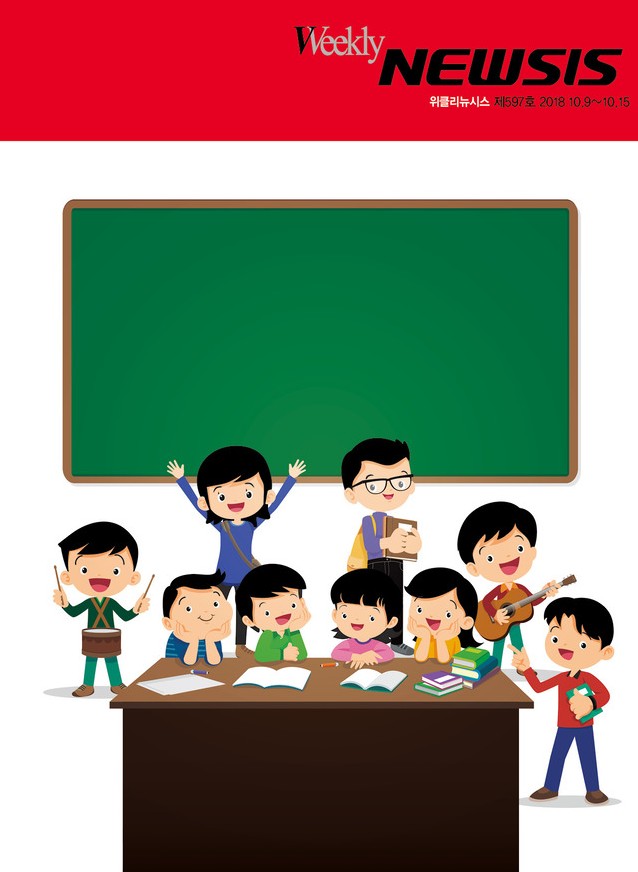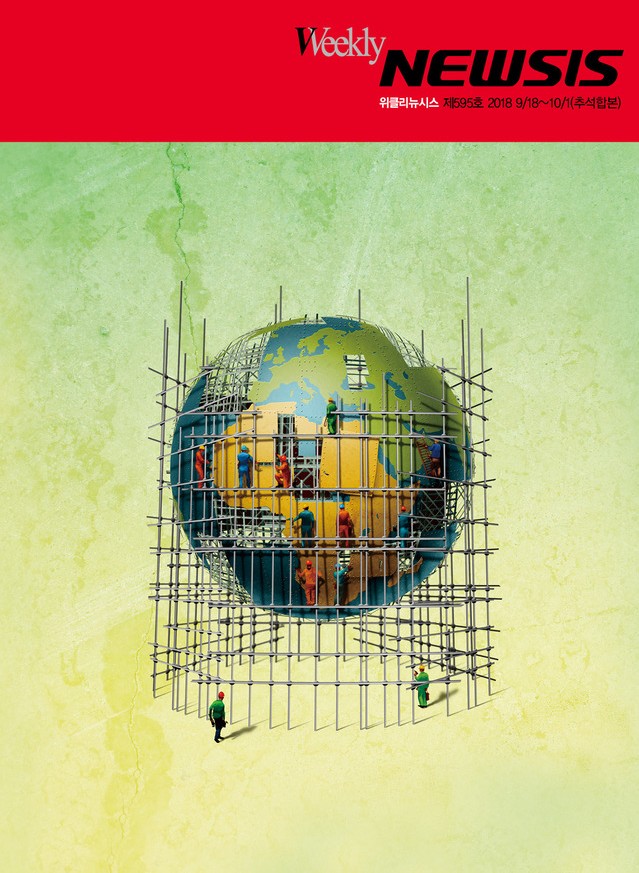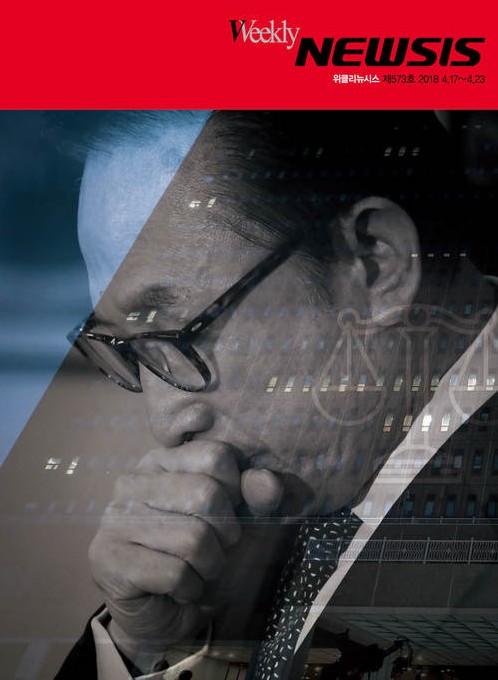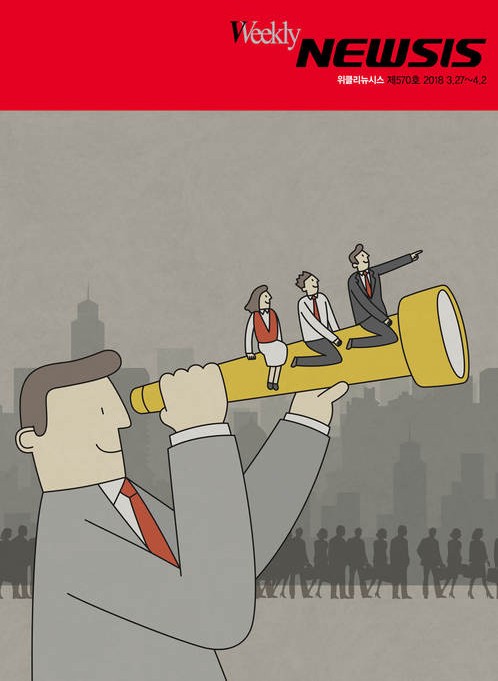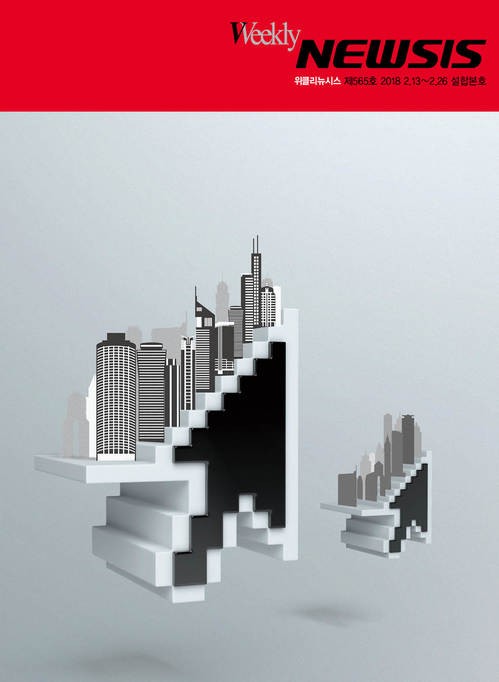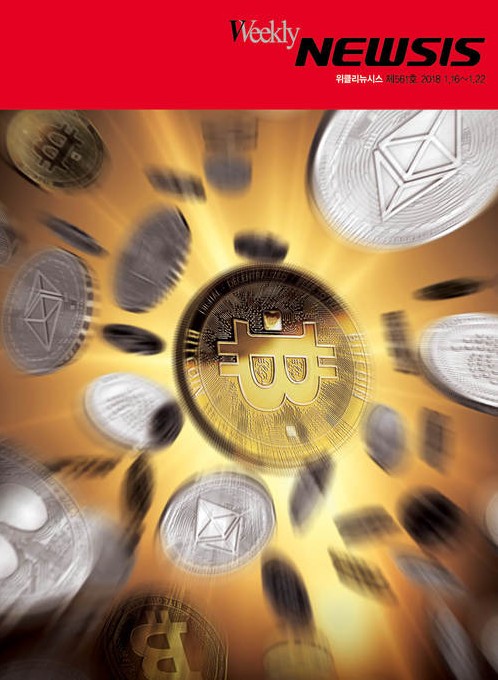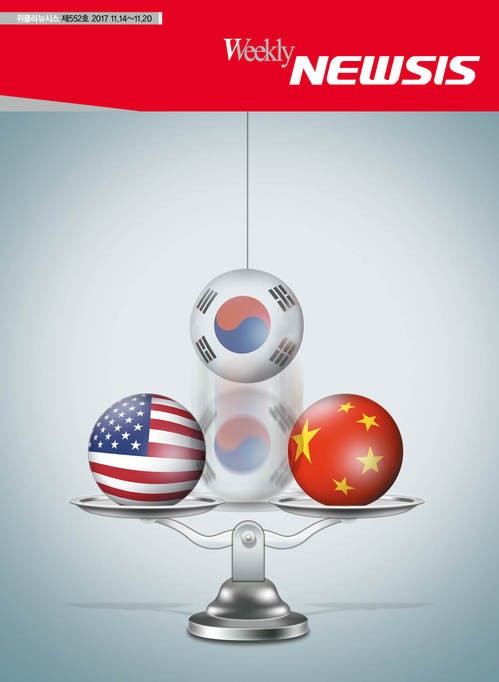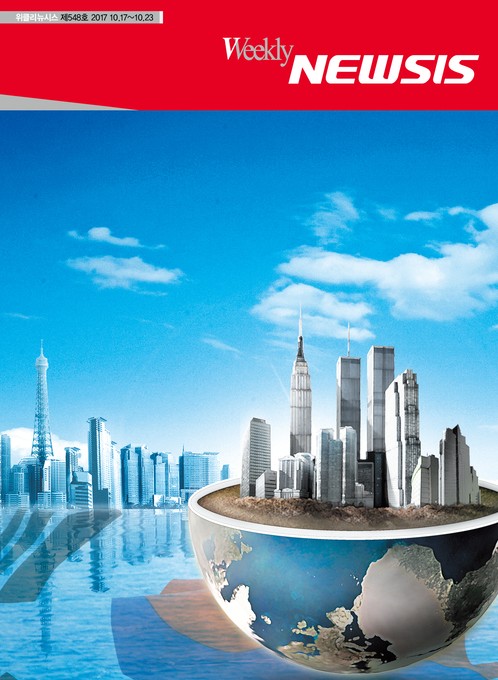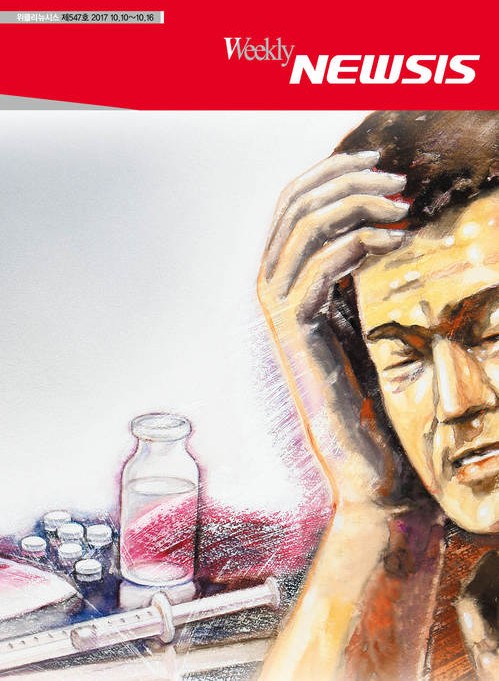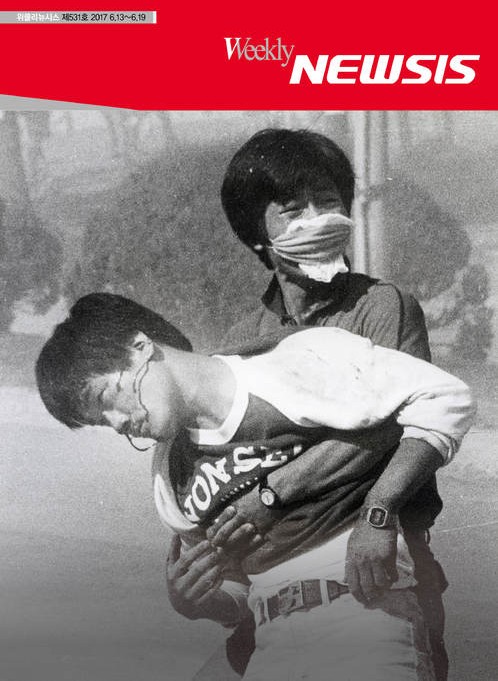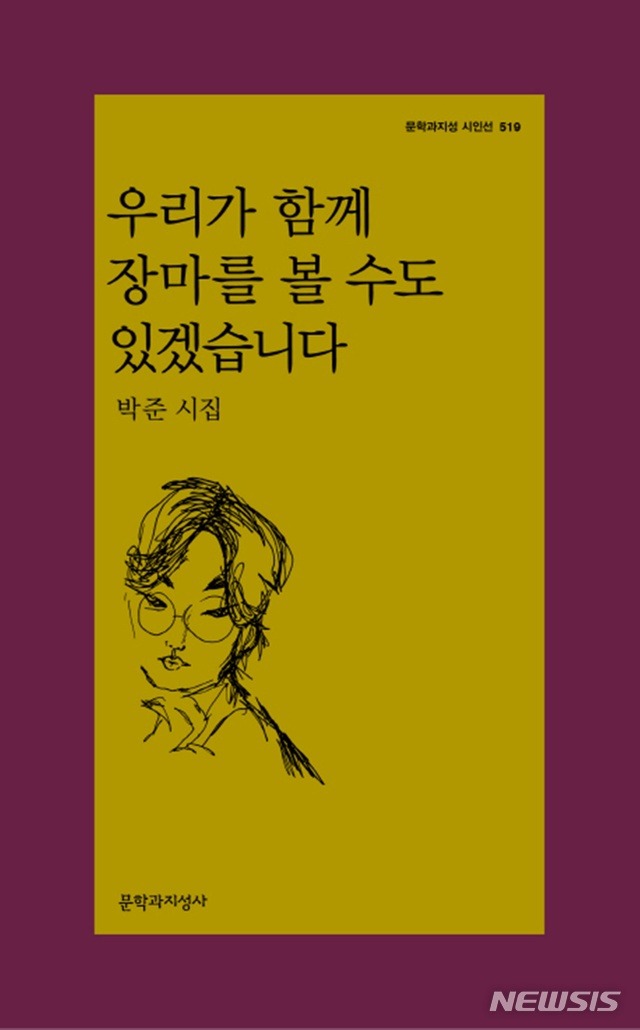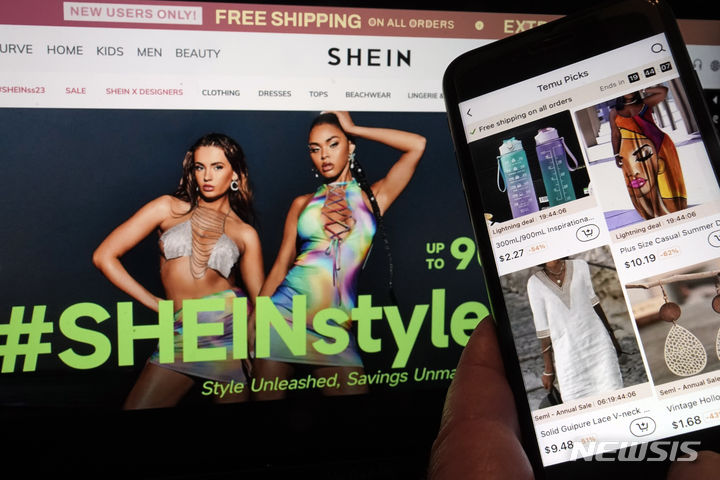[뉴시스 이 책]박준 "좋은 삶 살지 않으면 좋은 시는 써지지 않는다"
두번째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인 박준(35)의 두번째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문학과 지성사)에는 이런 시편이 대다수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는다. 문득 떠오르는 어느 날의 기억, 누군가와의 다정했던 대화 등 지나간 추억들을 하나둘씩 소환한다. 생각의 결을 섬세하게 살피다가 때로는 자유롭게 방랑하기도 한다.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이후 6년 만에 낸 신작이다. 시집 제목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다'고 한다.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미래의 언젠가 함께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긴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보고싶은 대상이나 현상이 제명만 보면 장마인 것 같다. 사실 보고싶은 것은 장마가 아니다. 장마를 보는 현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다. 즉, 장마를 함께 보고싶은 사람이다. 만나고 싶다는 고백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데에서 오는 절망, 사소한 희망이 대부분의 시편이다."
명실상부 '스타 시인'이지만 자세를 낮춘다. "첫 시집을 내기 전에는 기대를 많이 했다. 내 시들을 정식으로 보여주겠다는 기대 같은 게 있었다. 지금은 기대보다는 시집을 내도 되는지, 자기 검열이 심하다. 내 손을 떠난 상태의 텍스트는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만 그런 생각은 한다, 책이라는 것이 종이의 물성을 가진 것이다. 독자들이 잘 읽고 앞에 몇 글자 써서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 박 시인은 2008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다. 2013년 제31회 신동엽문학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모든 직업, 어떤 결정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처음에 시를 쓸 때는 시 쓰는 것을 조금은 어렵지 않게 생각했다. 당시에 시 쓰기는 마냥 즐거운 일이었다"고 돌아봤다.
시와 산문은 어떻게 다를까. "내 안에서 시와 산문은 분명히 구별된다. 시가 되기에는 조금 모자라거나 넘친다고 생각하면 산문으로 쓴다. 하지만 어떤 것을 시로 쓸지 산문으로 쓸지에 대해 언어로 정리하기 힘든 기준이 있다. 정의하기 힘든 기준에 의해서 시와 산문이 서로 보완하기도 한다. 사실 산문을 쓸 때는 마음이 편하다. 성실하게 진실되게 쓰면 된다. 그러나 시는 잘 써야 한다. 시인이니까 잘 써야 되지 않겠나. 하하." 이번 시집 시인의 말에 "어떤 빚은 빛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썼다. "첫 번째 빚은 경제적인 채무가 아니라 마음의 빚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빚을 졌다고 한다. 어떤 사람을 조금 서운하게 해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미안함이든 고마움이 빚으로 느껴졌어도 계속 채무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답'이라는 능동적인 행위가 있든, 그 고마움을 마음에 품고 살든 빛으로 오는 것이다."
시에서 난해한 시어를 찾을 수 없다. 아주 쉽게 읽힌다. 평범한 일상 자체가 시의 소재다. "그 사람 고향이 양양이야. 말을 할 때마다 먼저 아, 하는데. 또 말을 이으면서도 아, 하고 내뱉는데. 그게 그곳 사람들의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어. 또 모르지. 그 큰 산들이 언제나 눈앞에 보이니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일 수도. 말을 맺고 나서도 매번 아, 아아, 아."('아,' 전문)
"비 온다니 꽃 지겠다// 진종일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생활과 예보' 전문) 시인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일에서 남다른 의미를 발견한다. 일상이 시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어떤 시인이 되고 싶을까. "좋은 시를 쓰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미래의 일을 예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짐하지 않으면 멀리 갈 수도 있다. 어떤 시를 쓰겠다는 것은 없다. 내가 어떤 정서나 현상에 관심을 가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좋은 시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시를 쓰겠다는 것은 좋은 삶을 살겠다는 것과 동의어다. 똑바로 정신차리고 좋은 삶을 살다보면 좋은 시가 써질 수도 있고, 안 써질 수도 있다. 좋은 삶이란 여러 의미의 아주 좋음이다. 좋은 삶을 살지 않으면 좋은 시는 절대 써지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