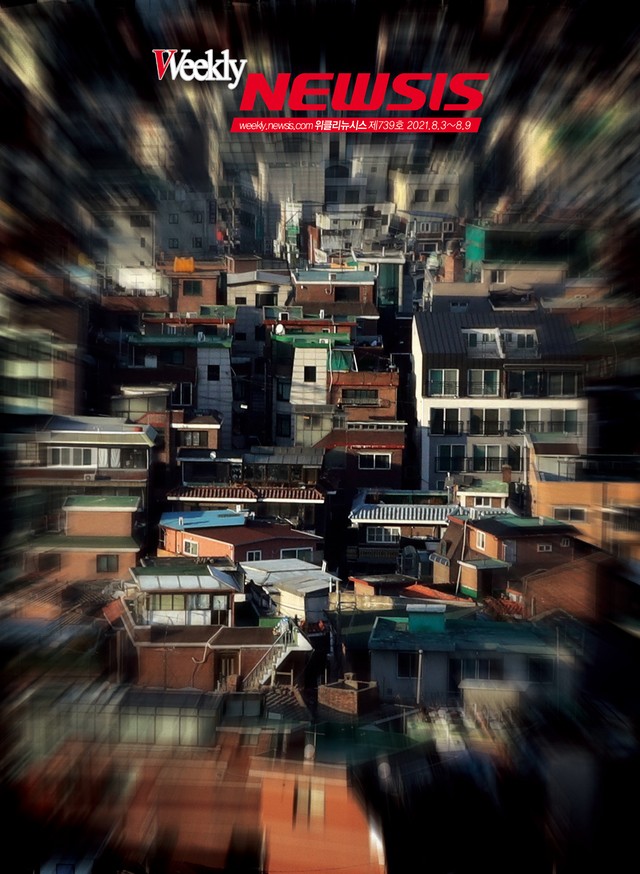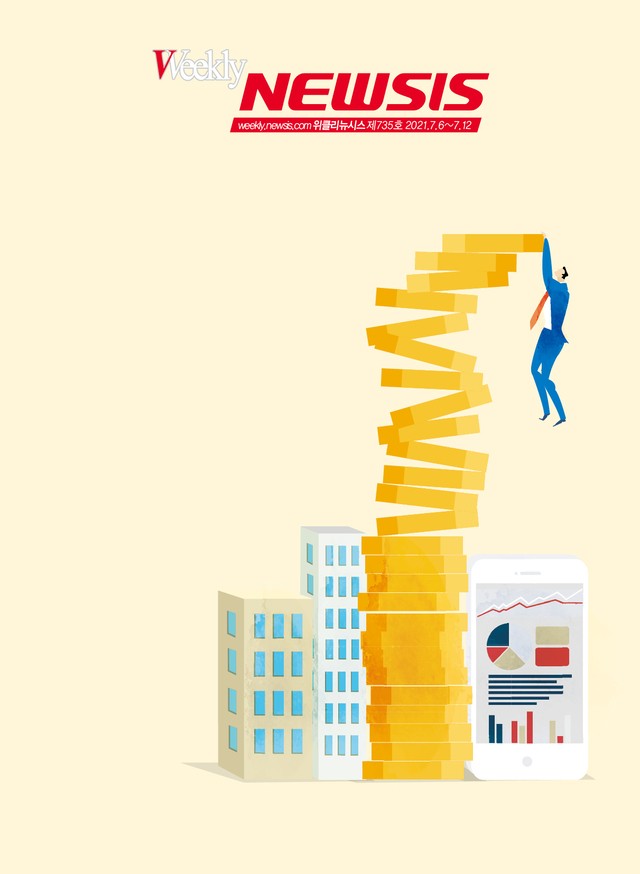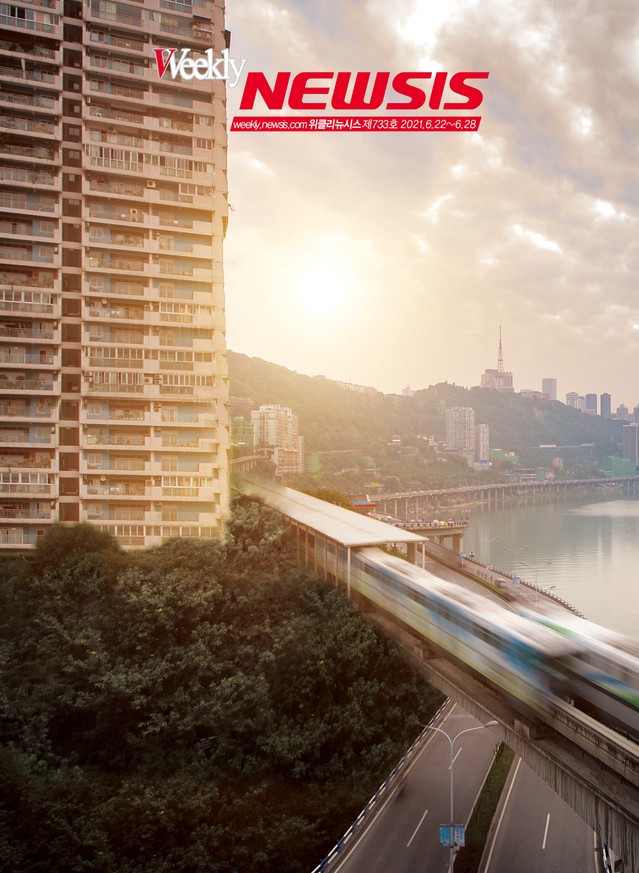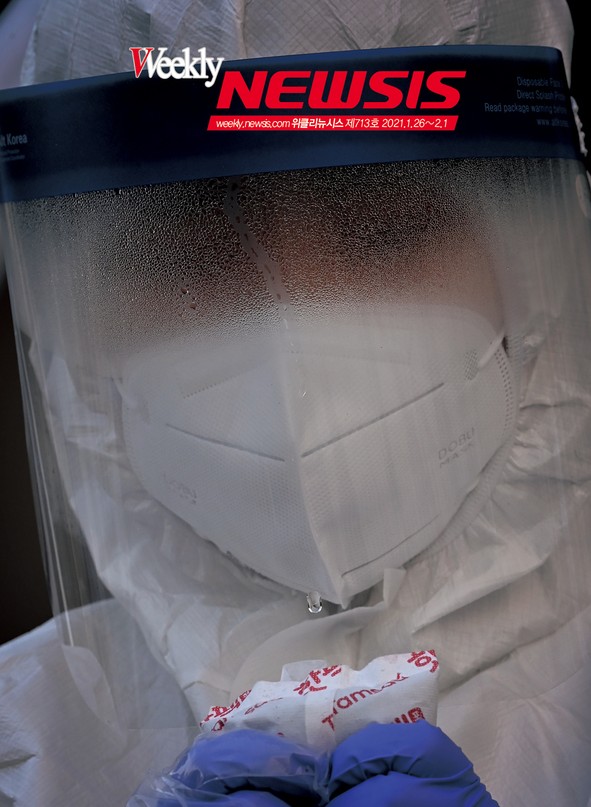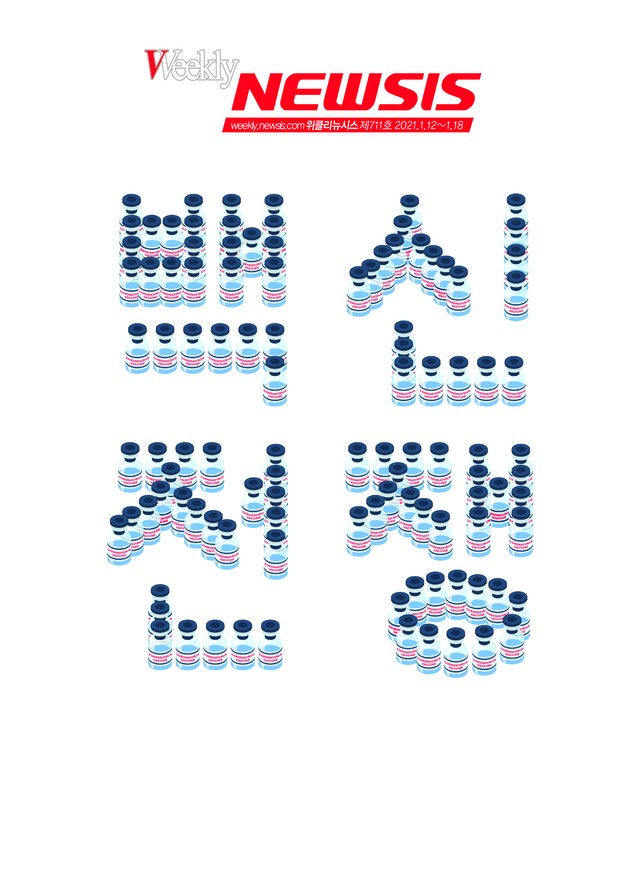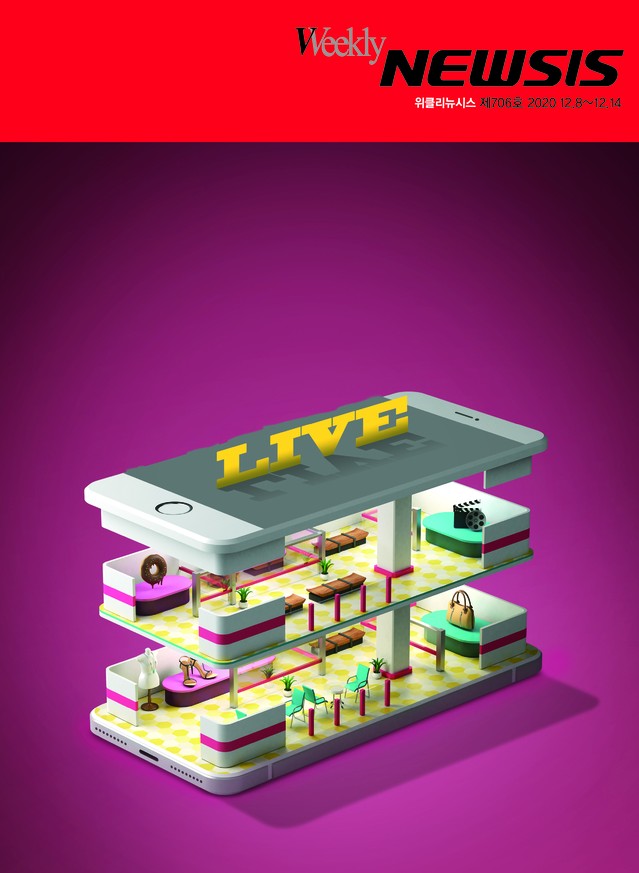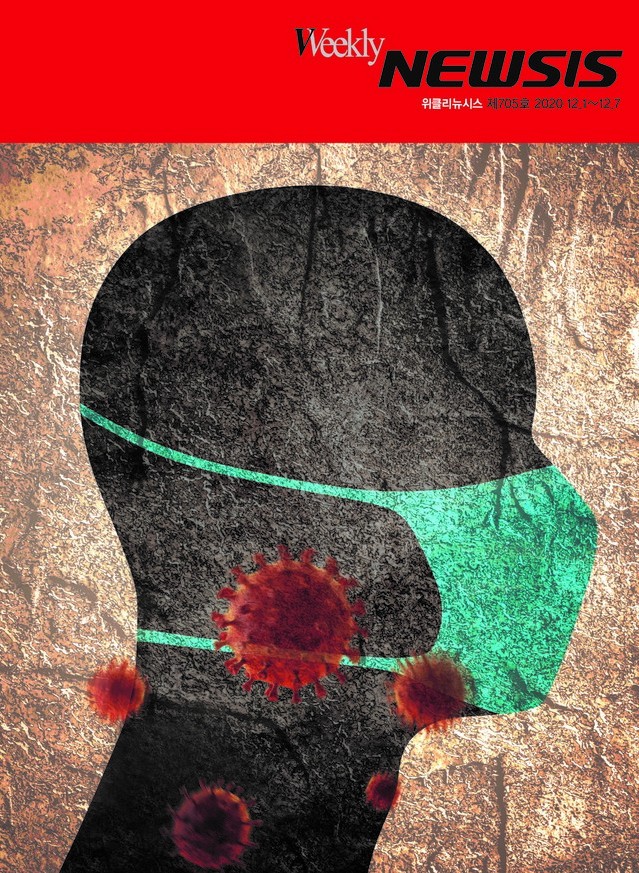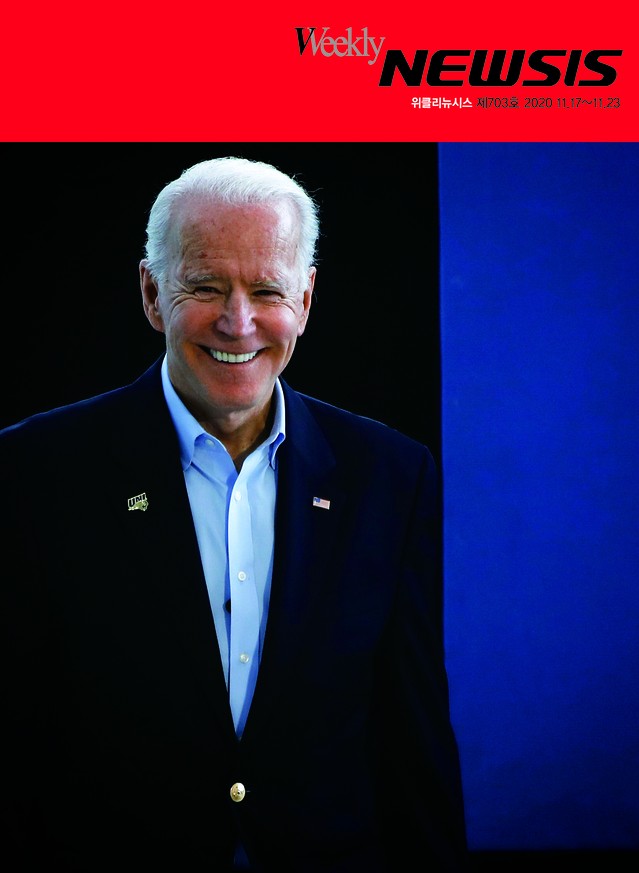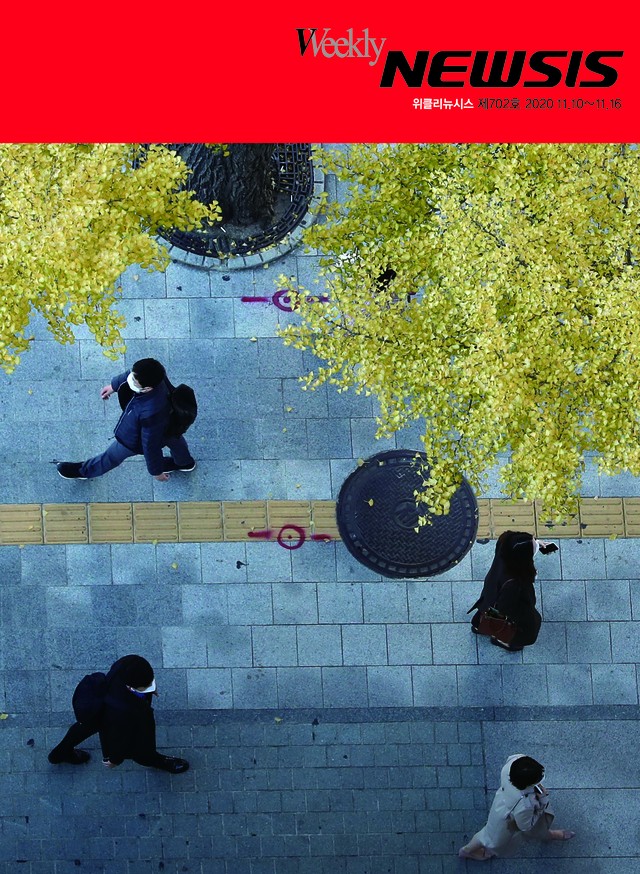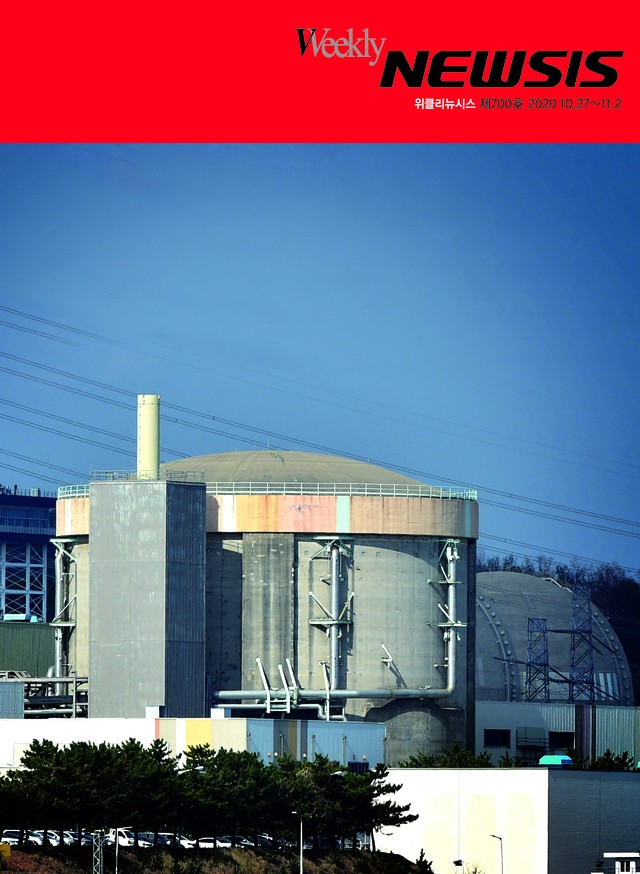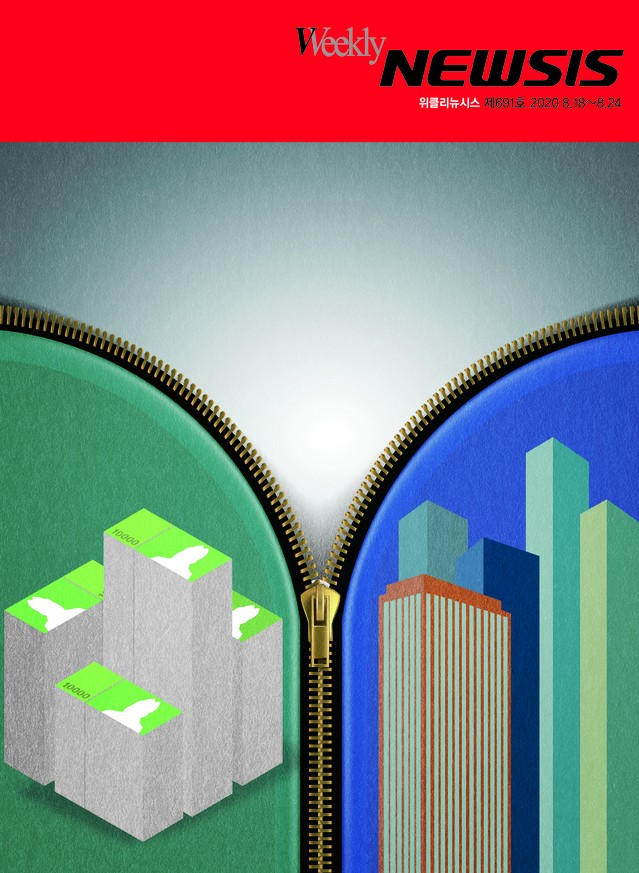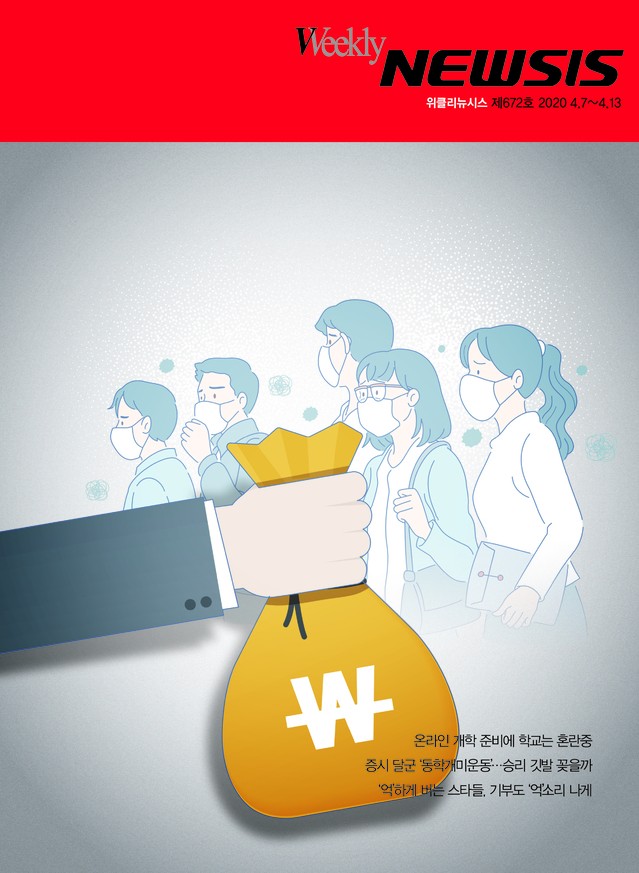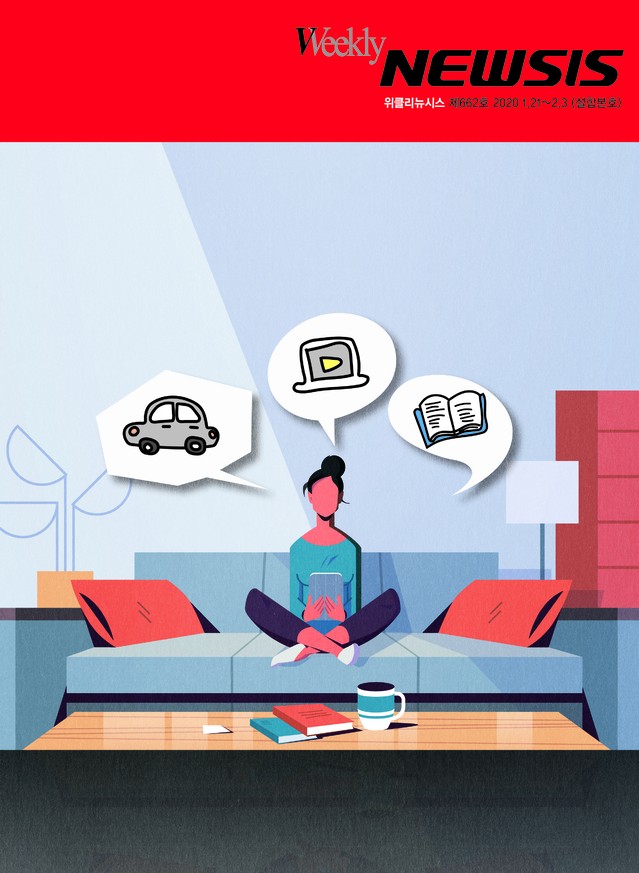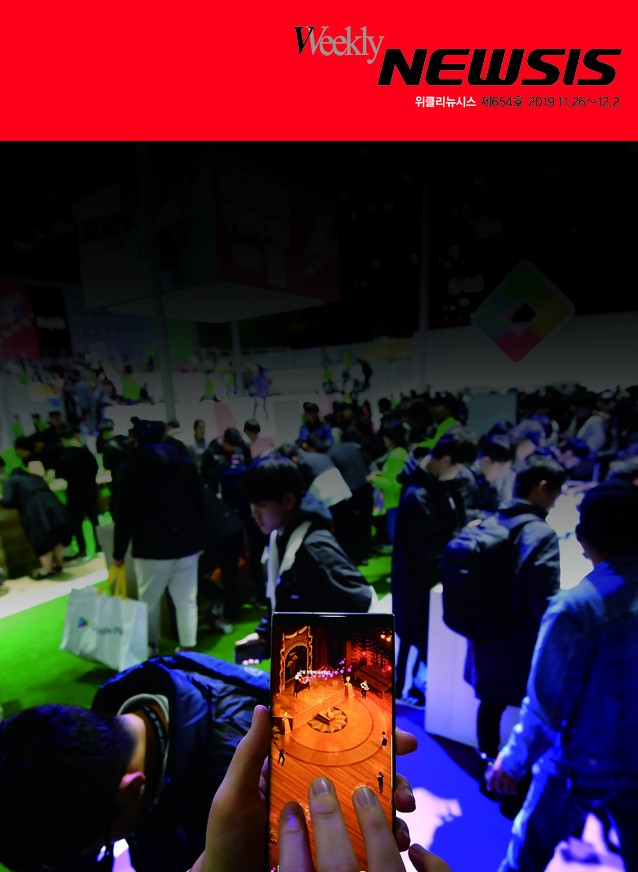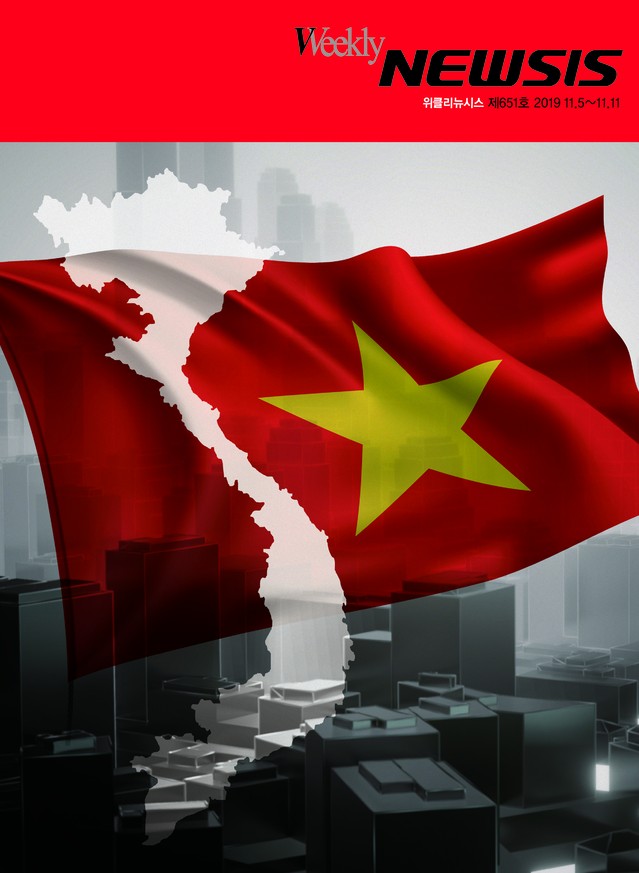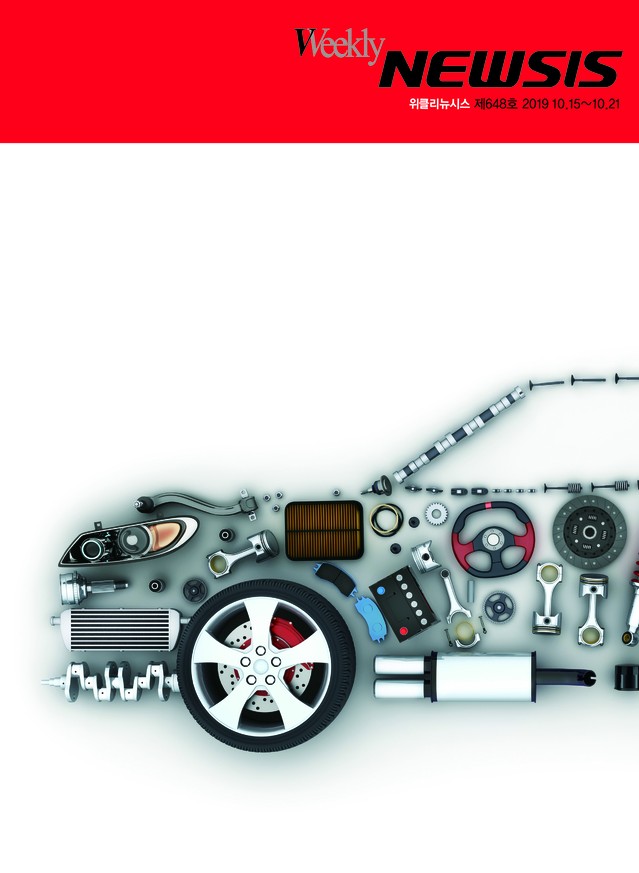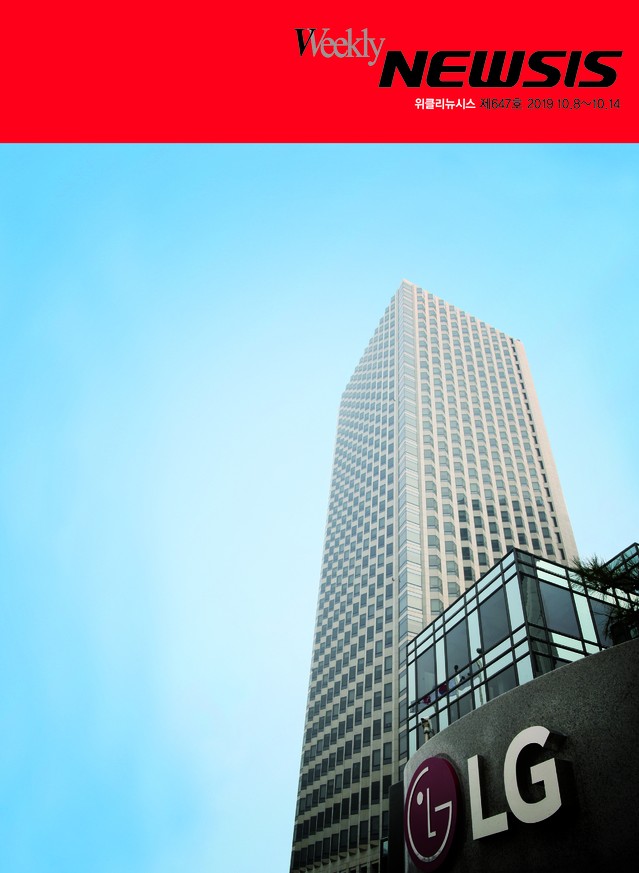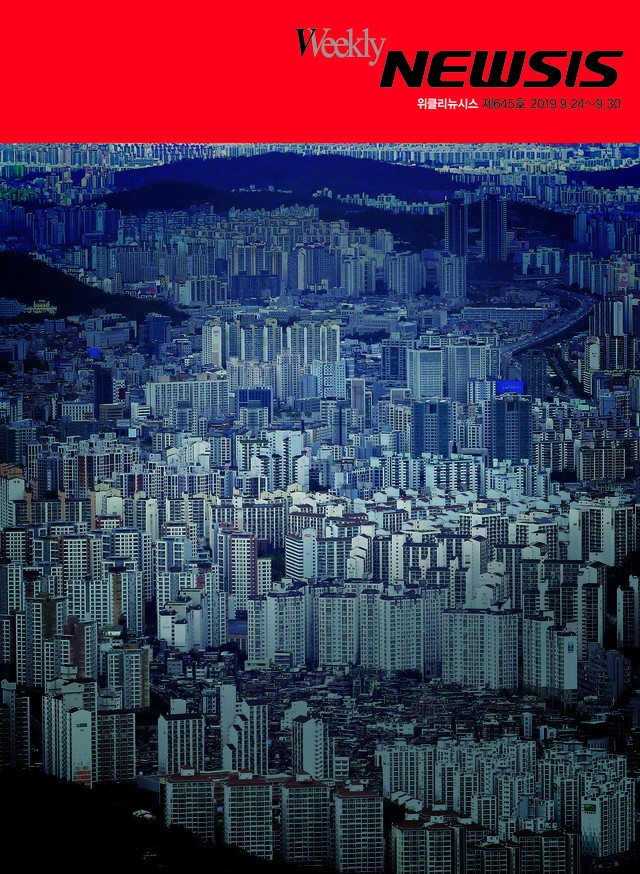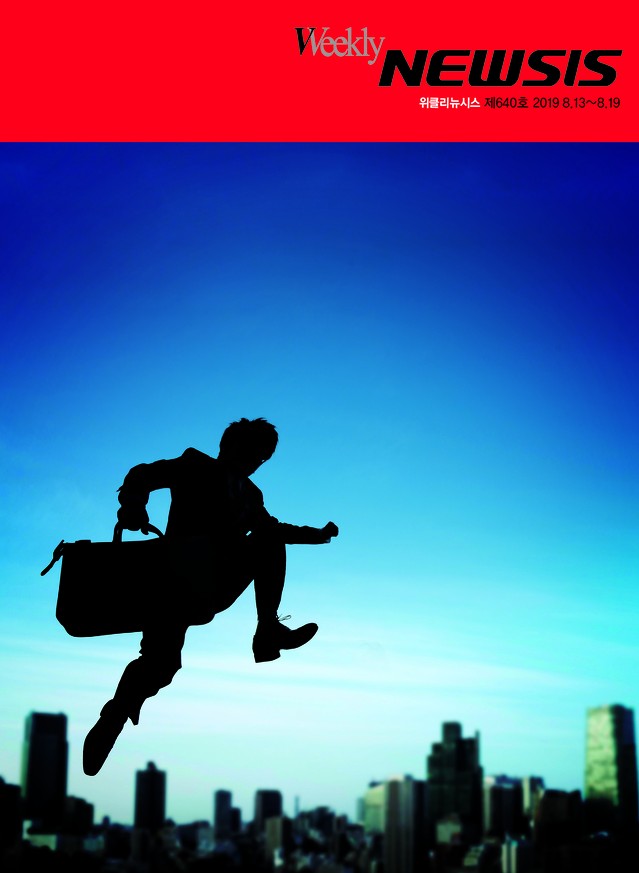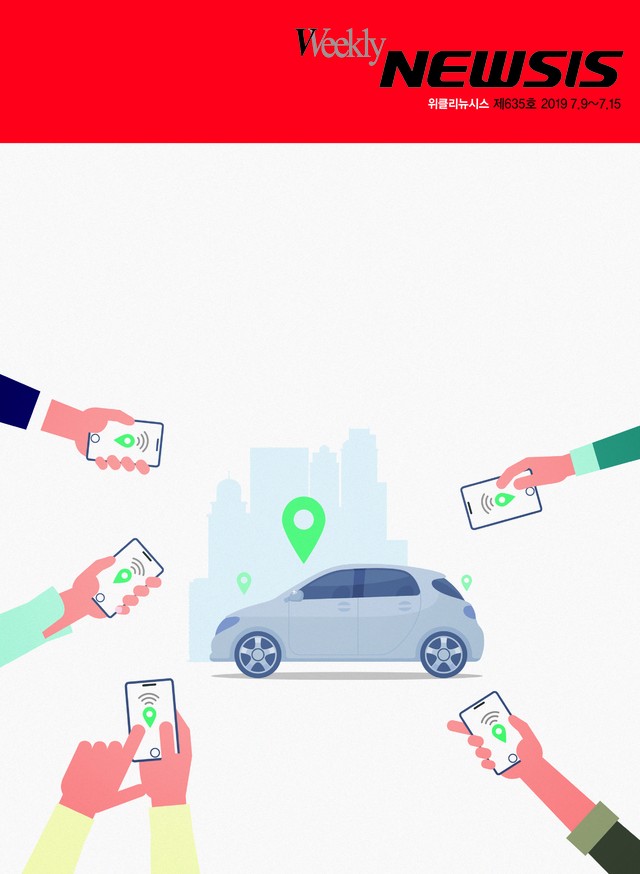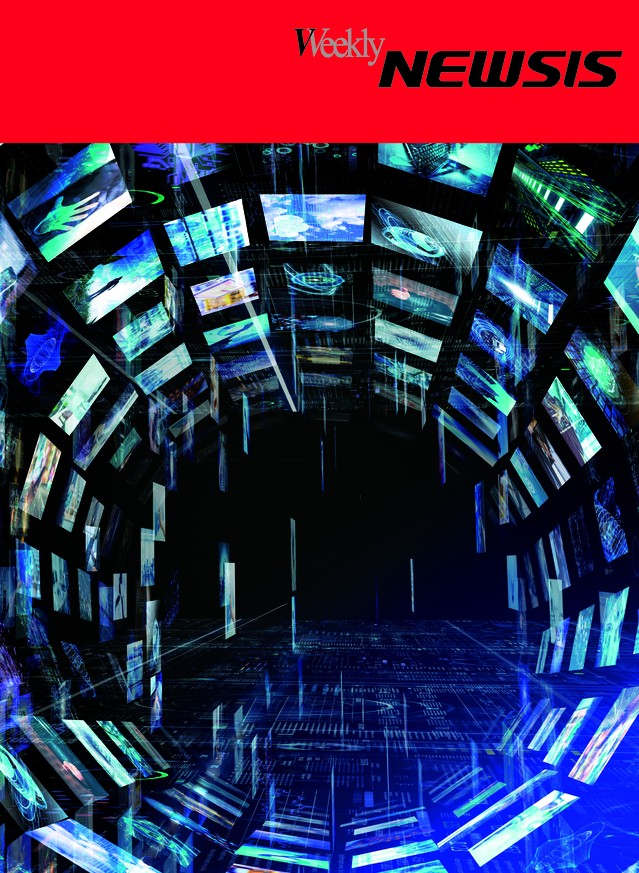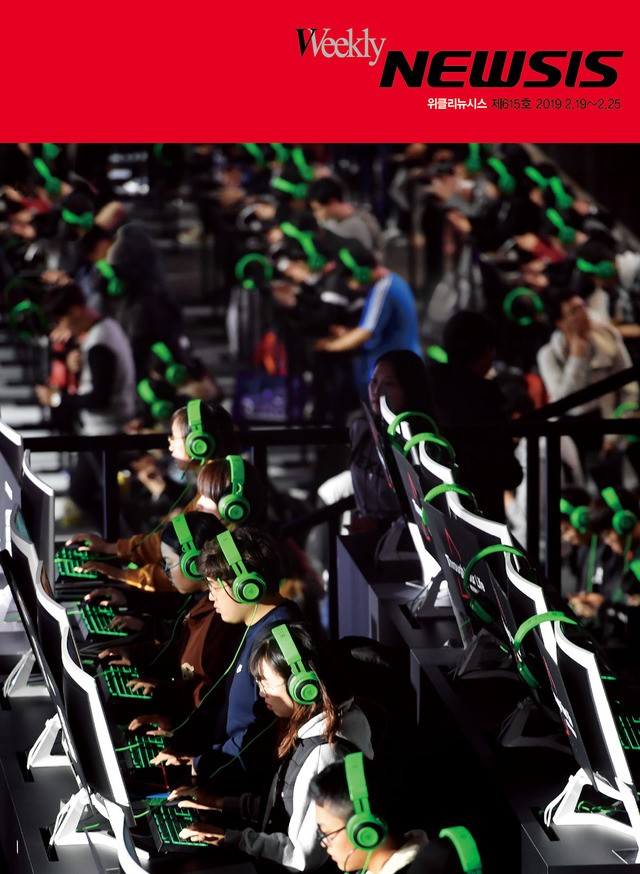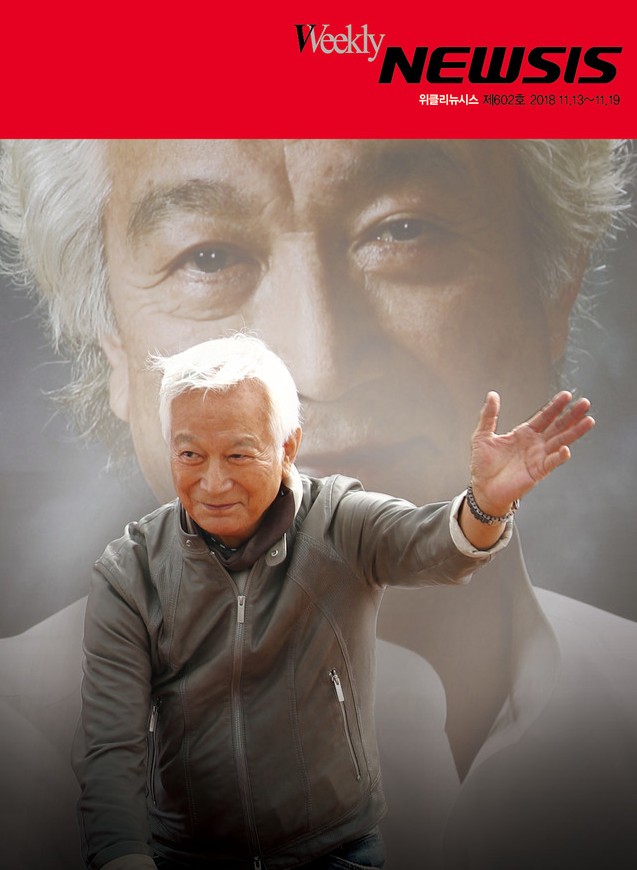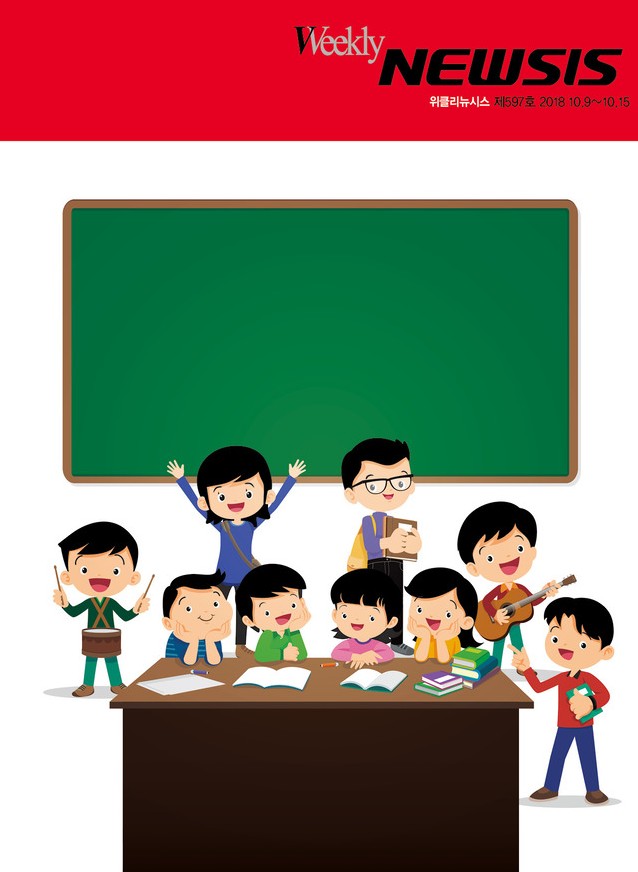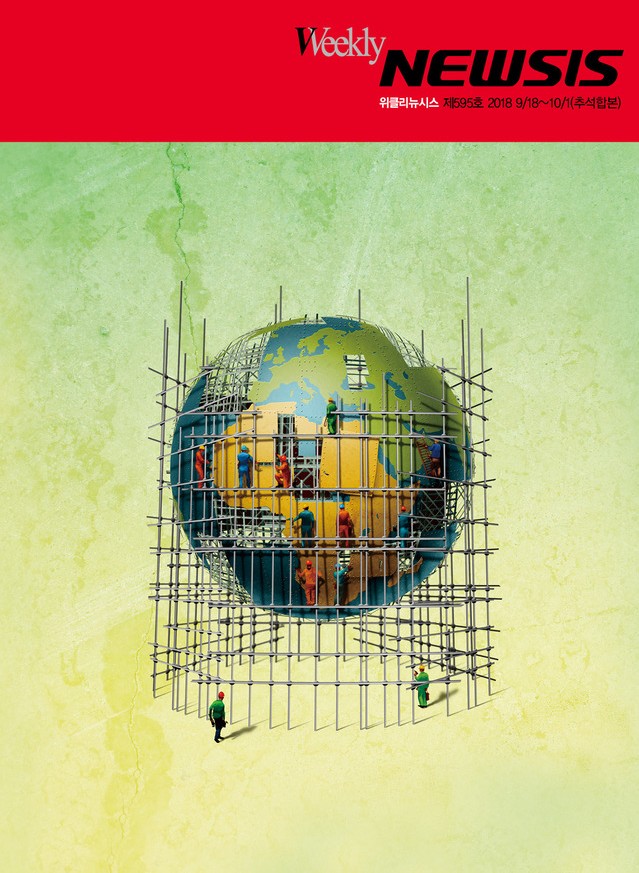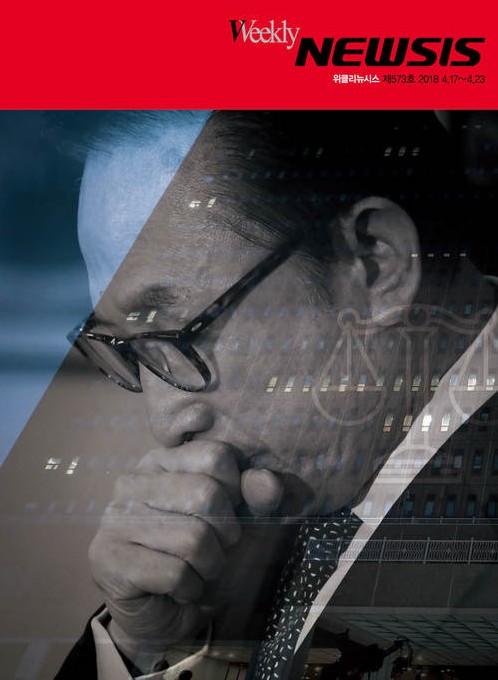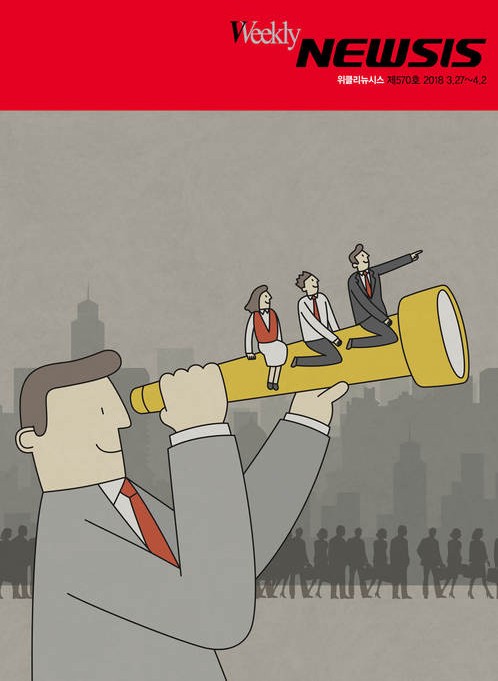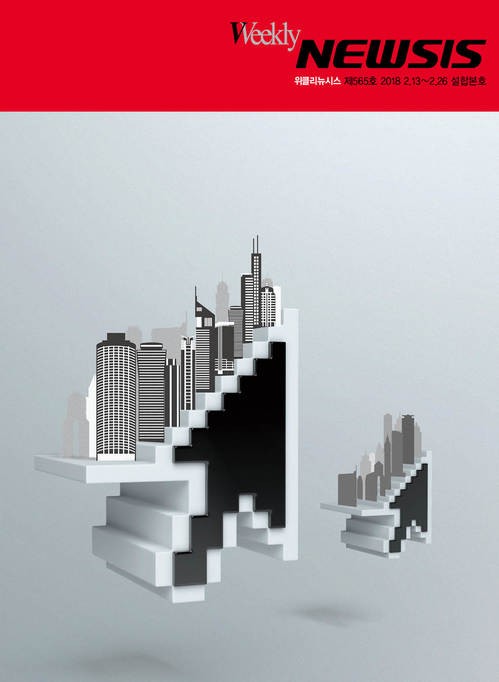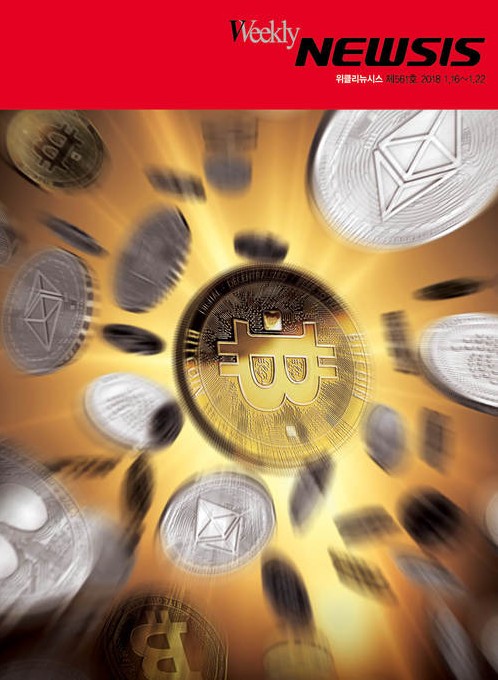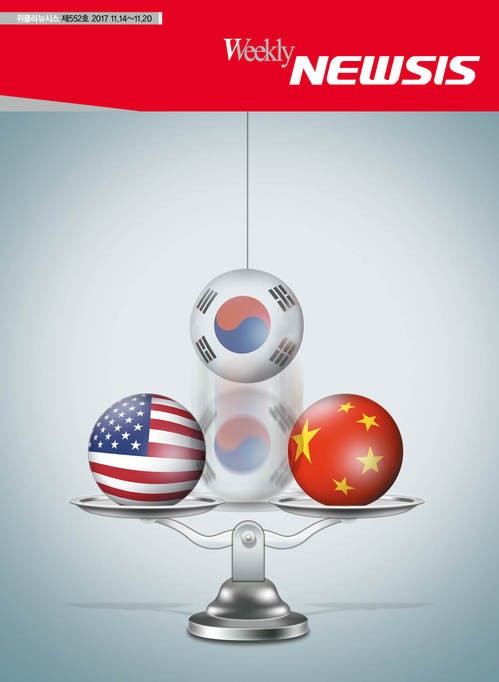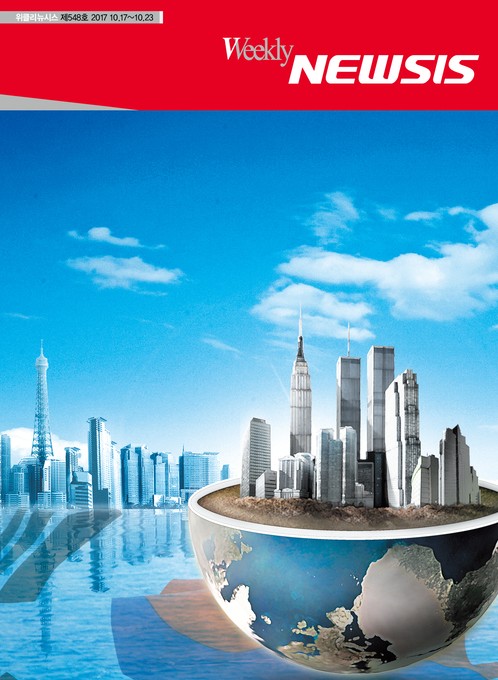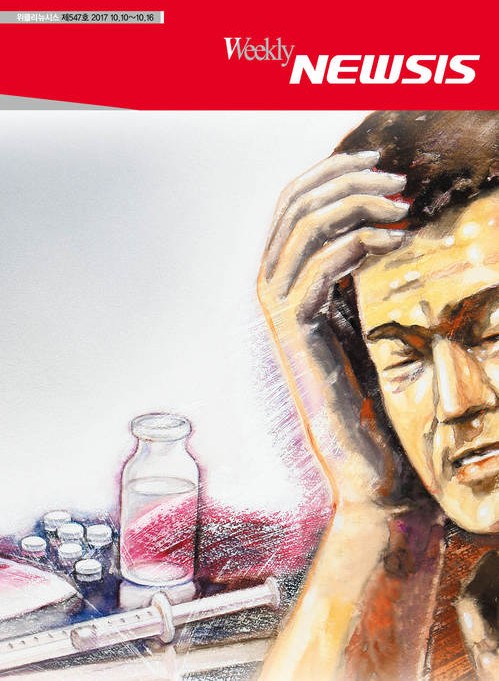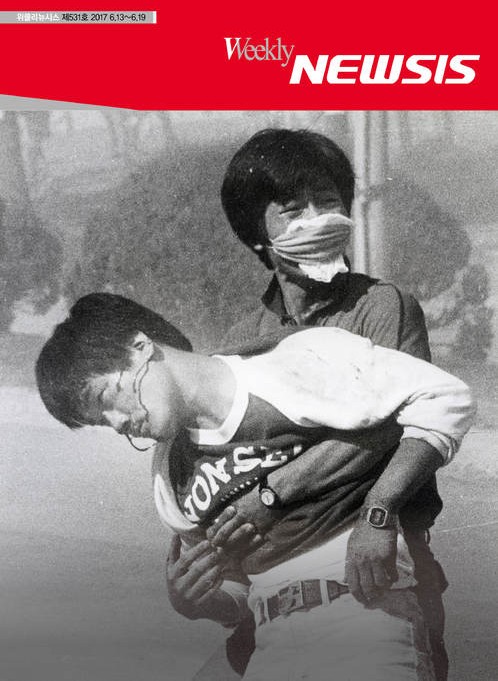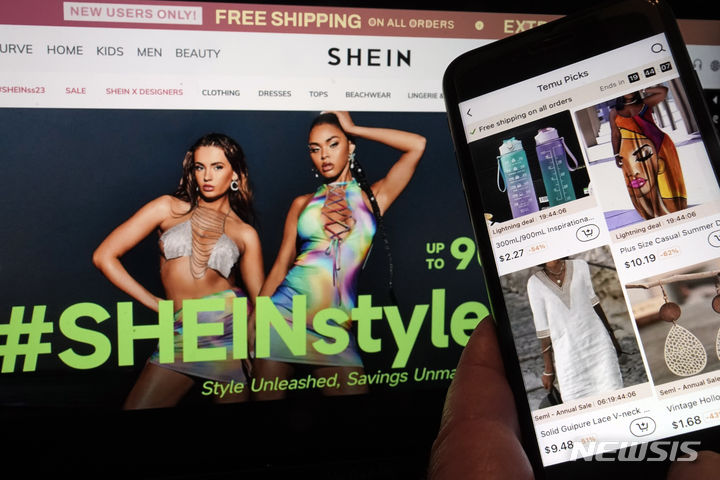사람은 언제 슬픈가, 하유지 '눈 깜짝할 사이 서른셋'
2016년 한국경제 신춘문예로 등단한 하유지(36)의 장편소설 '눈 깜짝할 사이 서른셋'이 나왔다. 참고서 편집자 서른세살 여자 '오영오'가 주인공이다. 영오에게 죽은 아버지가 남긴 것은 월세 보증금과 밥솥 하나, 그 안에 담긴 수첩이 전부다. 어머니가 4년 전 폐암으로 죽은 뒤 겨우 예닐곱 번 만난 아버지다. 앞뒤 맥락도 없이 수첩에는 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만이 적혀 있다. 영오는 아버지가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했던 학교 교사 '홍강주'를 만나고, 그와 함께 나머지 두 명을 찾는다. '미지'는 영오가 편집한 '튼튼국어'를 풀다가 문제가 재밌다는 이유로 매일 전화를 한다. 알고보니 홍강주가 교사로 일하는 새별중학교 학생이었다. 치킨 가게를 열어 큰 성공을 거둔 엄마는 고교 진학을 거부하는 미지와 회사에서 해고된 아빠를 개나리아파트로 쫓아냈다. 옆집에는 성격이 괴팍한 할아버지 '두출'이 산다. 미지와 두출은 '버찌'라는 고양이를 통해 우정을 쌓아간다. 인간관계가 서툴렀던 영오와 미지는 세상 밖으로 나서고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 여기 다치고, 저기 파이고, 죽을 때까지 죄다 흉터야. 같은 데 다쳤다고 한 곡절에 한마음이냐, 그건 또 아닌지만서도 같은 자리 아파본 사람끼리는 아 하면 아 하지 어 하진 않아." "사람은 언제 슬픈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따뜻한 살과 살을 맞대며 이 또한 식으리라 인정할 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처를 입고 똑같은 진물을 흘리며 똑같은 슬픔을 몇 번이고 반복하리라 예감할 때. 그때 나와 너의 연약함, 우리의 숙명 앞에서 경건해진다. 엄마. 벽을 보고 울던 엄마, 몰래 담배를 피우던 엄마, 죽음 앞에서 평온해진 엄마. 엄마의 상처에 어떤 고름이 맺혔기에, 무슨 딱지가 앉았기에." 하 작가는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고 한다. "벽을 뚫고 그 너머로 넘어갑니다. 어떤 벽은 와르르 무너지고 어떤 벽은 스르륵 사라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312쪽, 1만3800원, 다산책방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