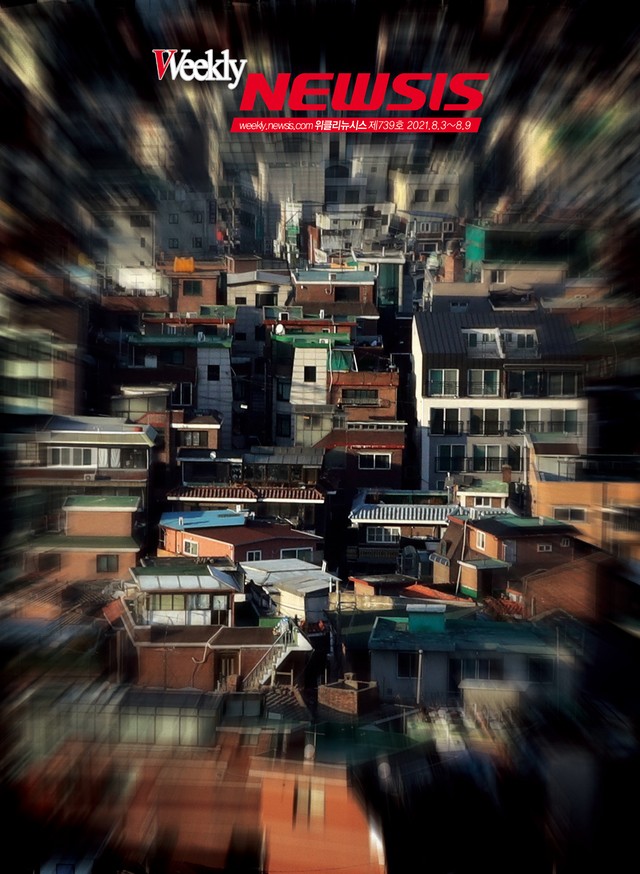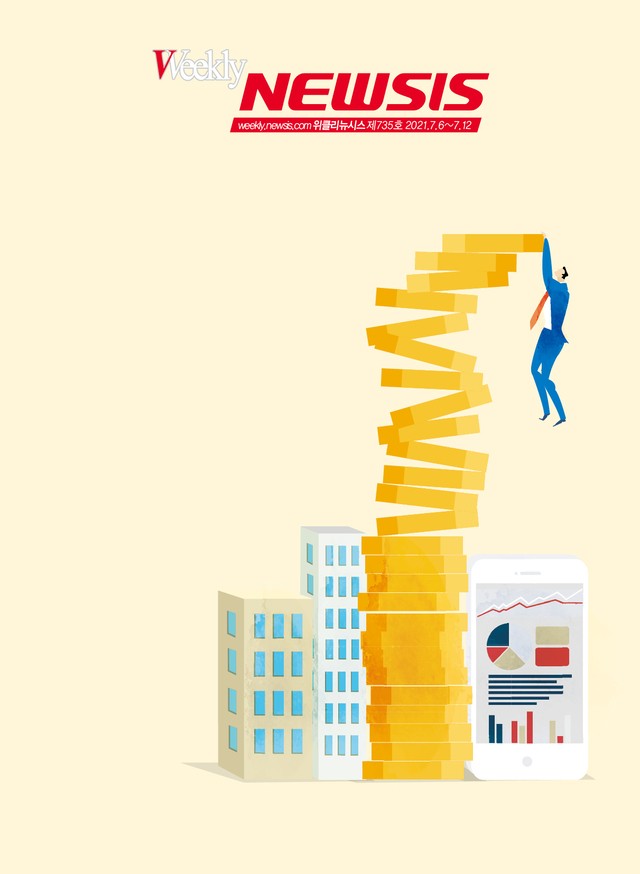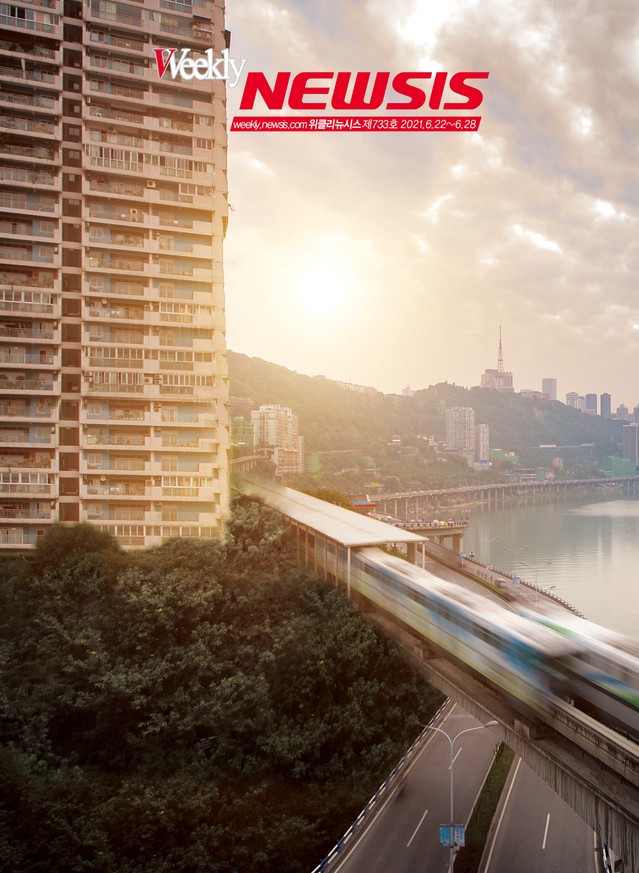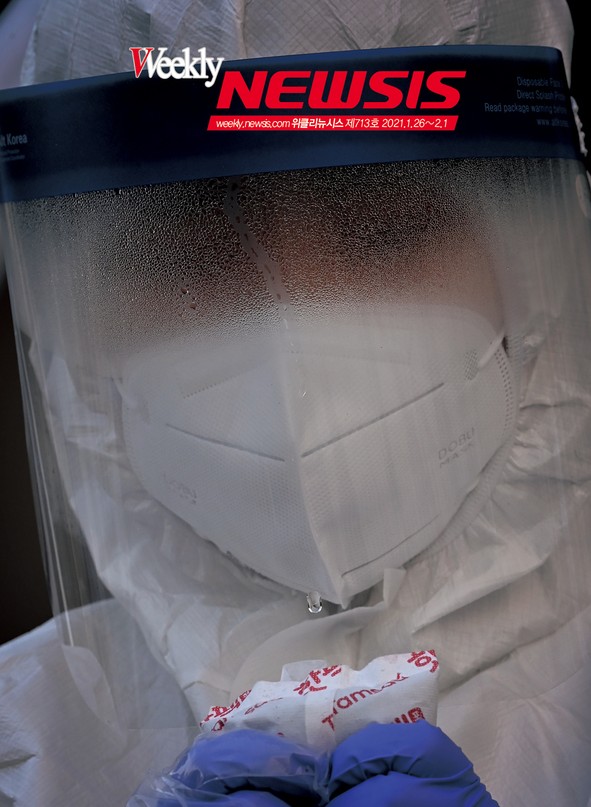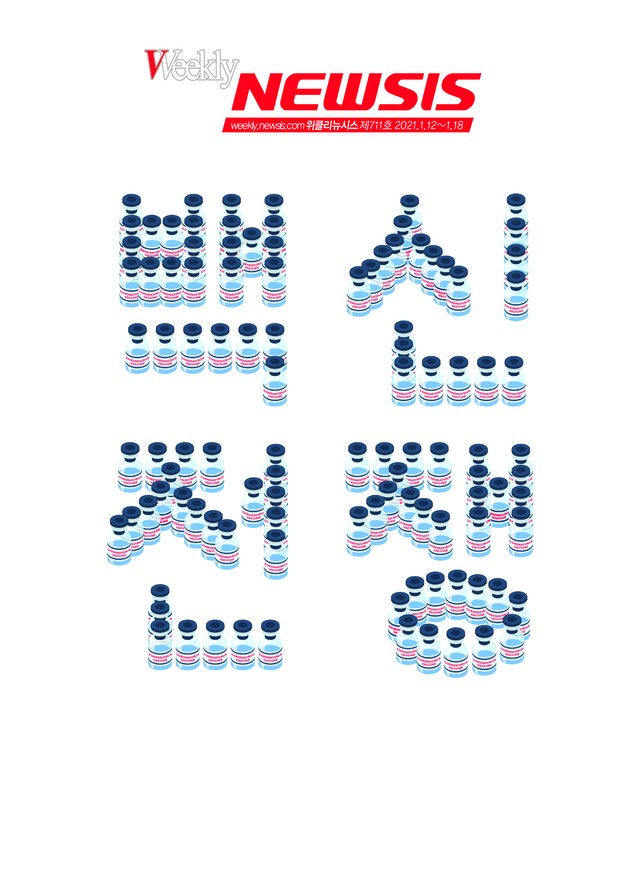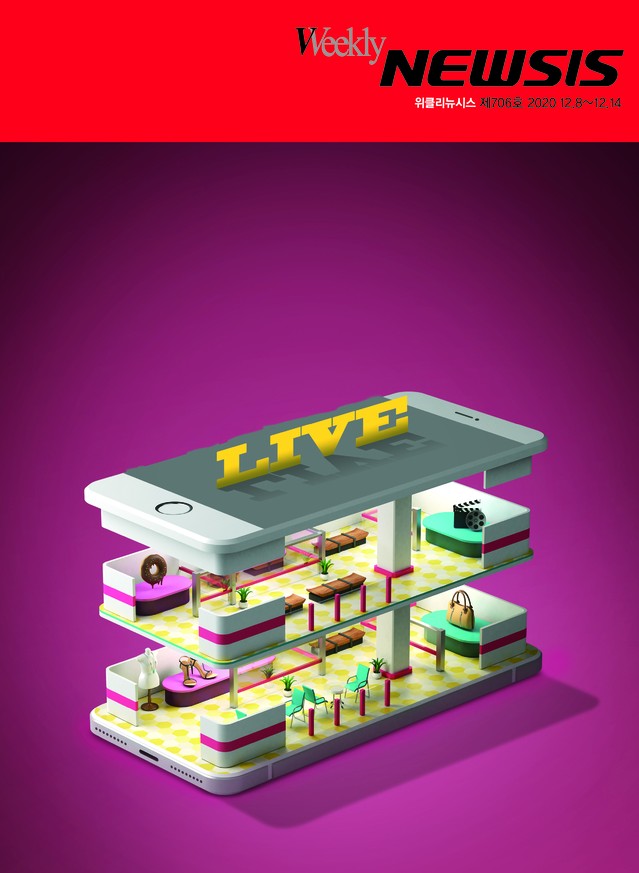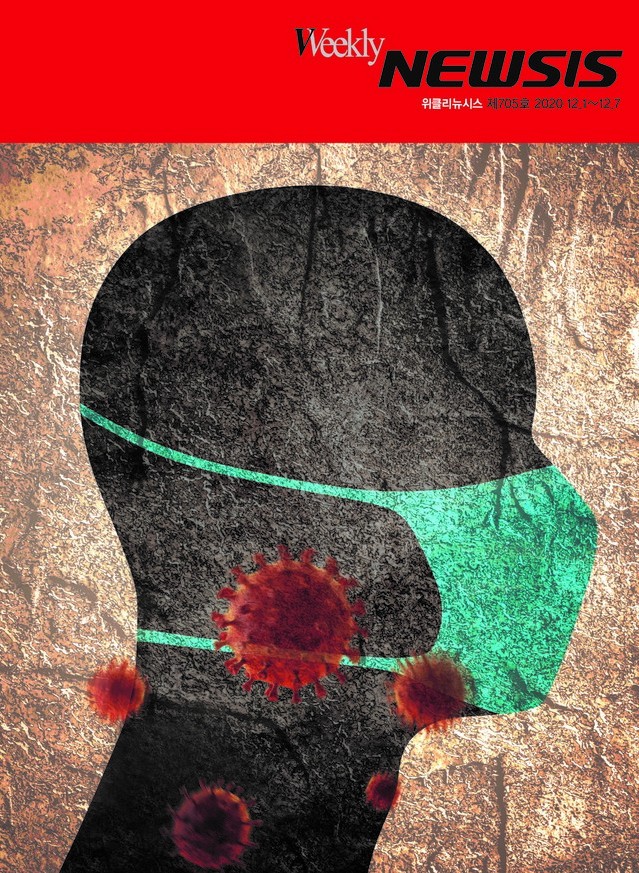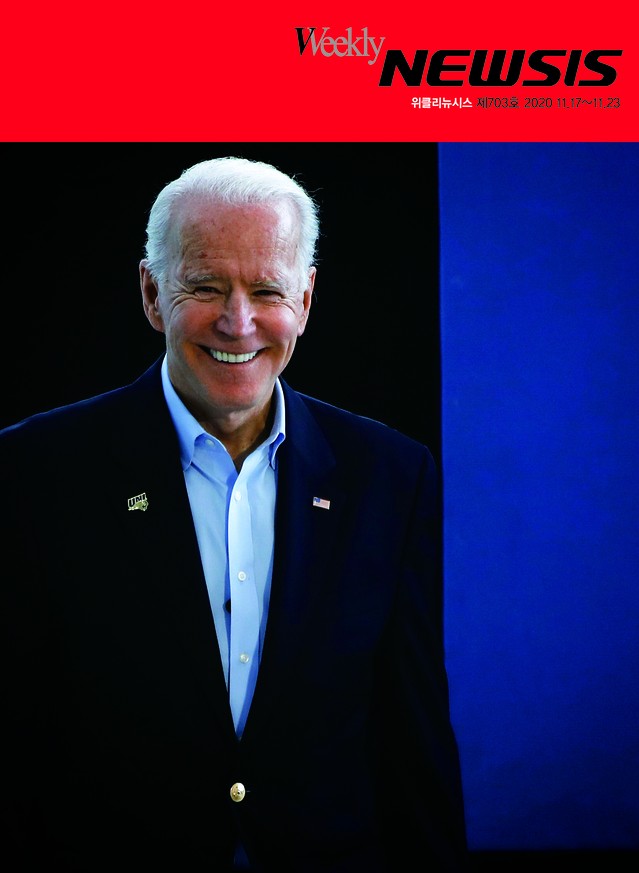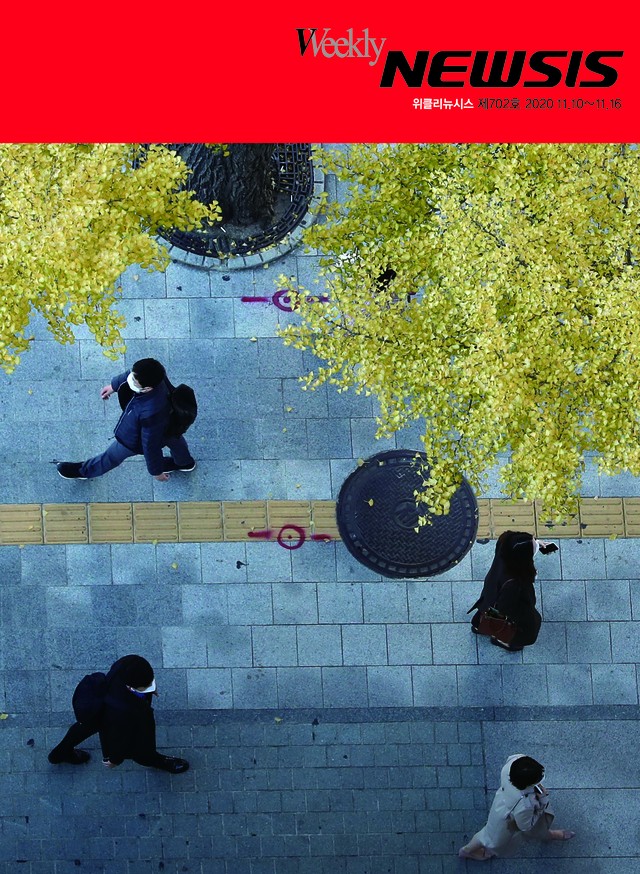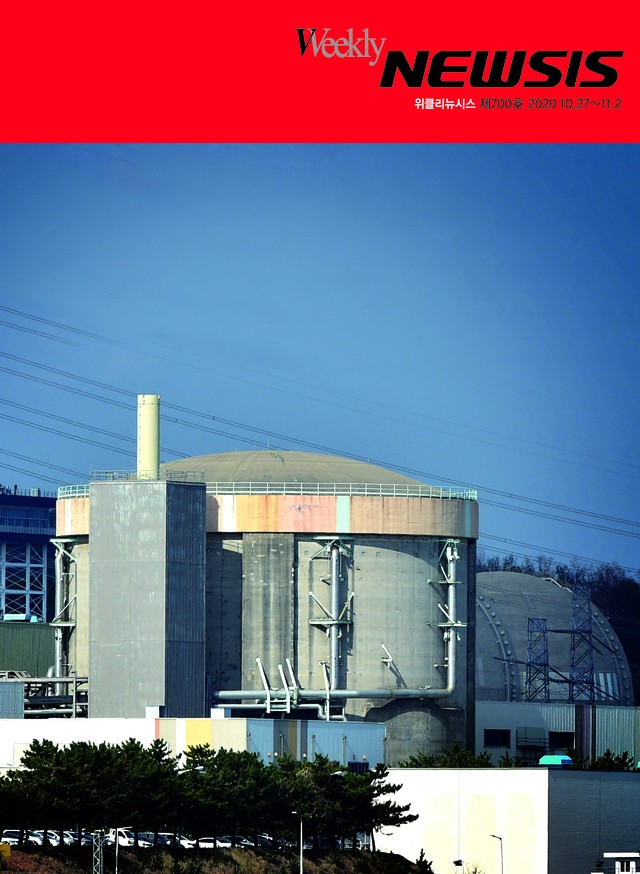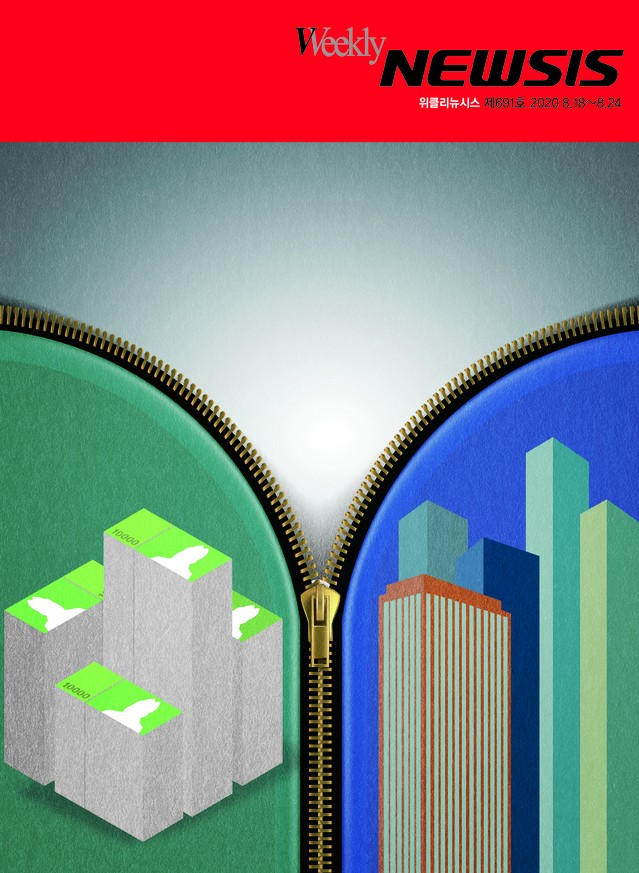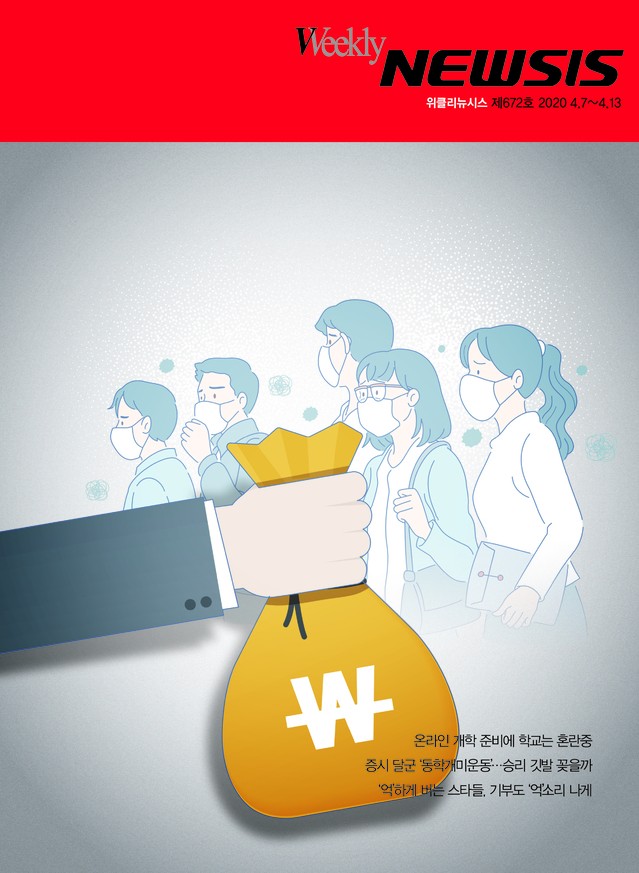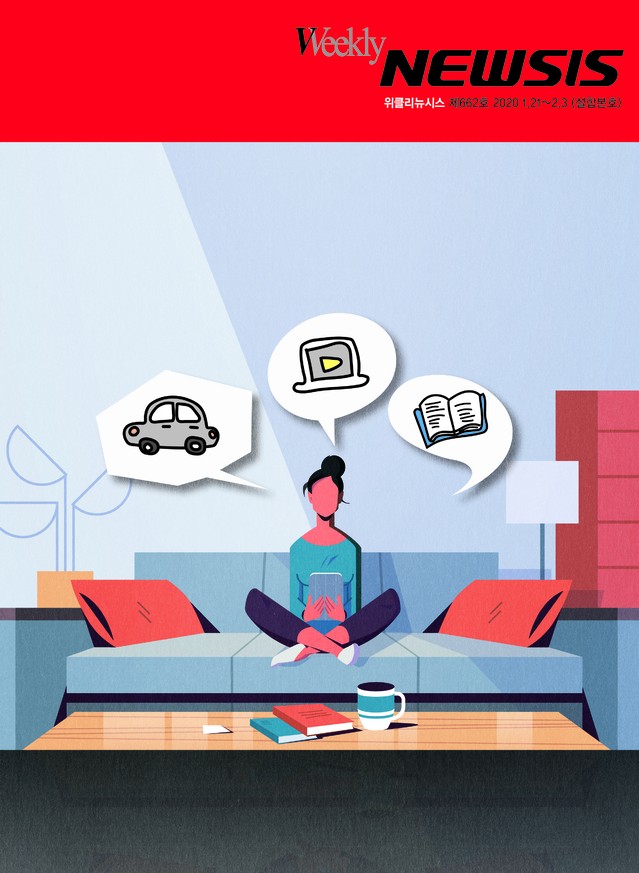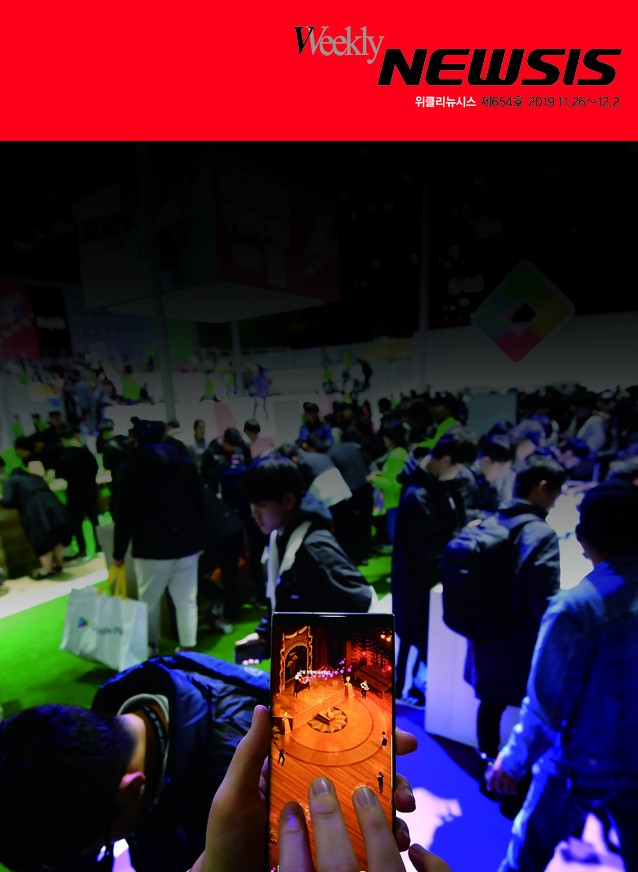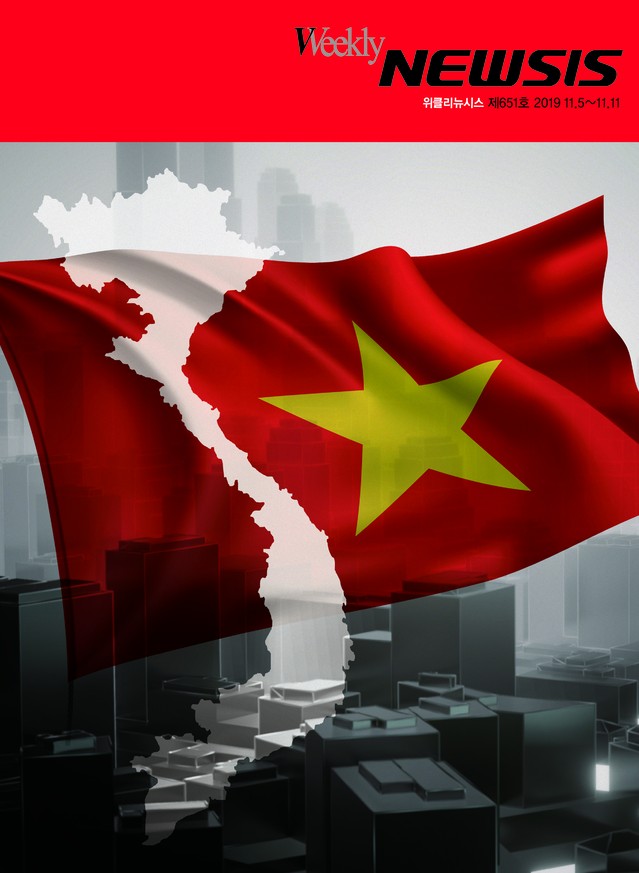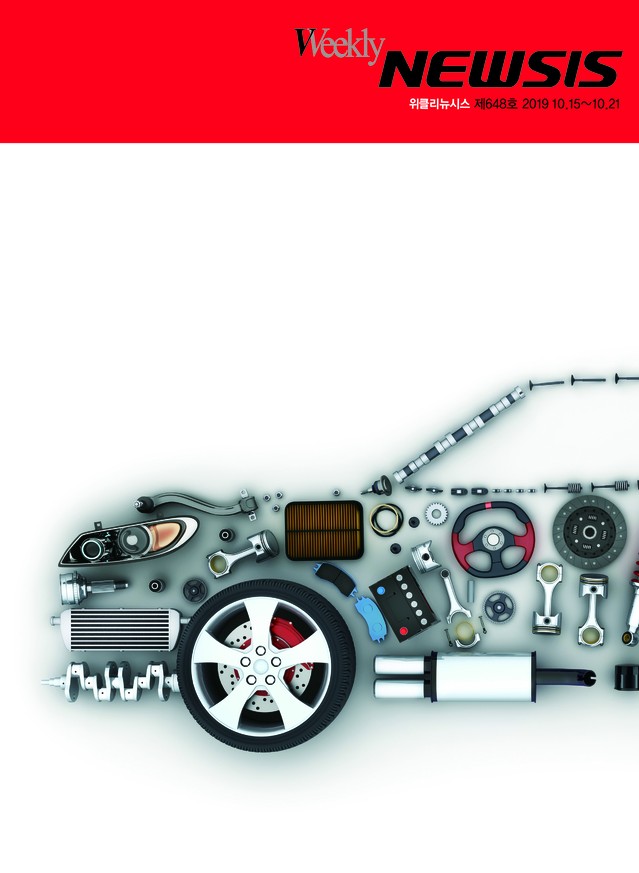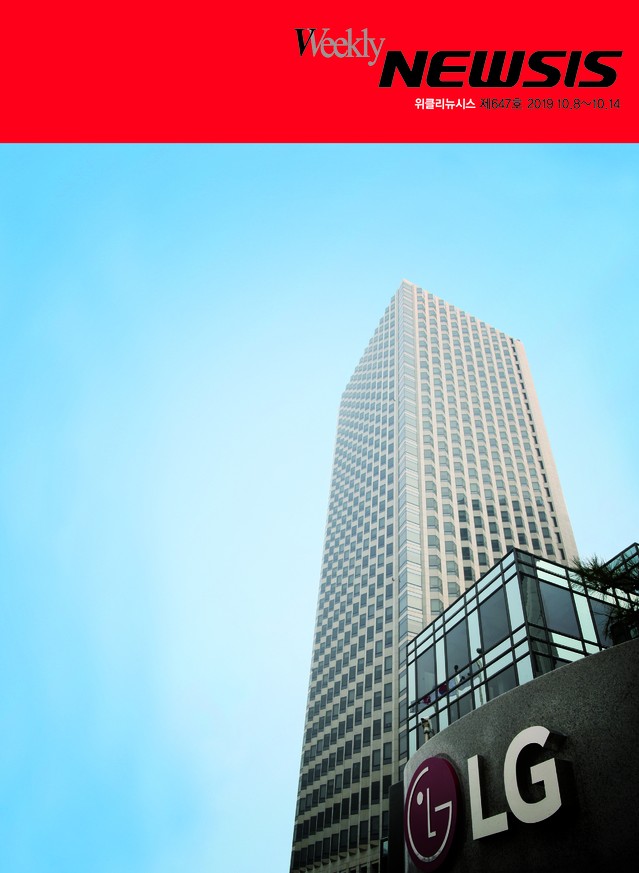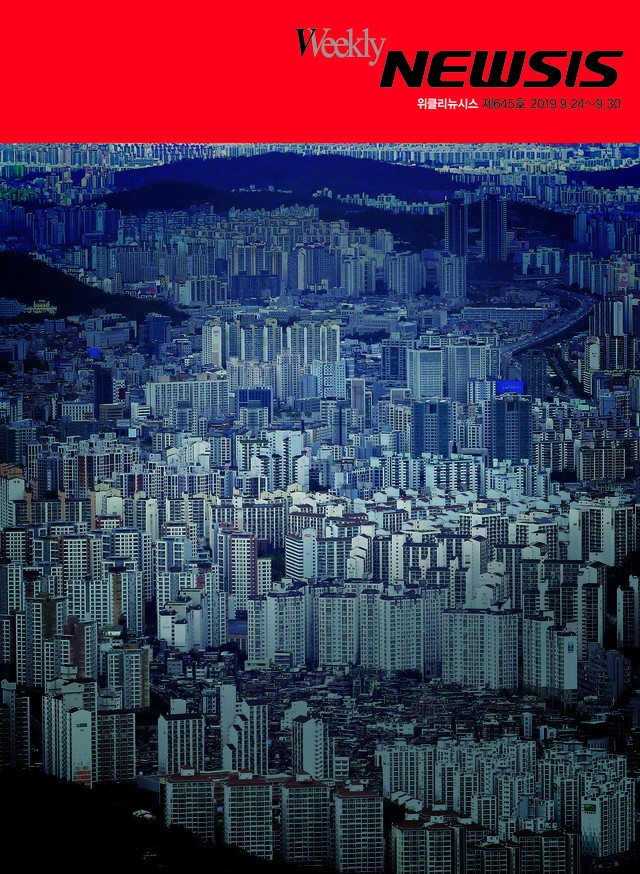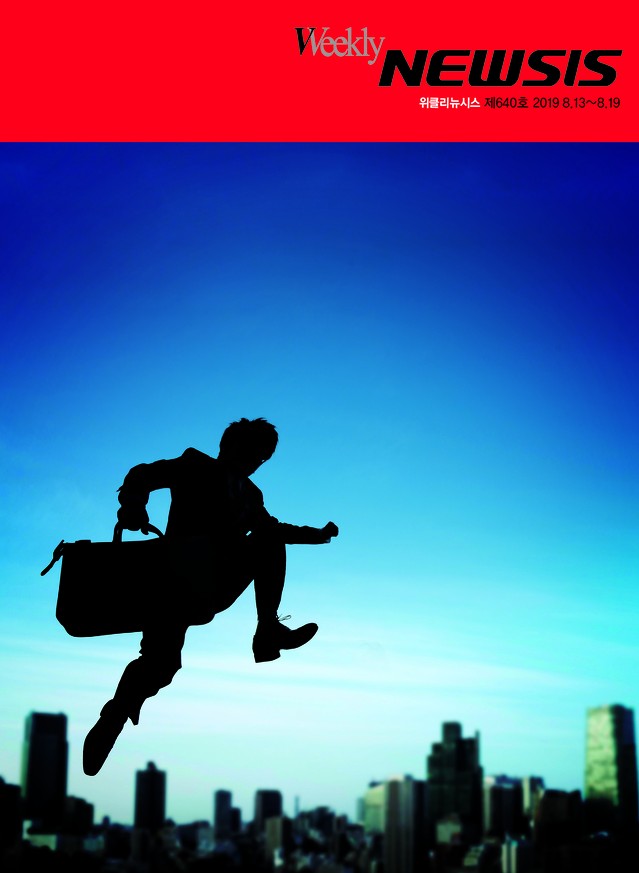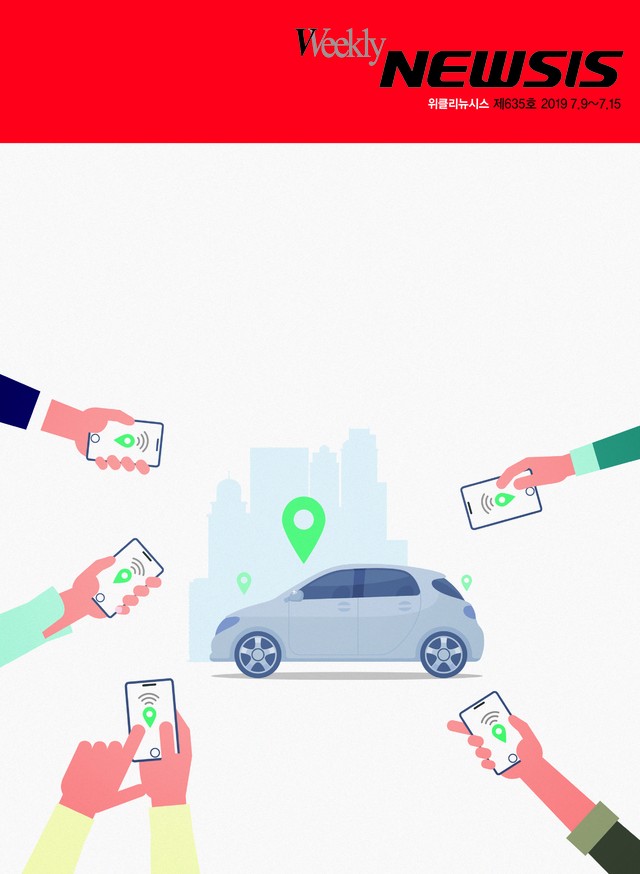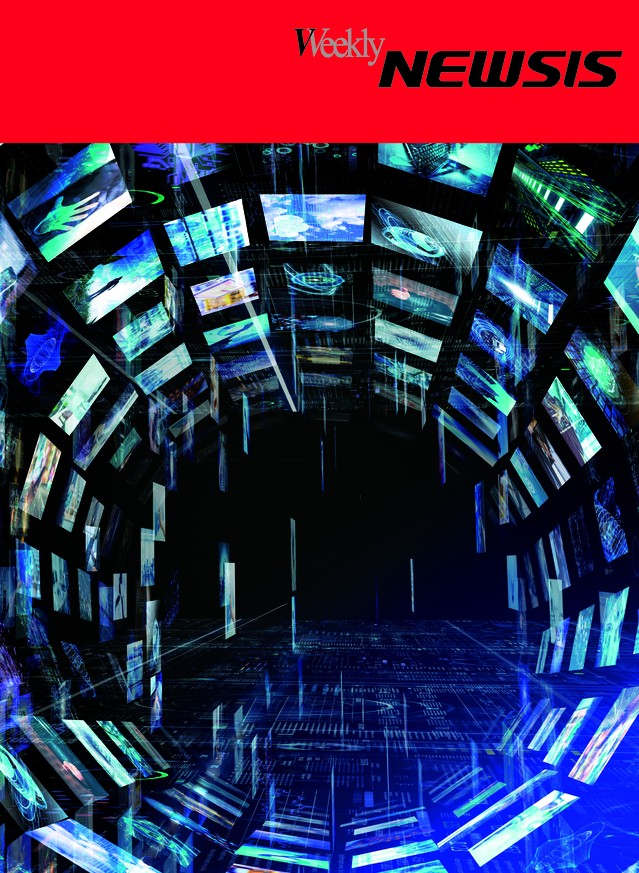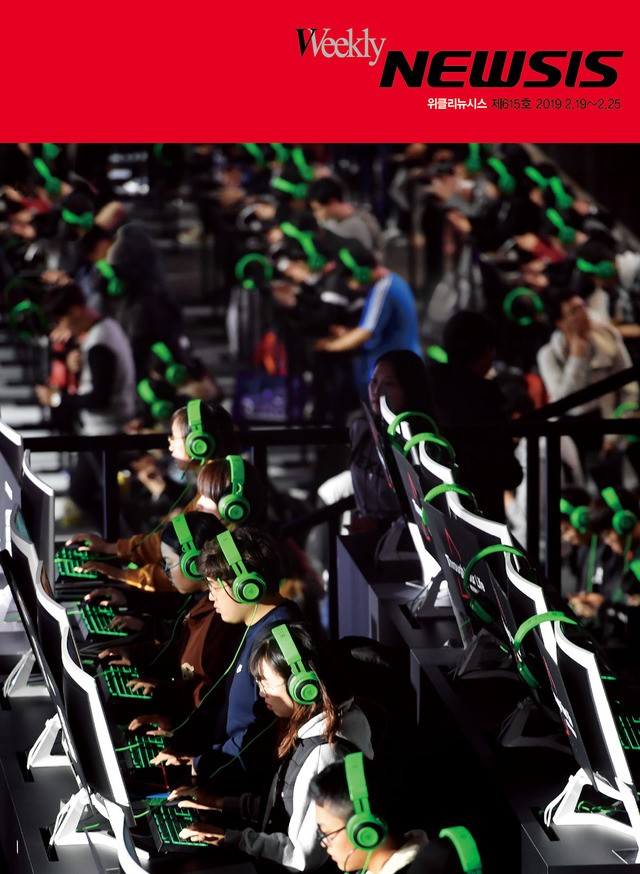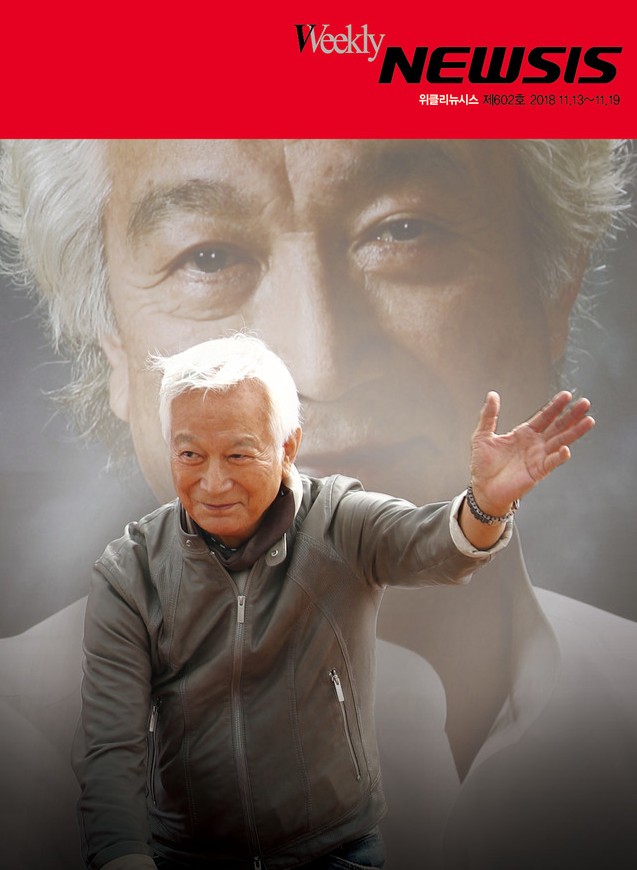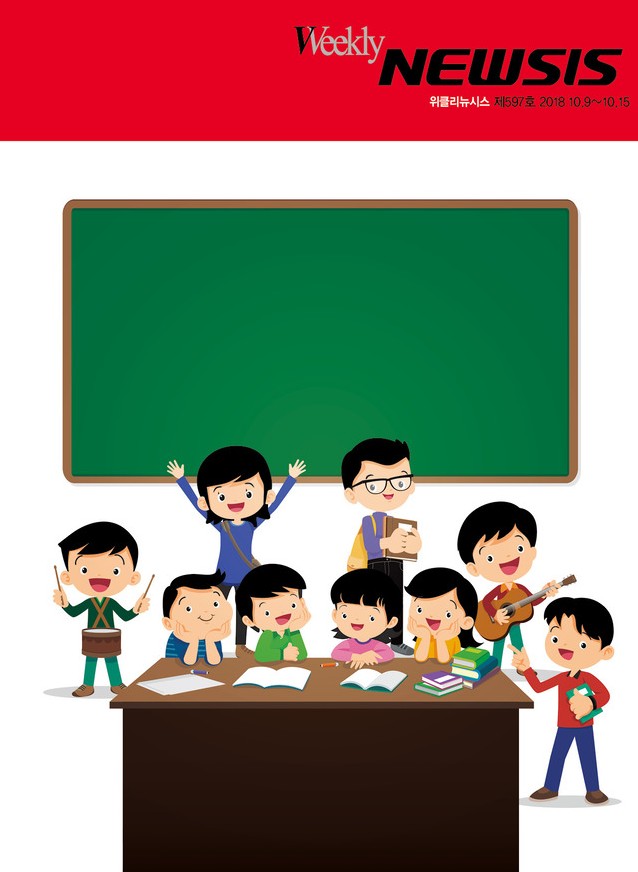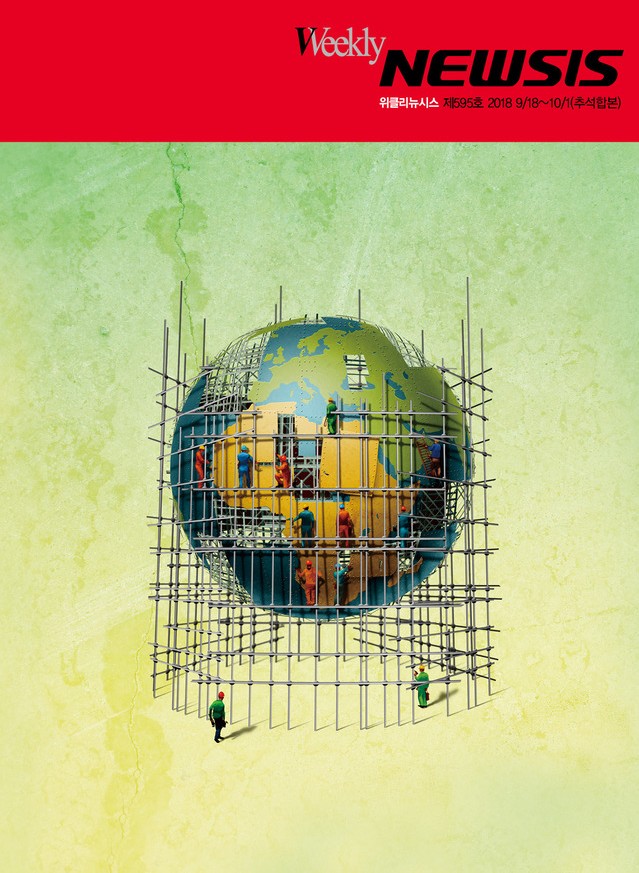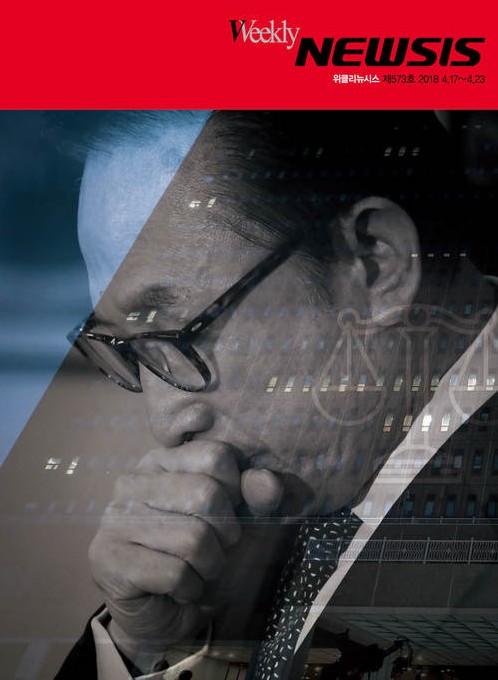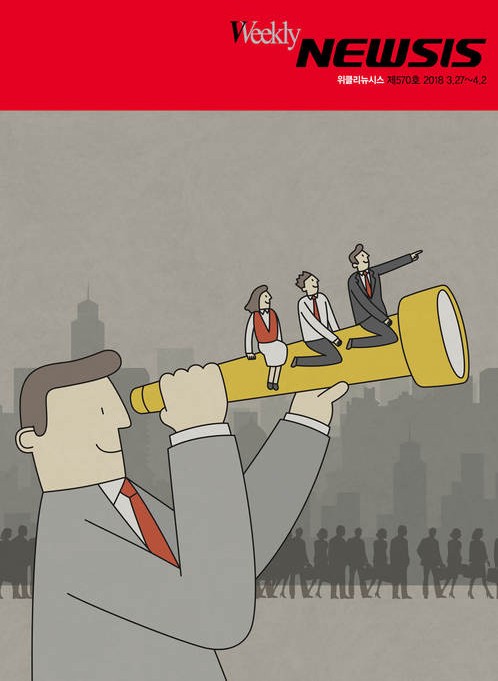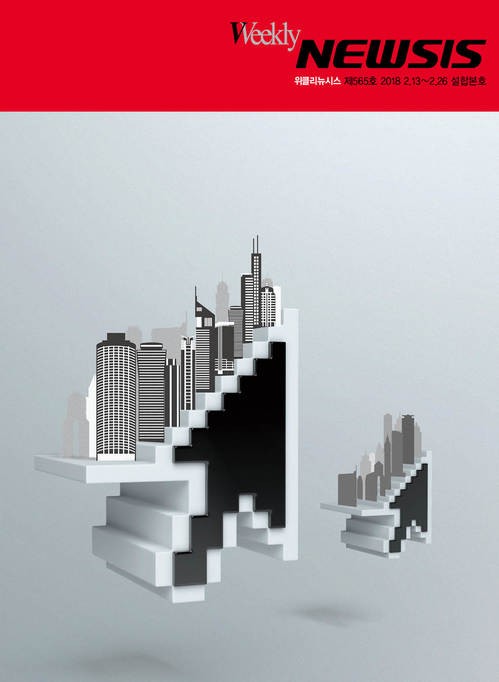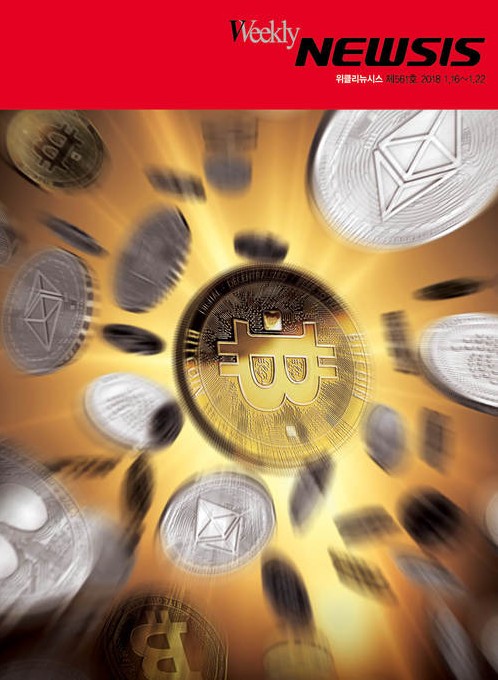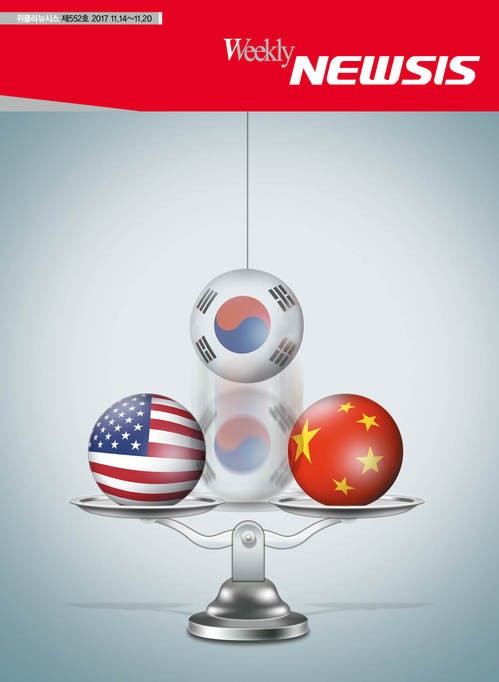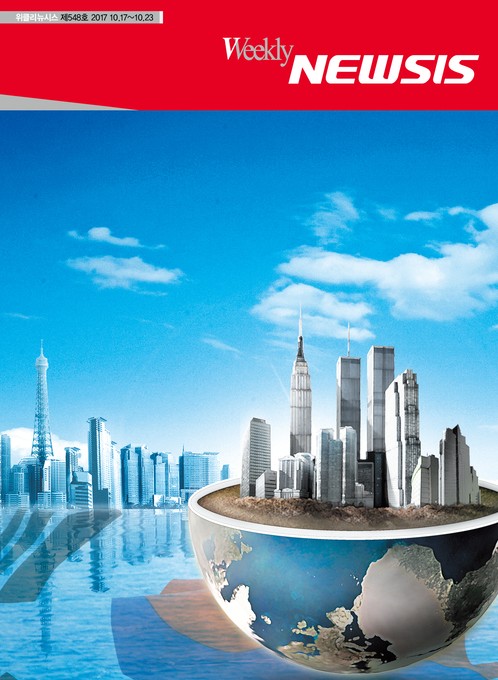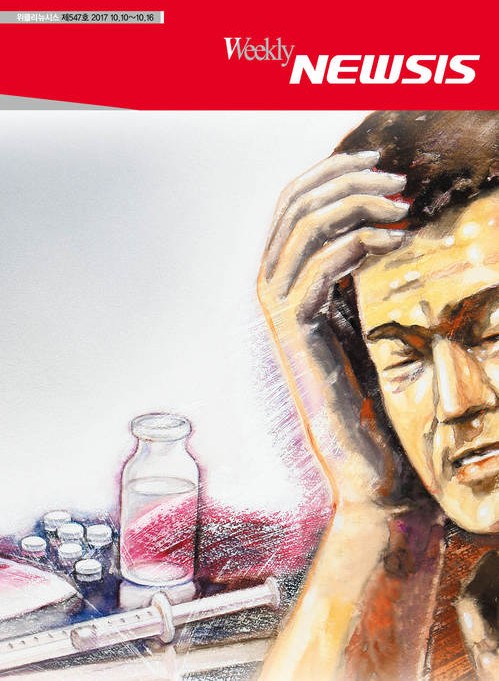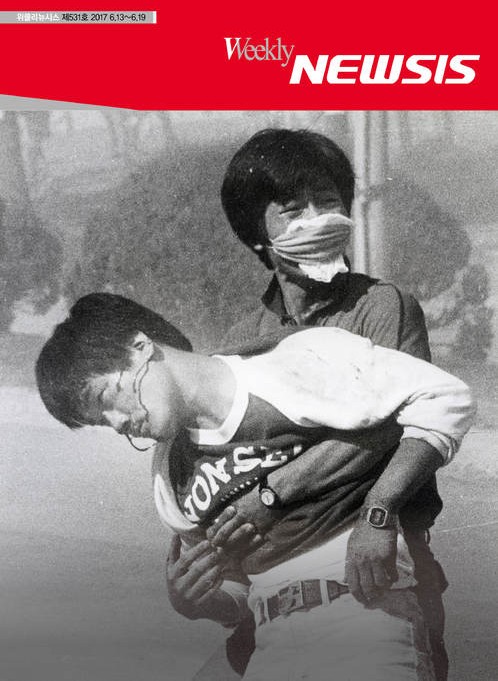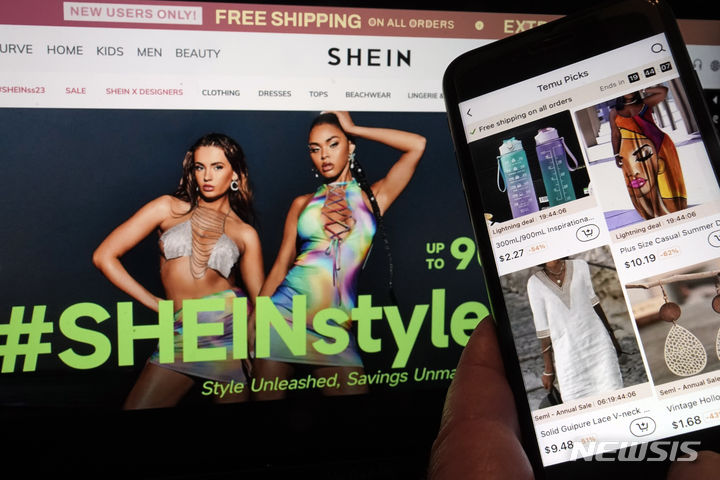[조연희의 타로 에세이]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동…20번 ‘심판’ 카드
[서울=뉴시스] 아버지가 임종하실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다. 혼비백산해서 달려온 우리에게 간병인은 이 상태로 며칠 갈 수도 있다고 귀띔해주었다. 그제야 우리는 안심했다. 산소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작은 아버지는 죽을 고비를 넘긴 작은 어머니의 안부를 전해주었다. 행여 장례식 동안 친척 어른들을 모시는데 소홀할까봐 몇 가지 당부를 하시기도 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는 일반 병동에서 임종실로 옮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에 화초도 놓여 있고 가족을 위해 편안한 소파도 구비돼 있었다. 그런 분위기 탓인지 긴장된 마음이 조금 풀어진 듯했다. 오랜만에 만난 언니에게 난 하소연하듯 이 얘기 저 얘기를 털어놓았다. 계약이 깨졌노라는 얘기. 은행 이자가 얼마 나간다는 얘기 등등. 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때마다 난 우군을 만난 양 목소리가 조금 고조되기도 했던 것 같다. 어느새 장례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오빠는 사망신고서가 있어야 호국원에 모실 수 있다고 했고 언니와 난 빈소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음식은 몇 인분을 주문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수 챙겨야 할 것이 많을 듯했다. 그날, 아버지는 임종하시지 않았다. 다음날 언니와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오빠만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셨다. ◆보는 것을 들어라 타로 20번 카드의 제목은 ‘심판’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부는 나팔이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관에서 막 일어난 듯한 사람들이 모두 눈을 감고 있었다. 나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은 채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다. 아니 두 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인간은 정보의 80%를 시각에 의지한다고 하는 데 여기서는 오히려 정보를 외면한 채 오직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온몸으로 소리를 느끼는 듯했다. 문득 헬렌 켈러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과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더 괴로울 것 같다고 했다. 볼 수 없는 것은 그저 사물과 자신을 떼어놓을 뿐이지만 들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과 떼어놓기 때문이기 때문이란다. 소리란 진동이 아니던가. 듣는다는 것은 소리에 진동하는 것이고, 진동하는 것은 곧 공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명해야 비로소 감응할 수 있다. 내 몸이 텅 빈 항아리처럼 공명하는 것. 네 숨소리, 네 울음에 같이 진동하는 것. 눈으로 듣고 소리로 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일지 모른다. 어떤 타로리스트는 이 카드를 ‘부름(calling)’과 ‘다시 태어남(reborn)’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나를 지목해서 미션을 맡기기 위한 부름이라는 것이다. 이 카드는 제목처럼 기다림, 평가라는 심판의 뜻도 담고 있지만 깨달음, 새로운 기회라는 뜻도 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이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는 뜻도 있다. ◆마지막으로 청각이 닫히는 이유 이 카드를 보자 아버지의 임종 날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시각이고 그 다음 미각, 후각, 촉각 순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가장 마지막 닫히는 것이 청각인 것이다. 못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마지막으로 청각이 닫히는 것일까.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숨이 파도치던 그 밤 온 내 지껄여댔다. 온갖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토로했다. 내 입을 틀어막을 수 없었던 그날 혹시 아버진 내 소음 때문에 지겨운 하루를 더 살아야 했던 것은 아닐까. 시끄러운 우리의 소음이 아버지를 하루 더 이승에 붙들어 맨 것은 아닐까. 그러고 보니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떠난다. 울음이야 말로 삶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징소리였다. 울음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 진동이고 가장 뜨거운 공명이며 감응일 수 있기에 말이다. 그런데 그날 난 왜 울지 못했을까. 평소 소원했던 것만큼 더 큰 화해의 반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적어도 그날 난 아버지의 마지막 숨소리, 그 떨림에 집중했어야 했다. 적어도 귀 속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야 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다고, 걱정 마시고 편히 가시라고. ▲조연희 '야매 미장원에서' 시인 [email protected] ※이 글은 점술학에서 사용하는 타로 해석법과 다를 수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