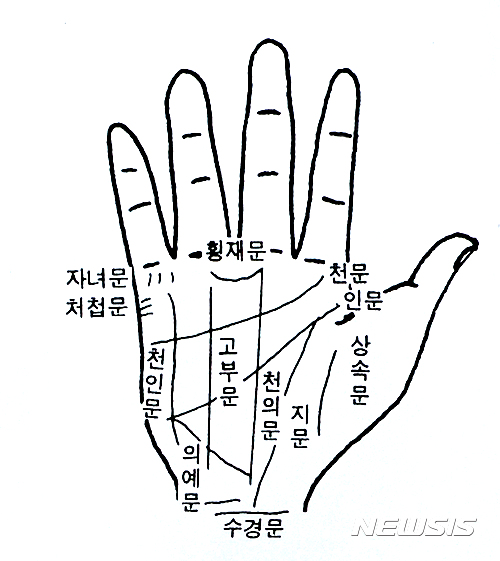[占치는 사회③]"올해 귀인 만나 술술 풀려"
얼마 전, 난생처음 사주(四柱)를 봤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용하다(?)'는 점술가는 기자의 한자 이름과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時)까지 묻더니, 한참 동안 고개를 기웃거리며 혼잣말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미간에 깊고 굵은 주름이 잡힌 그는 상형문자에 가까운 한자들을 풀어냈습니다.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며 무언가 셈하는 듯 혼잣말을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의 어깨너머 제단에는 형형색색 깃발이 빛바랜 채 나부끼고, 고이 덮어 놓은 동그란 신줏단지 사이로 불빛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도무지 뭔지 알 수 없는, 붉은색 계열 조각상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을 중얼거리던 그가 적어낸 종이에는 기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이 아무렇게나 적혀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산 인생이 웬만한 대하소설 감인데, 그깟 종이 한 장에 알 수 없는 몇 글자가 전부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점괘를 술술 읊어냈습니다. 앙칼진 목소리가 귀청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 것처럼 그의 점괘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잡다한 과거사부터 연애사, 직장, 가족, 금전, 운명, 건강 상태까지 마치 감출 곳이 없는 벌거벗은 몸이 돼버린 듯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의구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관운(官運)이 꽃피는 사주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점괘를 계속 듣고 있자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써서 밥벌이한 지 어언 8년 차인 기자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지금껏 사실 확인을 위해 하도 따지고 들어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먹은 터라 굳이 점을 보지 않아도 이미 영생(?)의 길 어딘가를 걷고 있을 터. 점괘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용하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난해하게 꼬인 말들이 얼마나 장황한지, 한참을 듣다 생면부지 기자가 다짜고짜 올해 운세를 물었습니다. "올해 귀인을 만나 앞길이 열려…." 생각지도 못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DNA가 남아 있는 듯합니다. 기자 역시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귀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뭉툭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내 귀인이 누구이고,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의 점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까지 딱 맞아떨어지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의 점괘는 일상적인 예언에 불과했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라"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 "건강을 위해 운동하라" 등 누구나 한번쯤 해봄직한 일상적인 제언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지닌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징'으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넘 효과' 혹은 '포러 효과'라고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것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기자는 마치 내 얘기인양, 그동안의 생을 반추하듯 스스로 퍼즐 조각을 끄집어 내 맞추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확답을 듣지 못했는데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를 만난 지 나흘 뒤, 그의 점괘를 돌아보니 정녕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귀인을 만났는데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 당연해져 버린, 공기처럼 귀인은 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위의 평범하지만 늘 한결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들 모두 귀인입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변하지 않은 소중한 인연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래가 어떻고, 귀인이 어떻고 해봐야 무슨 소용있을까요.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태어나는 순간 언젠가 죽는다는 운명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굳이 역술가나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