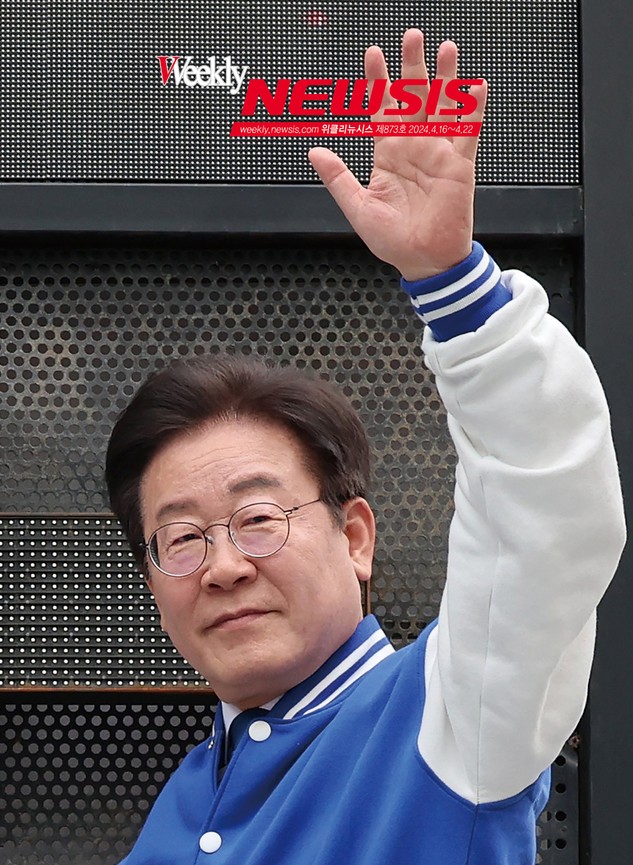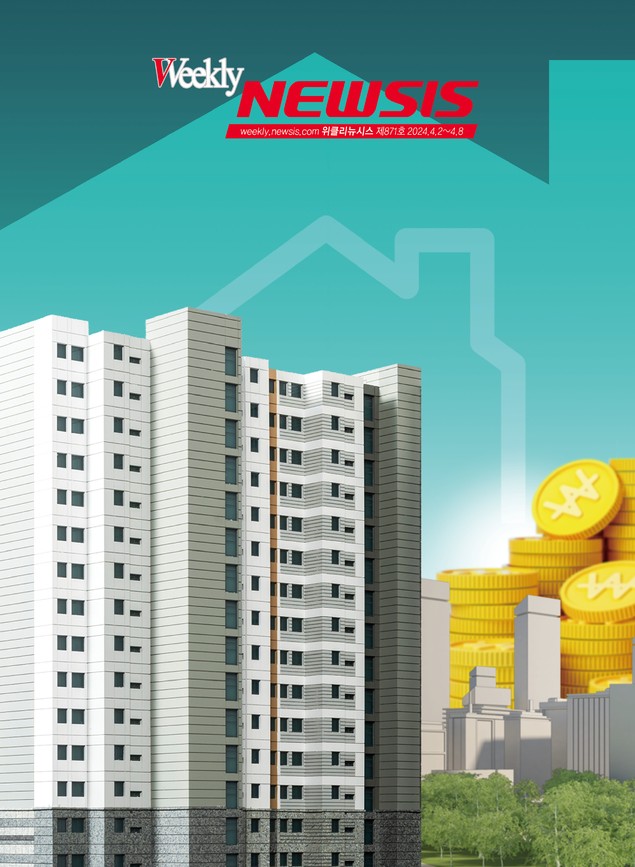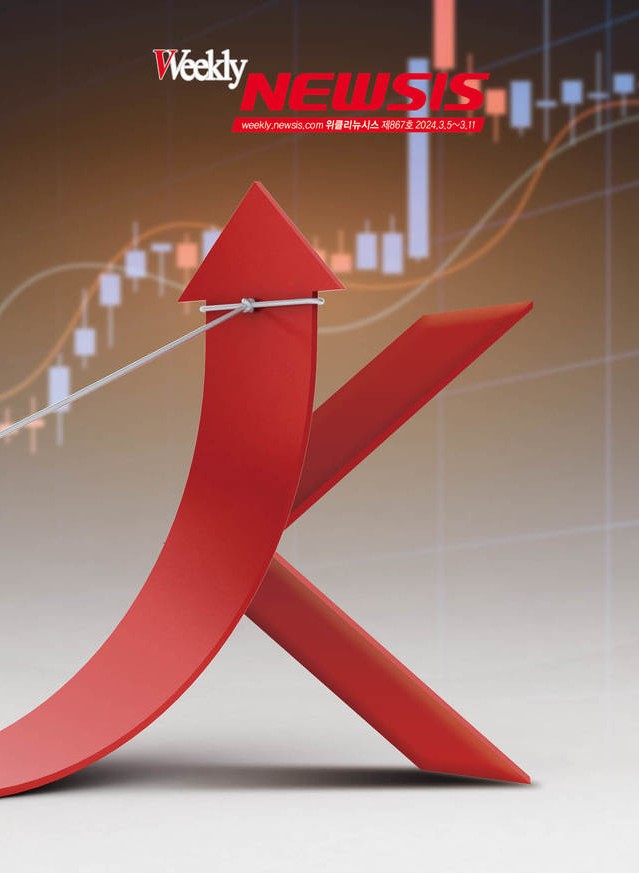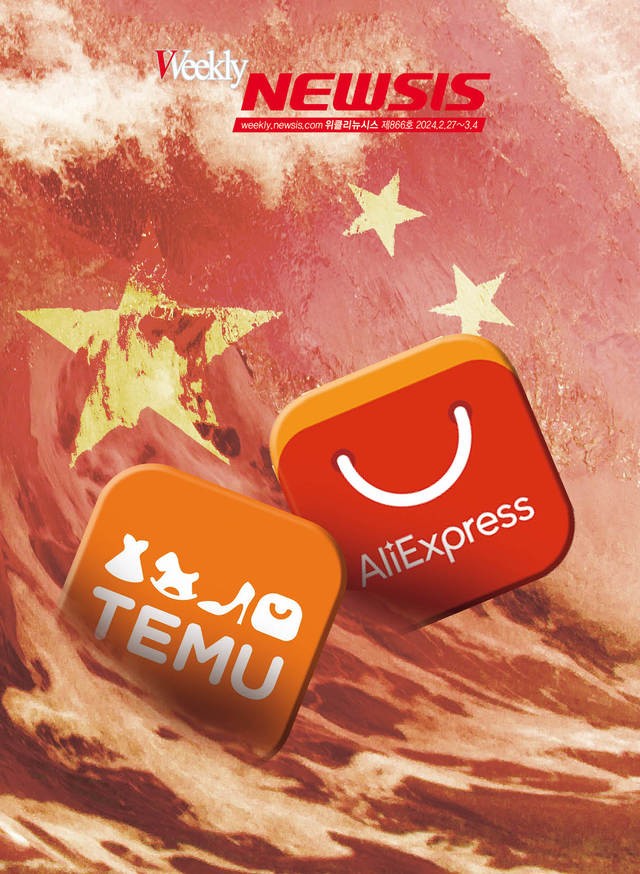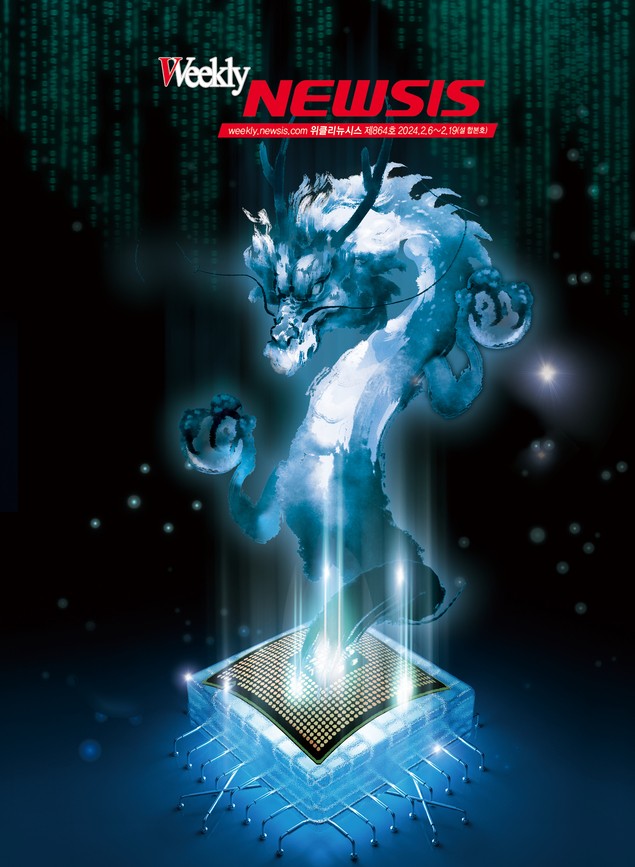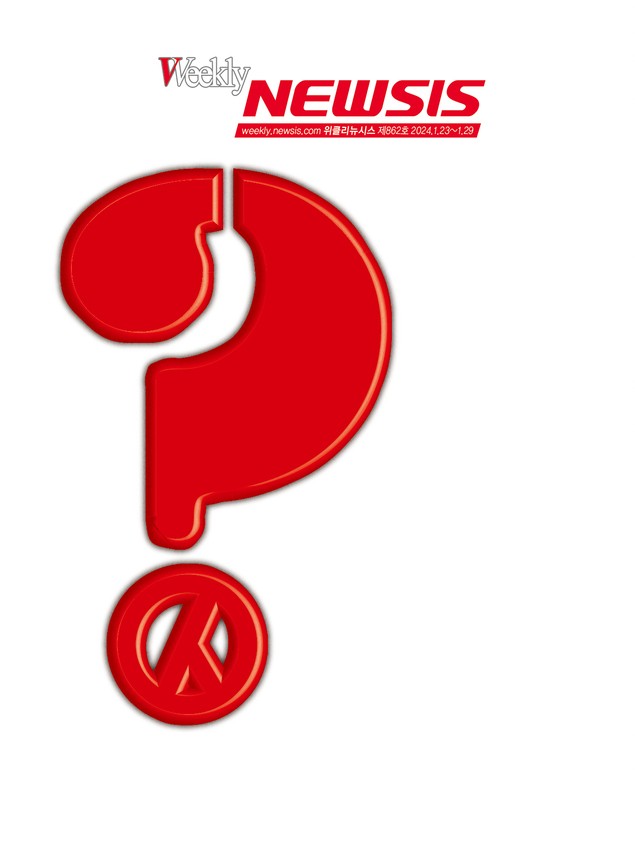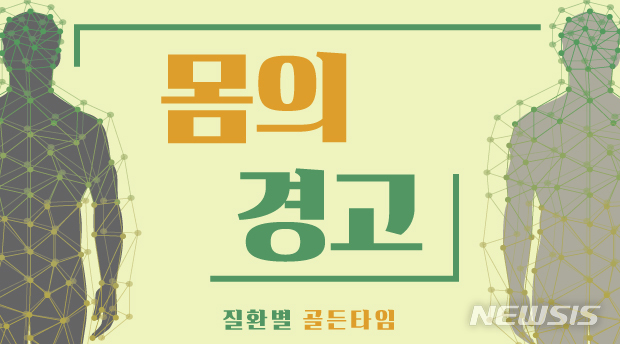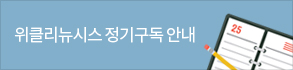"몸짱되고파" 무리한 운동에 '탈장'…초기증상 없어 위험[몸의경고]
초기증상 없다 덩어리 커지면서 통증방치하면 장기괴사·장폐색 발생 위험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 김모씨는 최근 몸 만들기를 새해 목표로 세우고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 몇 주 후 사타구니에 혹이 생겼지만 통증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평소보다 운동의 강도를 높이자 사타구니 혹이 더 커졌고 다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진단 결과 ‘서혜부(사타구니) 탈장’이었다. 장기가 복벽의 약해진 틈을 통해 빠져나오는 탈장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 탈출된 장기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복원되기도 하지만, 방치하면 장기가 괴사하거나 장폐색 증상이 생기는 등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수술적 치료가 권장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탈장은 신체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사타구니 부위에 생기는 서혜부 탈장이고, 대퇴 부위에 생기는 대퇴 탈장, 배꼽 부위에 생기는 제대 탈장 등도 있다. 주로 10대 미만 어린이나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탈장의 원인은 소아와 성인이 각기 다르다. 소아는 대부분 선천적 장기 이상으로 발생하고 성인은 복벽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근막이 약해지면서 생긴다. 복부 수술력, 복부 비만, 과도한 운동, 임신, 복수, 만성폐쇄성 폐질환, 전립선 비대 등은 복막의 압력이 올라가 탈장이 발생할 수 있다. 탈장은 초기에는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성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수는 "탈출된 장기가 제자리를 찾아 가기도 하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탈출된 장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덩어리가 커지고 통증도 서서히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침을 하는 등 복벽에 압력이 생기는 경우 장시간 서 있는 경우 덩어리가 더 튀어나올 수 있다. 병원에서는 촉진을 통해 돌출된 덩어리를 확인하고 초음파나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정확히 진단하게 된다. 탈장은 통증이 크지 않아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자칫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탈장이 심해지면 탈출된 장기가 장에 끼어 복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감돈’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장기가 썩는 ‘교액 괴사’가 초래될 수 있다. 최 교수는 "교액 괴사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장천공, 장폐색, 패혈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탈장으로 인해 감돈이나 교액 괴사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전 교정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탈장 수술의 대부분이 개복수술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수술의 시행이 크게 늘었다. 최소 침습으로 진행되는 만큼 통증과 흉터가 적고 빠른 회복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장점을 가진다. 특히 로봇수술은 3차원 시야에서 로봇 관절을 통해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감염이나 합병증의 부담을 줄였다. 70세 이상 노년층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복강경·로봇 수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 교수팀도 지난 2018년 연구를 통해 고령 환자에서도 복강경 수술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했다. 다만 이전 전립선암 수술 환자나 이전 수술로 인한 유착으로 복강경 수술이 어려운 경우, 전신 마취가 어려운 경우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 탈장 환자는 수술 전이나 수술 이후 1개월 정도는 복부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최 교수는 "과도한 운동이나 등산 골프 등 복벽에 힘이 들어가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고 탈장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